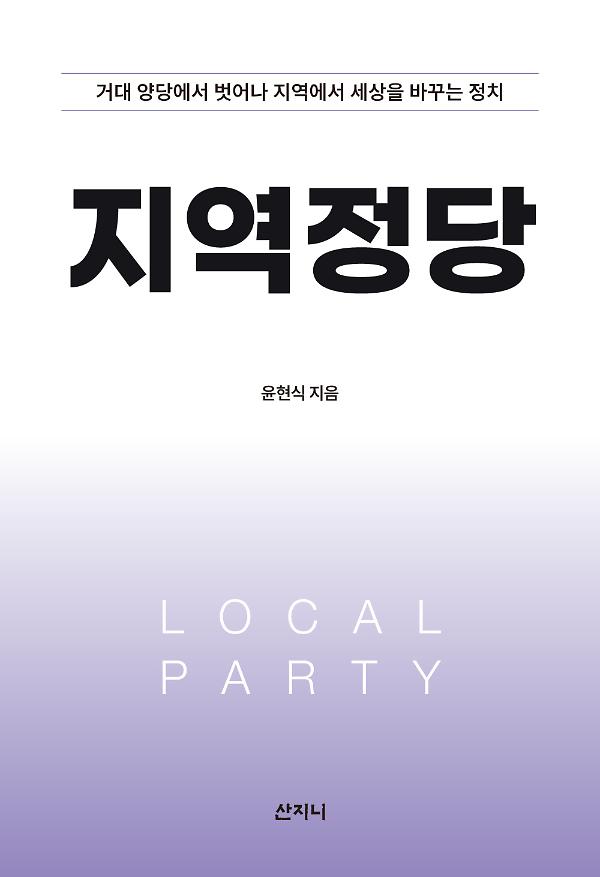p9
어떻게 이 철옹성 같은 양당구조를 파훼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저들을 넘어설 수 있는 실질적인 정치세력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 끝에 얻은 결론은 어찌 보면 원론적인 것이었다. 진보냐 보수냐를 떠나 누구든 자신의 정견과 대안을 공정하게 꺼내놓고 경쟁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게 급선무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러한 장은 거대 양당만이 기득권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 지금의 정당법 체계를 해체해야만 만들어질 수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p88
중앙정치가 지역정치를 부속물로 취급함에 따라 여러 부정적인 현상이 나타난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지역의 사안이 번번이 후순위로 밀려나게 된다는 것이다. 지역의 사안이 중앙정치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건 오로지 특정한 지역 간의 이해관계가 전국단위의 선거에 영향을 미칠 때뿐이다. 선거 시기 정치적 득실, 즉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표'의 향방에 따라 지역의 의제가 좌충우돌하게 된다. 어떤 문제는 선거 때 반짝하다가 선거가 끝나면 종래 무소식이 된다거나, 어떤 문제는 선거가 닥치니 졸속으로 안을 제출했다가 두고두고 지역의 골머리를 앓게 만들기도 한다.
p151
2인 선거구에서 발견되는 다수의 무투표 당선, 이를 가능하게 하는 양당 각 1인의 후보 출마, 이 구조 속에서 출마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제3당의 한계. 이 모든 상태는 한국 정치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라는 두 거대 정당의 정치적 담합에 좌지우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영남과 호남의 정치적 자원은 각각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지역적 패권을 장악하면서 싹쓸이한다. 이 틀안에서 유권자의 한 표는 거대 양당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주는 알리바이에 머문다.
p278
이 규정은 한국에 존재하는 전국정당이 실제로는 모두 서울정당이라는 것을 상징한다. 거대 양당이 아무리 지역을 정치적 기반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들이 내놓는 정강 정책은 서울 중심을 벗어나지 못한다. 겉으로는 경제, 교육, 의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지역을 꺼내 들고 균형발전을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내놓는 기준은 서울의 이해를 벗어나지 않는다.
p338
전국정당과는 달리 지역정당에서는 그 주도적인 역할을 여성, 소수자, 청년, 청소년, 노인, 노동자, 협동조합, 노동조합, 주민단체, 통반장연합 등 다양한 주체들이 책임질 수 있다.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 속에서 실제로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이 과정에서는 민주적인 절차와 지역 정치에 대한 공동의 관점이 전제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