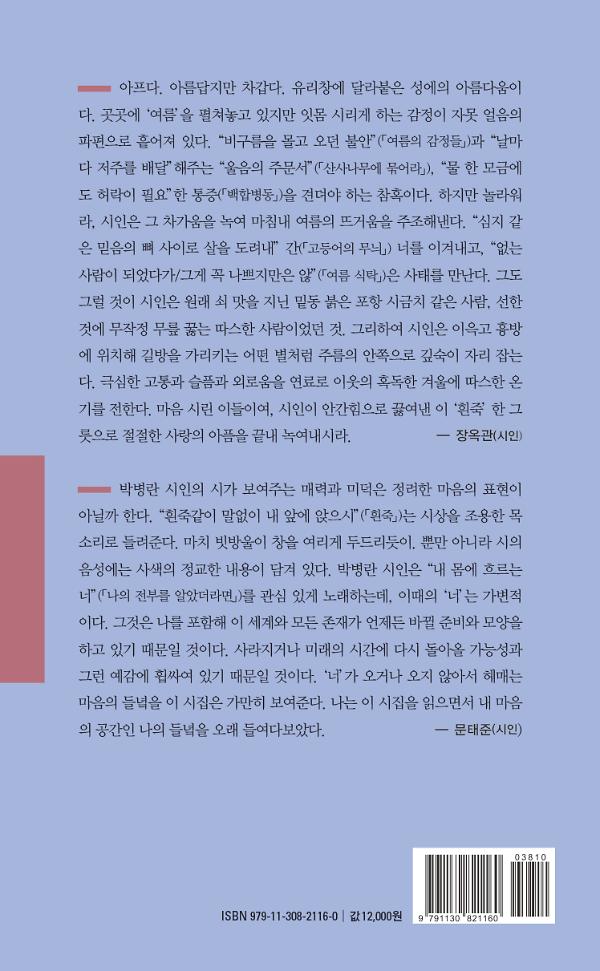여름 식탁
사라지는 식탁이 있습니다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날벌레가 있습니다
사라지는 기분이 있습니다
기분은 왜 아침부터 시작될까요
없는 너를 부르다가 없는 사람이 되었다가
그게 꼭 나쁘지만은 않아서
한꺼번에 몇 가지 기분이 되어보는 우리는,
아침에 사라지는 식탁을 찾습니다
사라지는 것에서
살아가는 것으로 날벌레로 여름 날씨로 없는 사람으로
고등어 통조림을 싣고 들것처럼 사라지는 식탁은 몇 가지 기분일까요
여름 기분은 아침 다르고 저녁이 다른
침엽수림의 날씨 같아서
없는 사람이 되었다가 없는 너를 찾다가
나의 전부를 알았더라면
우기를 맞은 사원이 붐비기 시작했다 파초 그늘 아래 돌을 젖히고 풀을 뽑는 남자 물을 떠 돌을 닦는 남자 목덜미에 흐르는 땀방울에도 일이 끝날 때까지 아무 말 하지 않는다 그대를 견디는 일을 너무 오래 앓아서 이끼의 온도를 잊었다 젖어 드는 발목을 숲에 두고 향신료 창고의 오색 가루처럼 시시각각 들뜨는 나를 달랜다
비의 주파수를 연주하는 숲의 선율
열대의 눈물 양동이에 꽂히는 비
단 한 번뿐이기에 그대를 물어물어 여기까지 왔다
너무 많아 모르는 나무가 내 몸에 흐르는 네가
아무도 없는 먼 곳에서 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내가
산짐승의 목을 비틀어 피를 바치는 행렬이 오후의 염원을 새기는 이곳 재단에 놓인 풀반지는 잊기로 하자 죽은 신과 눈을 마주치는 일에도 허술해서는 안 된다 숲은 무분별한 일요일의 낙담 같고 침묵보다 아름다운 말이 있었다면
나의 전부를 알았더라면 떠나지 않았을 사람 빗소리가 사원을 에워쌀 때쯤 비가 그친다 일을 마친 남자는 돌을 등에 지고 집으로 간다 끝내지 못한 말들은 잠시 우리에게 남겨놓고
읽기 쉬운 마음
우리는 왜 그토록 화가 나서 각자 문을 닫았나. 말하다 말고 서로를 남겨둔 채 하루 번갈아 하루씩 입을 다물고, 건드리면 걷잡을 수 없이 연약한 내용물이 쏟아져 나왔다. 부목처럼 힘이 다 빠져 언제 휩쓸릴지 모르는 우리, 형편없이 덧댄 쪼가리같이, 저만치 벗어던진 신발 한 짝같이, 함께 살아도 같은 마음인 적 있었나. 어쩌자고 일요일마다 비가 내렸나, 누가 보지 않으면 내다 버리고 싶은, 문이 없는 곳에 매단 달력처럼 어디서 노크해야 할지 몰라 쩔쩔맸다. 아프지 않았으면 좋았을, 병은 아픈 것이 아니라 서러운 것, 병을 얻고부터 하루도 슬프지 않은 날이 없었다. 너무 멀쩡해도 너무 아파도 우린 제대로 설 수 없을 거야, 하나에서 열까지 세는 동안 방문 앞을 서성이는, 읽기 쉬운 마음이 모여 사는 섬, 물음표와 감탄사를 한 몸에 지닌 까닭에 때때로 그 마음은 자주 들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