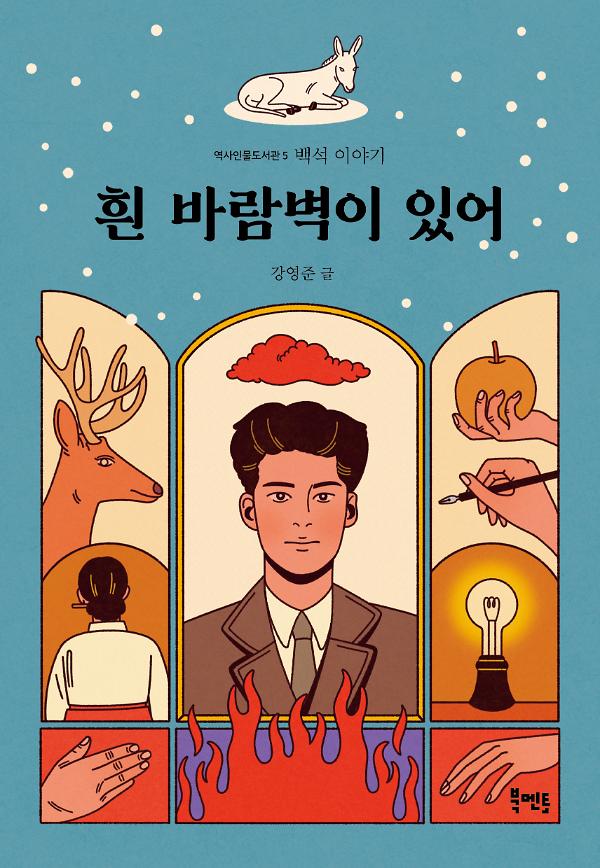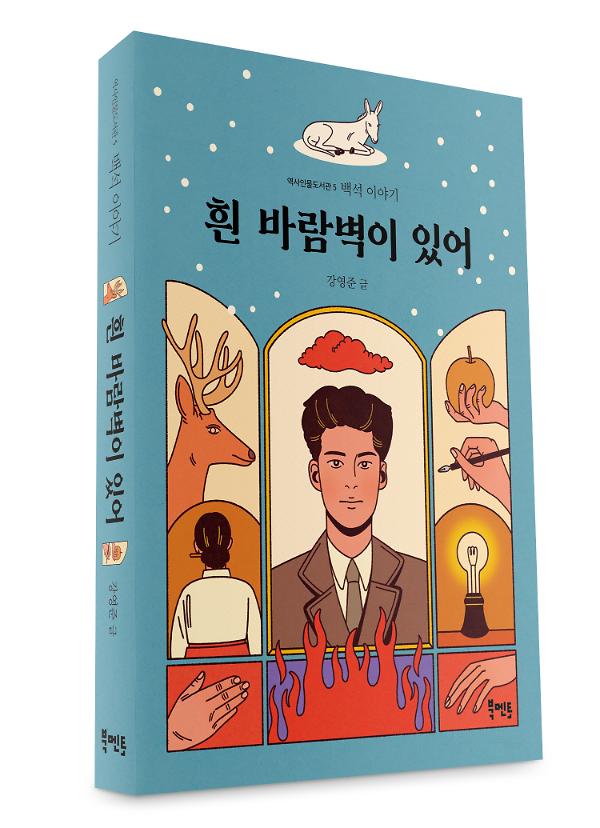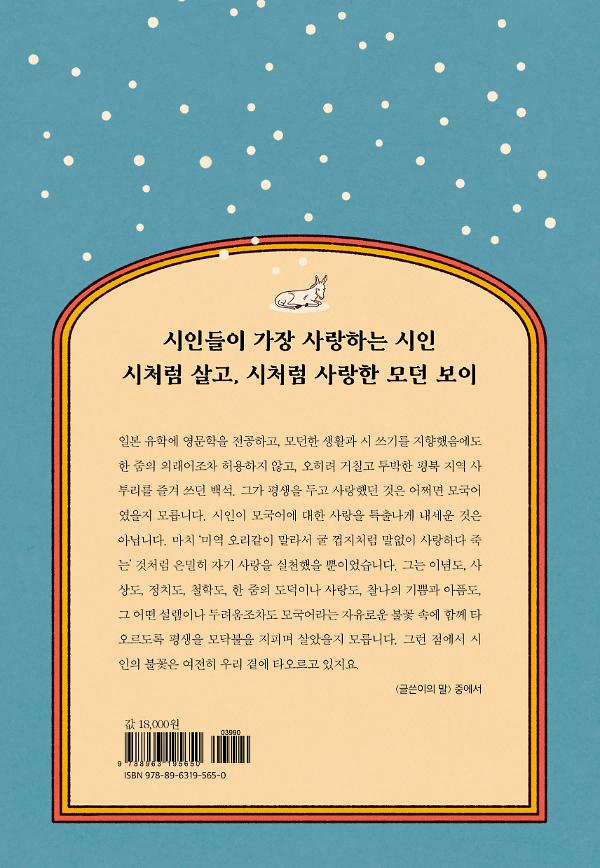백석이 말을 어떻게 건넬지 머뭇거리자 사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이름이 백석이라고요?”
“네. 백석입니다.”
“그럼 혹시 흰 백에, 돌 석?”
사내는 입가에 능글맞은 웃음을 띠며 다시 물었다.
“그런 셈이죠.”
“하하하. 그럼 흰 돌이군. 그럼 나는 앞으로 흑석, 검은 돌로 불러 주시오. 하하! 교정부라고 해서 틀린 글자나 찾아내는 따분한 곳인 줄 알았는데 지루하지는 않겠네요. 옷차림도 예사롭지 않고. 하하하! 나는 통영 사람 신현중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현중은 호탕하게 웃으며 석에게 악수를 청했다. -15P
“그런데 다쿠보쿠도 일본인인데 어째서 그 사람은 좋아하나요?”
“다쿠보쿠야 다르지 않소? 그가 쓴 시를 보시오. 일본인이지만 양심적이잖아요. 조선 침략을 반성하는 시도 쓰고 말이오.”
“〈9월 밤의 불평九月の夜の不平〉 말씀이시군요. 침략자 이토 히로부미처럼 자신도 차라리 총에 맞아 죽는 게 낫다는…….”
“오, 그 시를 알다니. 맞아요. 다쿠보쿠는 일본인이지만 제국주의를 정면으로 비판하니 참 대단하죠. 그렇지 않소? 그런 사람이 일본의 주류가 되었다면 조선을 식민지로 삼는 일도 없었을 텐데.”
“그렇지요.”
“다쿠보쿠 중에 어떤 시가 마음에 듭니까?”
석은 잠시 망설이더니 이내 시를 읊었다. -21P
석은 바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냈다. 주변에서는 한심하다는 듯이 바라봤다. 멀찌감치 떨어진 직원이 답답해하다가 전화를 대신 받으려고 일어서자 과장이 가만히 있으라는 손짓을 한다. 석이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자는 심사였다.
석은 울리는 전화를 받는 대신 손수건을 꺼내 수화기를 닦기 시작했다.
“정말 재수 없네. 뭘 믿고 저러는 건지. 사장 믿고 저러겠지.”
석은 수화기를 다 닦고 난 뒤 엄지와 검지, 중지 끝으로 잡힐 듯 떨어질 듯 수화기를 집어 들었다. 결국 전화는 끊어졌고, 석은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어이, 백석! 중요한 전화면 어쩌려고 그러는 거야?”
참다못한 과장이 결국 한마디 했다.
“중요하면 다시 전화하겠지요.”
“또 한심한 소리한다. 나 원 참!”
과장은 답답했지만 한두 번도 아니어서 그냥 참을 수밖에 없었다. -38p
석은 박경련을 바라보며 어쩐지 낯익은 슬픔을 느꼈다.
그녀의 표정은 어느 바닷가 외딴 마을, 이름 모를 여인의 초상과 자연스럽게 겹쳐졌다. 일본 유학 시절, 졸업을 앞두고 바닷가를 여행하다 가키사키라는 작고 외딴 마을에 들른 적이 있었다. 그곳 낡은 여관에는 새벽달처럼 얼굴이 하얀 한 젊은 여인이 장기 투숙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저녁상에 오른 참치회조차 넘기지 못할 만큼 병이 깊었는데, 그녀의 병든 눈빛이 서럽도록 고와서 오랫동안 잊히지 않았었다. 그때 그 가키사키에서 보던 슬프고 하얗던 여인의 인상이 묘하게 박경련에게서 보였다. 그늘 속에 자라나는 풀처럼 은밀한 슬픔을 감추고, 고귀한 사랑마저 남몰래 숨긴 듯한 얼굴빛, 그것이 박경련의 첫인상이었다. -49p
“좋아, 좋아. 역시 백석이야. 난 이 시를 보고 어쩐지 못다 한 조선의 꿈이 느껴지더라. 버려지고 보잘것없는 것들이 모여 모닥불을 이루는 게 꼭 식민지 조선 같단 말이지. 외면받던 민중이 스스로 생활을 이어 간다는 생각도 들고. 솔직히 깜짝 놀랐어. 석이 넌 민족주의자도 아니고, 사회주의자는 더더욱 아닌데 어떻게 이런 시를 쓰는 거냐?”
현중은 전에 없이 진지한 얼굴로 석을 향해 말했다.
“현중이 네가 이렇게 진심일 때도 있구나! 역시 사회 운동가답게 시를 읽는 것도 사회적인 데가 있어. 석아! 안 그래?” -63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