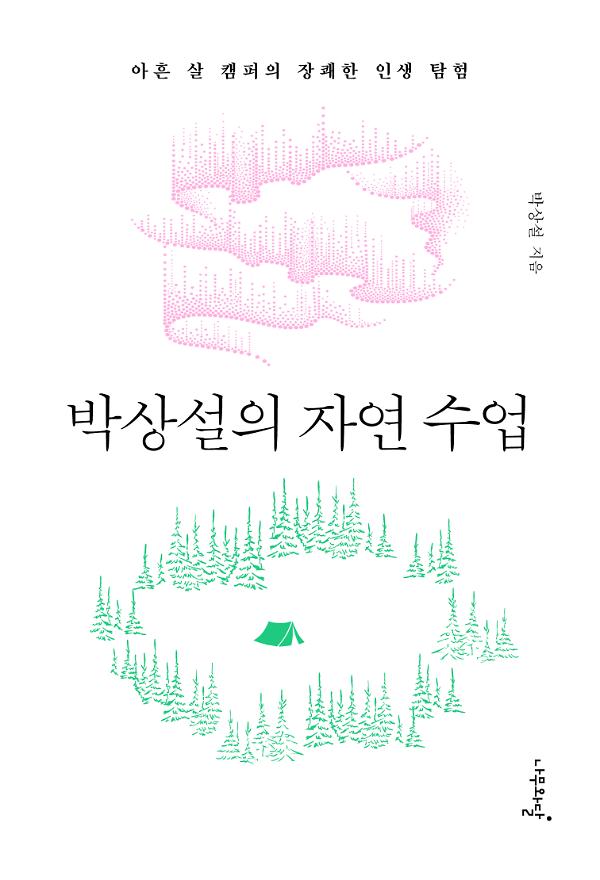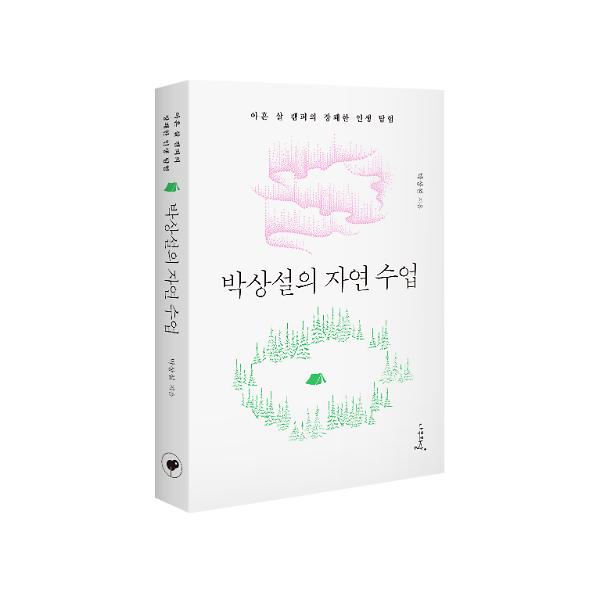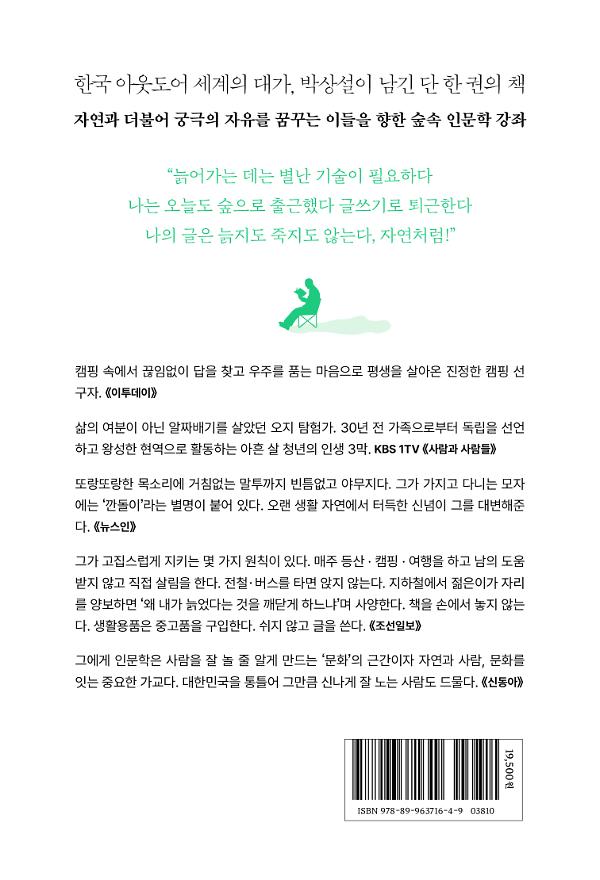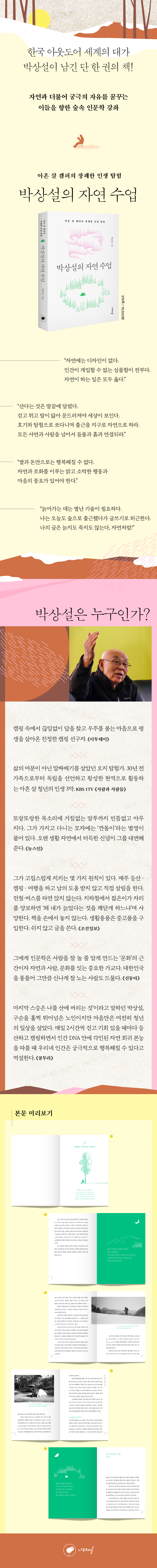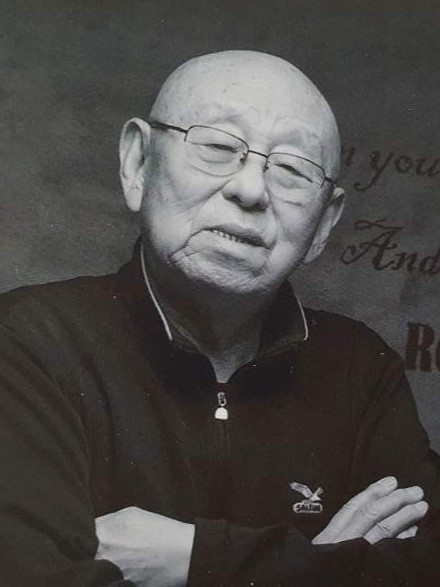● 사람들은 못 사는 것과 잘 사는 것에 분명한 선이 그어져 있다고 믿는다. 그 선이란 것이 재화(財貨)다. 재화는 중요하다. 하지만 재화는 마음대로 좌지우지 못 한다. 잘 산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인생의 명제이기 때문에 나는 삶의 틈새마다 ‘자연 풍의 놀이’를 슬쩍 끼워 넣어 노는 듯 일하고 일하는 듯 논다. 아흔이 가까운 나이지만 하고 싶은 것 여한 없이 다 하며 공고히 살아내고 있다. 내게는 자연이 직장이다. 죽는 날까지 자연으로 출근하고 걷다가 쓰러질 것이다. 늘 숲을 동경하며 그렇게 하나 될 것이다. (p. 29)
● 시집 한 권 들고 숲에 들자. 주중엔 열심히 일하고, 주말엔 야영하고 농사짓고 산에 가고 여행하자. 이것이 자연을 모태로 삼은 레저 문화다. 감성과 호기심을 유발하고 땀 흘려 일하고 땅에 뒹굴어 건강을 다지며 마음을 넉넉히 하는 평화로운 삶이다. 깊은 숲에서 보들레르의 시편에 몸을 떨며 스스로 아름다워지는 앤솔로지의 기쁨, 무엇으로 이 감동을 사랴! (pp. 29-30)
● 삶은 숲에 순응하는 싸움인가? 숲과 계곡은 홀로 제 스스로 있다. 침묵의 공포가 가득한 그곳에서 그들은 끝끝내 나를 모르는 체한다. 숲은 세상의 의미를 낚아 올리는 소리로 수런거린다. 인간들의 돈벌이, 성공학이 씁쓸해지는 순간이다. 만드는 문화가 아닌 기르는 문화, 숲이 키우는 문화를 보라.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그 문화는 어디에 사는가? (pp. 53-54)
● 나는 주말과 휴일에는 어김없이 도시를 탈출한다. 산에 오르고 자연에 캠프를 펼치는 재미로 산다. 그렇다고 아예 귀농해 산촌 노인으로 살려는 것은 아니다. 도시와 농촌의 삶을 오가는 문화, IT를 넘어 엔트로피의 우주적 삶으로 달려가는 재미를 버릴 수 없는 까닭이다. (p. 59)
● 주말레저농원을 운영하면 놀라운 생활 혁명이 일어난다. 외식이 줄어들고 도시형 취미가 자연형 취미로 바뀌며 신변잡기가 의미 있는 문화로 변한다. 길들여졌던 상업 문화를 혐오하게 되고 텔레비전을 멀리하며 가족을 떼어놓고 혼자만 재미 보던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 술 문화가 바로잡히고 중요하지 않은 약속을 잡지 않으며 일신상의 쾌락을 기피한다. 국내외 여행을 오토캠핑으로 해내고 손에는 늘 지도와 나침반이 들리게 된다. 민박이나 펜션은 쳐다보지도 않고 집안 살림을 온 가족이 도우며 가족 구성원이 독립적 생산자로 자립해나가며 남을 도와주는 등, 여간해선 바뀌지 않던 습관이 놀랍게 변해간다. 더 놀라운 변화는 책을 가까이하게 되고 생각을 글로 남기며, 자연의 변화를 살피는 취미에 심취해 야생화를 사진에 담아가며 풀벌레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잔소리 없는 자연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치유다. (p. 64)
● 일에 매몰되어 쫓기다 보면 자신을 바로 보지 못하고 되는대로 살게 마련이다. 지각없는 유흥 문화에 휩싸이면 무엇이 잘못돼 가는지도 모른 채 점점 헤어날 수 없게 된다. 도인(道人)이 되자는 게 아니다. 인생의 하부 구조를 벗어나 의연하고 넓으며 합리적인 인성을 몸에 지녀 자연에서 마음껏 놀자는 뜻이다. 이제 작심하고 자연과 생태계와 아웃도어 문화와 작은 농사일에 주력하며 꿈의 지도를 그려보자. 땀 흘리는 노동으로 자신을 낮춰 세상을 허허롭게 지내보자. (p. 65)
● 캠핑을 즐겨 하는 내게 사람들은 묻는다. “왜 일부러 고생하며 텐트에서 사십니까?” “죽기 전에 죽음의 경지를 만들어 이겨내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를 얻기 때문이지요.” 이것이 내가 해줄 수 있는 대답이다. 잡다한 주변을 정리하고, 나태해지기 쉬운 집을 버리고, 몹시 불편하고 작은 공간에서 사유와 고독을 즐기며 일부러 고생을 사서 하는 것, 나는 이것이 진정 죽음을 받아들이는 길이라 생각한다. 살아 있되 안락만을 찾는 노년의 삶은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p. 99)
● 내 나이 아흔이 되어도 할 일이 있다. 자연이 있는 한 그곳이 일터이고 오락장이다. 아흔이 돼도 세상 살기에 늦은 나이가 아니다. 나에게 세상이란 길 위에 있고, 걷기에 있고, 씨 뿌리고 밭 가꾸며 야생화 보듬고 생명 수업 하는 데 있다. 이런 현요(眩耀)한 이완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모든 것을 남의 손 빌리지 않고 스스로 해낸다. 흐르는 강물처럼 한순간도 쉬지 않고 자연과 공생하는 존재 방식을 개발하며 개선하는 일을 유일한 낙으로 삼는다. 상식을 깨부수고 다양한 자유를 엮어내는 모던한 문화 구현을 꿈꾼다. 늙어가는 데는 별난 기술이 필요하다. 노인은 박물관이 아니다. 세상은 노인에게 덕담을 구하지만 늘 갇힌 말만 쏟아내는 진부한 덕담은 공해다. 후학들은 번뜩이는 지성과 파워풀한 행동으로 길이 되어주는 멘토를 바란다. 그러니 깨져야 한다. 옛날만 답습하면 고인 물이 된다. 미래를 향해 활짝 열린 새로운 생활공간을 만들어내는 ‘벤처 인생’을 경영해야 한다. ‘즐거운 우리 집(Home Sweet Home)’은 즐기는 기분으로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때 가능하다. (pp. 82-83)
● 내게는 억척스러운 몇 가지 원칙이 있다. 어떤 경우라도 매주 등산, 캠핑, 여행을 한다.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 직접 살림을 한다. 전철, 버스를 타도 좀처럼 앉지 않는다. 나에게 정년은 없다. 나는 주말 영농 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자연 중심의 레저 활동을 통한 ‘행동하는 열린 인성’ 계몽에 힘쓴다. 한 가지 일만이 아니라 몇 가지 일을 동시에 만들어 해낸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책을 손에서 놓지 않는다. 이것이 내가 살아 있는 이유이며 기쁨이다. (pp. 99-100)
● 전국 캠핑장은 피난민 수용소를 방불케 한다. 자연을 찾아 여유롭게 여백을 즐기는 야외 생활은 아예 기대할 수 없다. 어디 그뿐인가?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인 고가의 캠핑 장비 경연장으로 둔갑했다. 고성방가로 지새우며 먹자판을 벌이는 일이 당연시되었다. 책을 읽는 사람은 거의 본 적이 없다. 그래서 나는 늘 권한다. 농민을 찾아가 비닐하우스를 빌리든 캠핑 사이트를 빌리든 조용한 캠핑을 즐기라고. 이렇게 해야 자녀 교육에도 큰 도움이 되고 때로는 텃밭을 임대해 씨를 뿌릴 수도 있으니, 이것이 곧 훌륭한 주말레저농원이라 할 것이다. (pp. 107-108)
● 산다는 것은 발끝에 달렸다. 걷고 뛰고 발이 닳아 문드러져야 세상이 보인다. 호기와 탐험으로 쏘다니며 출근을 지구로 자연으로 하라. 모든 사연과 사람을 넘어서 들풀과 흙과 연결되라. (p. 236)
● 생활의 인문학이란 어려운 것이 아니다. 모닥불가에서 피워 올린 자아에 대한 꿈이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는 감수성 잔치를 여는 일이다. 우리가 인지할 수 없는 미지의 실제와 부딪히는 것이 인생이라면, 이때 일상과 다른 근원적 사유로 자기 도약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인문학의 역할이다. 인문학은 새로운 체험을 통한 시각과 새로운 진술 체계로 존재를 실험하는 학문 분야다. 나는 실생활에서 건져 올린 질문과 반란을 근거로 문화결정론적이 아닌 문화자유론적 의지로 글을 쓴다. 세계의 구조를 나름대로 해체하고 재구성하며 새로운 시각으로 창작한다. 인문학 입히기는 글쓰기가 전제다. 인간이란 존재는 언어 표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글을 쓰는 일은 스스로를 증명하는 일이다. (p. 286)
● 쌀과 돈만으로는 행복해질 수 없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맑고 소박한 행동과 마음의 풍요가 있어야 한다. 사회 통합을 이루는 소통의 길은 자연을 매개로 한 주말 레저 생활만이 해법이다. 초원의 캠핑은 사람들로 하여금 감성과 정서를 풍부하게 길러주어 화기애애한 이웃이 되게 하고 사회를 밝게 만들어 사회악을 줄이는 효자다. 모든 답은 초원의 자연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의 순화에 달려 있다. (p. 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