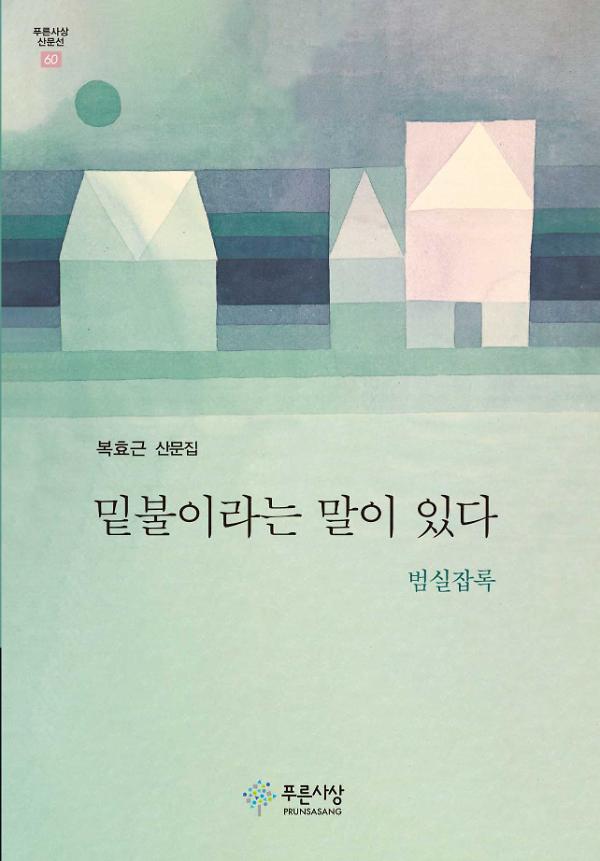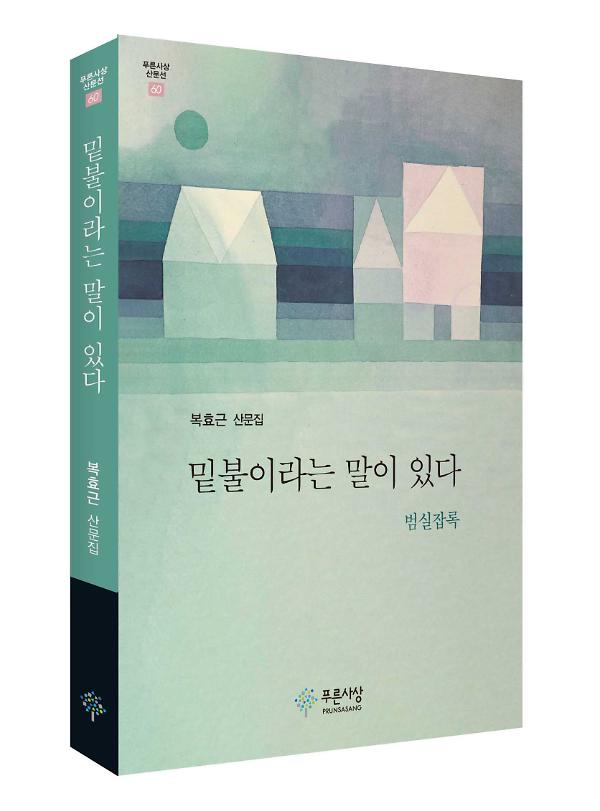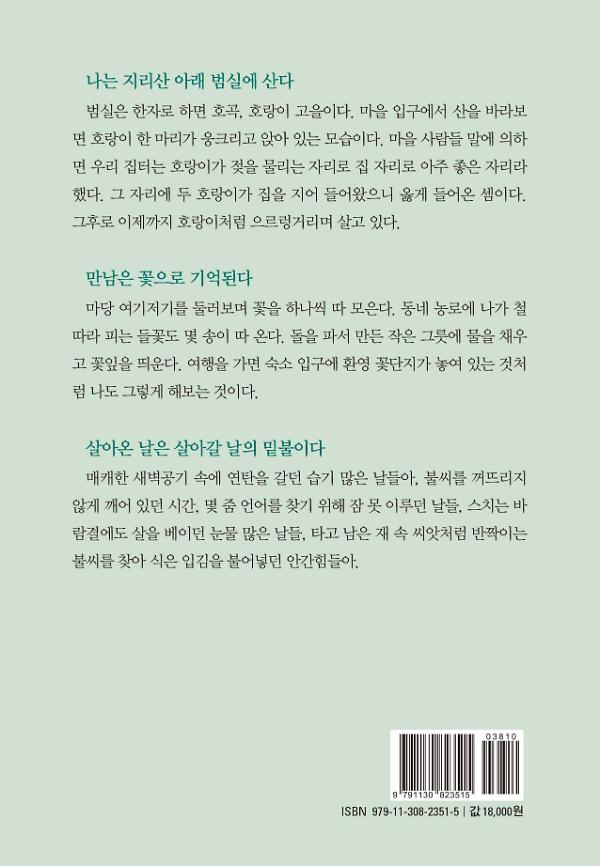범실은 한자로 하면 호곡, 호랑이 고을이다. 마을 입구에서 산을 바라보면 호랑이 한 마리가 웅크리고 앉아 있는 모습이다. 내 읽어보지는 않았으나 김정빈이라는 풍수학자가 쓴 책 『터』에 동복호(삼남의 동쪽에 호랑이가 엎드려 있는 모양의 산세)가 언급되는데 바로 그 산이라고 했다. 아직 쓰지 않은 좋은 명당이 숨어 있는 산이라고 했다. 마을 사람들 말에 의하면 우리 집터는 호랑이가 젖을 물리는 자리로 집 자리로 아주 좋은 자리라 했다. 그런 말을 딱히 믿지는 않으나 기분은 나쁘지 않았다. 그 자리에 두 호랑이가 집을 지어 들어왔으니 옳게 들어온 셈이다. 그 후로 이제까지 호랑이처럼 으르렁거리며 살고 있다. 사람 앞날 모르는 일이다. 아무 연고도 없는 이곳에 와서 둥지를 틀 줄이야. 나는 지리산 아래 범실에 산다.(14~15쪽)
마당 여기저기를 둘러보며 꽃을 하나씩 따 모은다. 동네 농로에 나가 철 따라 피는 들꽃도 몇 송이 따 온다. 돌을 파서 만든 작은 그릇에 물을 채우고 꽃잎을 띄운다. 여행을 가면 숙소 입구에 환영 꽃단지가 놓여 있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해보는 것이다.(113쪽)
매캐한 새벽 공기 속에 연탄을 갈던 습기 많은 날들아, 불씨를 꺼뜨리지 않게 깨어 있던 시간, 몇 줌 언어를 찾기 위해 잠 못 이루던 날들, 스치는 바람결에도 살을 베이던 눈물 많은 날들, 타고 남은 재 속 씨앗처럼 반짝이는 불씨를 찾아 식은 입김을 불어넣던 안간힘들아,
밑불이었다. 밑불이어야 한다. 살아온 날은 살아갈 날의 밑불이다. 이미 쓴 시는 새로이 쓸 시의 씨앗불이어야 한다. 시의 길, 재로 남는 길일지라도 불길 하나 이어놓고 가는.(171~17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