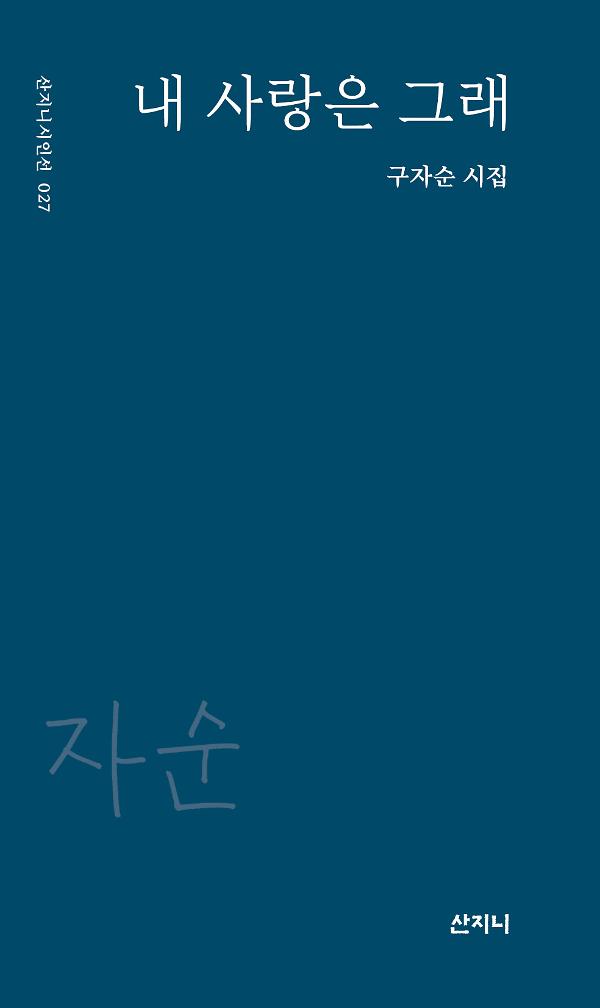어디에서도 뿌리 내리지 못한 자신을 보는 고통 속
의령 남강에 흘려보낸 삶의 무게가 74편의 시가 되다
2021년 『장소시학』 제1회 신인상 수상으로 문학사회 활동을 시작한 구자순 시인이 첫 번째 시집을 출간한다. 경남 진주 출생의 시인은 눈물조차 사치스럽게 만드는 농사와 육아의 고단함, 호된 시집살이, 남편의 무정으로 인한 절망감 속에서 빚어 올린 시 74편을 엮어 『내 사랑은 그래』로 내보인다. 농사꾼의 아내로, 세 아이의 엄마로 살아온 구자순 시인은 2007년부터 18년에 걸쳐 꾸준히 시 창작 수업에 참여하며 언어를 다듬어 왔다. 남들은 쉬이 짐작할 수 없는 고통을 안고 한동안 글을 써 내려가지 못하던 시인은 이제는 헐떡이는 언어의 격정을 다스리고, 이 시집으로 자신의 성과를 매듭지었다.
농사꾼의 아내, 세 아이의 엄마, 시골 대가족의 며느리로 살아온 세월
눈물도 사치스러웠던 농사와 육아의 고통 속에서
꾸게꾸게 밀어 넣었던 눈물이 베개를 구른다
시인은 어려운 살림 때문에 대학 꿈을 접고 농사꾼 남편을 만나 “영화도 찻집도 없이” 의령 시골로 들어서는 완행버스를 탔다. 시댁 마을로 가는 길은 “엄마 눈에 눈물 쏟게” 만든 길이었다. 엄마 눈물을 밟고 다른 남자 등을 펴게 해주고 싶었다. “니 같은 딸년 꼭 둘”이 나올까 두렵다는 친정아버지의 만류와 노여움을 물리치고 간 시댁에서 시인이 발붙일 곳은 없었다. 그를 기다리는 것은 혹독한 시집살이와 밖으로만 도는 남편의 빈 자리였다.
영화도 찻집도 없이/좋다 살자 없이/완행버스를 탔다/등을 펴게 해주고 싶었다/엄마 눈에/눈물 쏟게 하고 들어섰다 성당마을(「남강 들어서다」 중)
기대와 포부를 가지며 시골살이를 결심한 도시 진주 출신의 시인은 의령에서도 하루 두 번 완행버스가 다니는 시골 대가족의 며느리가 되었다. 하지만 시집살이는 시인의 기대와 예상을 훌쩍 넘어섰다. 견디기 힘든 가사 노동은 시인의 삶을 부엌 바닥에 내동댕이쳤다. 아이를 돌볼 여유가 없으니 세 자녀를 ‘일이삼’이라 불렀다. 아이들을 뒤로하고 들판 하우스로, 육묘장으로, 잔업에 청소 부업까지 마치고 돌아와 뒤죽박죽 자는 아이들 곁에 누우면 “꾸게꾸게 밀어 넣었던” 눈물이 베개를 굴렀다.
일 많으면 열 시 오늘은 아홉 시 저녁 해서 먹이고 설거지 밀어 놓고 막내 안고 동화책 세 권 읽어주면 일곱 권 더 들고 오고 혼자서는 절대 읽지 않아 씻기지도 못하고 재우면 10시 30분 달에 15만 원 청소 부업까지 끝내고 돌아오면 다시 1시/아이들은 뒤죽박죽 자고/벗고 누우면/꾸게꾸게 밀어 넣었던 봄이/베개를 적셔(「분침 속에 밀어 넣었다」 중)
잡히지 않는 이를 찾는 술래잡기는 자기를 찾는 걸음길이었다
고통의 김을 빼며 자기 비하와 미움의 상태에서 비로소 벗어나다
어깨를 쳐내고 다른 길로 갔다/숨 쉴 수가 없던 밤엔/너를 꾸었다/세월 지나/세상 쓰임 끝나면/밥해주고 살아야지/살아가면서/나도 늙을 텐데/귀찮아질 텐데/어디서 만나야 하나/내 속에 네가 있으니/네게 가야지/넌 오지 마라 하겠지(「데미안」 중)
시인은 「데미안」에서 죽음에 맞닥뜨려야만 그칠 것 같던 고통이 성장을 위해 필요했던 과정이었음을 고백한다. 이제 시인은 “살짝살짝” 고통의 김을 빼며 거리를 두고 바라보게 되었다.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랑에 몸 던졌던 자신을 비하하고 원망하면서 자신을 고통의 먹잇감으로 던지는 상태에서 벗어났다. 절망도 노여움도, 자학과 무기력도 이제는 멀찍이 내던지고 굽이굽이 고통스러웠던 사랑의 처음과 끝을 유장한 혼잣소리로 들려준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는다.
“내 사랑은 이래. 그렇다면 네 사랑은 어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