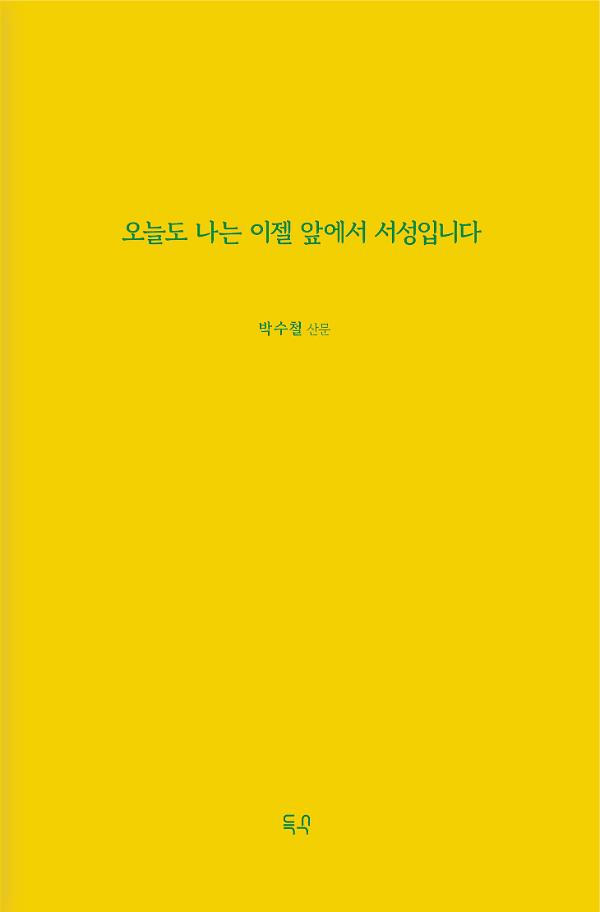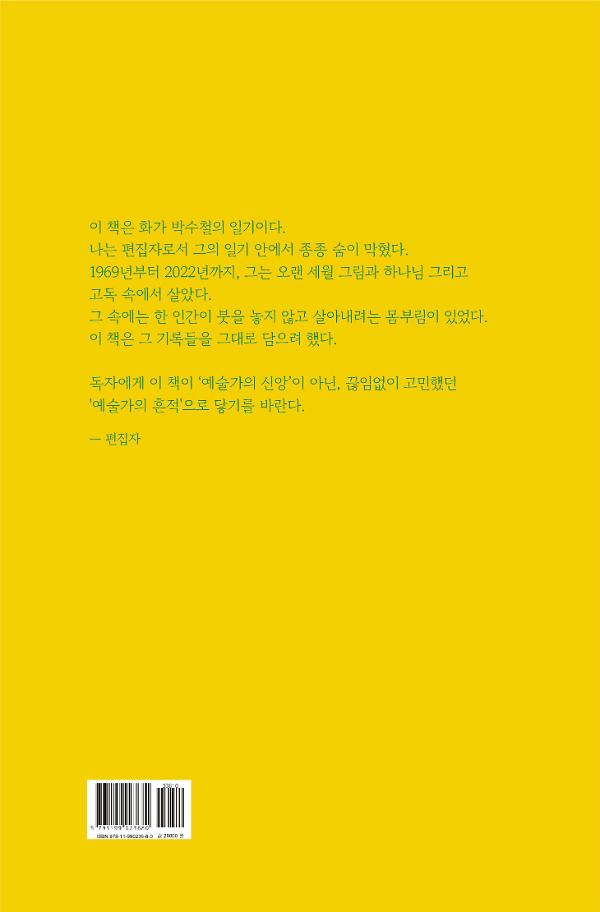끝내 붓을 내려놓지 않은 한 인간의 기록
그릴 수 없음의 절망 속에서, 그래도 살아 있었던 시간들
이 책은 1950년 포항에서 태어난 화가 박수철이 남긴 50년간(1969년~2022년)의 일기와 편지를 엮은 기록이다. 그는 단 한 번도 전문적인 미술 교육을 받지 않은 채 그림을 그려왔다.
“나는 예술가인가?”
“나는 화가인가?”
그는 이 질문들 앞에서 끝내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싶어 한다.
이 책에 담긴 박수철의 삶은, 예술가로서의 열망과 가장으로서의 무능감이 충돌하는 자리에서 시작된다. 그림 앞에서는 늘 절망했고, 생활 앞에서는 늘 미안했다. 작업실에서 그는 자신을 “버려진 폐농기구처럼 녹슬어 있는 존재”, “절망에게 죽은 자로 끌려가는 사람”이라고 부른다. 그에게 그림은 위안이 아니라 싸움이었고, 창작은 성취보다 패배의 감각에 가까웠다.
그러므로 이 책은 ‘성공한 예술가의 연대기’도 박수철의 예술론도 아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자신에게 묻는 한 인간의 고백에 가깝다.
그릴 수 없음의 절망 속에서도, 그는 매일 작업실에 가서 무엇이 그림이 될 수 있는지 판단하지 못한 채, 이젤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끝없이 기록했다.
그래서 책에 실린 일기와 편지들에는 거창한 사건 대신, 햇살이 깊숙이 들어오는 늦가을 작업실, 휘어진 빈 가지의 벚나무, 아들이 보내온 생일 축하금 십만 원, 아내가 무심코 툭툭 쳐주는 손길 같은 순간들이 등장한다. 그는 그런 사소한 장면들 속에서 잠시 자신을 용서받고, 살아 있음을 확인한다. “나의 못남이, 나의 무능함이 말갛게 지워지는 순간”은 늘 일상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찾아온다.
박수철에게 일기를 쓴다는 것은, 하루를 견뎌냈다는 증거이자 삶을 붙들기 위한 마지막 방법이었다. 빛과 바람, 하늘과 들판, 시든 꽃은 그날의 마음을 담는 그릇이 되었고, 그림은 완성되지 않아도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행위였다.
예술이란 무엇인가.
끝내 확신하지 못하면서도 계속 그리는 사람을 우리는 무엇이라 부를 수 있는가.
그리고 “만약 다시 생을 시작한다면, 이보다 나을 수가 있을까?”라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는가.
패배감 속에서도 살아낸 시간, 무너짐 속에서도 이어진 박수철의 삶의 기록들, 그가 남긴 문장을 통해 그림을 그리는 사람만이 아니라 끝까지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은 모든 이에게 이 책이 다가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