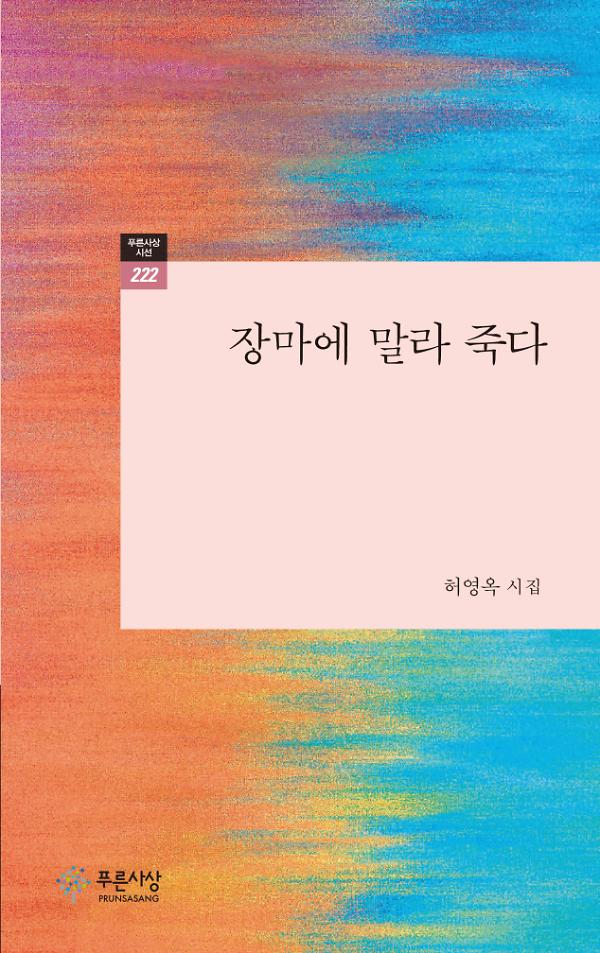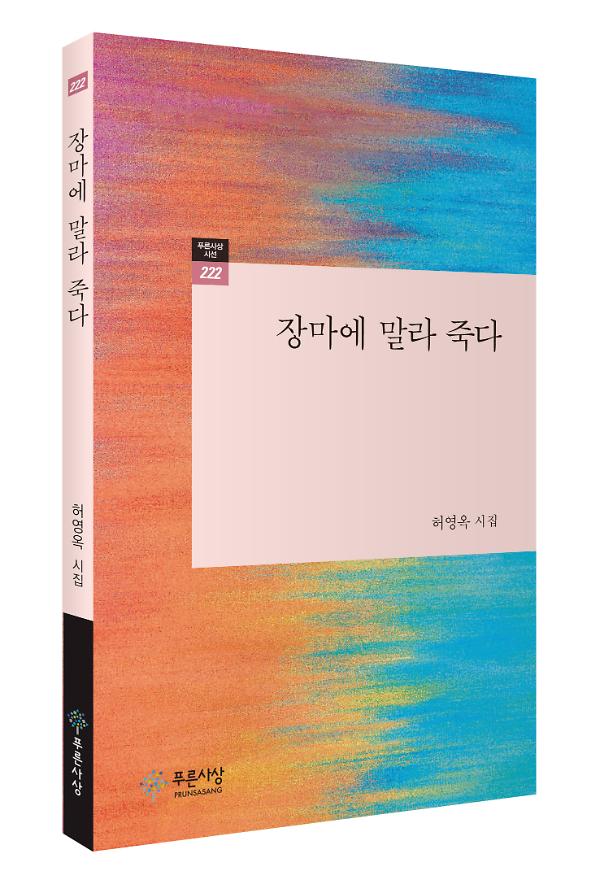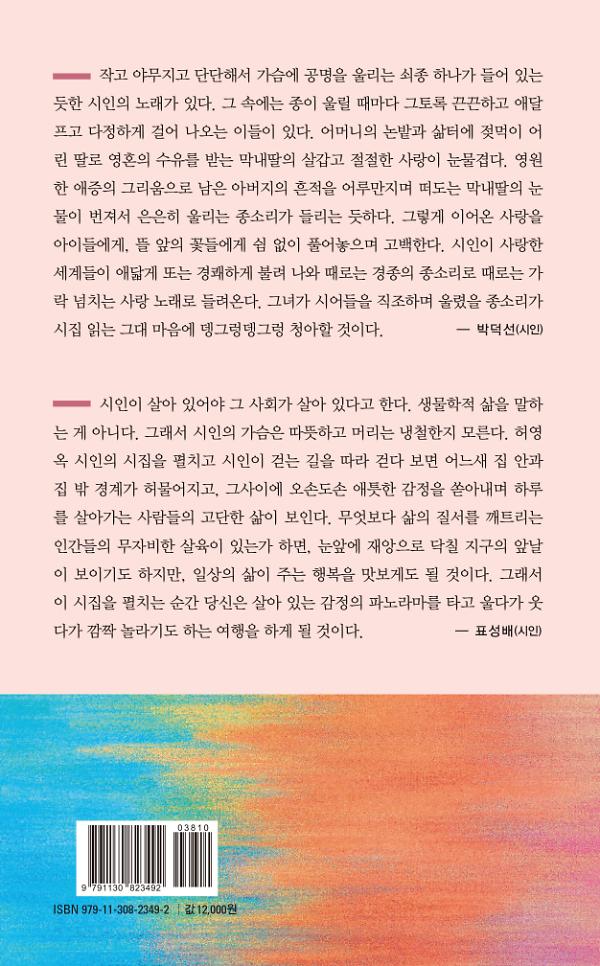작품 세계
유한성의 지배를 받는 인간은 어떤 한 시기에 이르러 특별한 감정을 경험할 때가 있다. 이러한 감정을 우리는 ‘고독’이라고 하고, 또는 ‘자기로의 복귀’라고도 한다. 고독이란 한 인간을 갇히게 하는 어둠이고, 외부와 차단된 채 자신을 익명성 속에 웅크리게 하는 감정이다. 왜 고독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날까? 인간의 감정에는 인격성과 비인격성이 혼재해 있다. 그 때문에 자아는 죽음과도 같은 어둠 속에서 자신을 외롭고 쓸쓸하게 한다. 레비나스에 의하면 고독은 물질에 대한 걱정이 홀로서기 자체에서 생기고, 또한 이 걱정은 인간으로서 속 깊은 불행에 대응하고자 하는 진지한 시도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 개인의 물질적 욕망 때문에 걱정이 일어나고, 그걸 알면서도 인간은 존재의 짐을 스스로 벗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고독 속에 오래 갇혀 있다 보면 빛이 필요하다. 그래서 홀로서기를 시도한다. 고독 속에서 홀로서기는 성찰이고 빛이다. 탈고독화로 자신을 정립한 인간은 사회성을 가진 자유인으로 살아간다.
허영옥 시인 역시 2017년에 첫 시집 『그늘의 일침』 이후 자아가 세계 속에서 철저하게 고립된 채 고독 속에 웅크리고 있다가 합리적 반성과 성찰을 통해 구체적인 외부성의 문제에 접근하게 된다. 시인에게서 구체적인 외부성이란 부모와의 소통의 관계나 존재의 본질을 자신의 바깥에서 찾아나가는 자아의 외적인 모습을 의미한다. 여기에 관한 시편들이 『장마에 말라 죽다』이다.
(중략)
시인의 시편에는 일상의 쓸쓸한 내면을 넘어서 자신과 부모와의 관계, 고향 이웃이나 인류에 대한 속 깊은 윤리적 이해가 들어 있다. 이는 현실을 살아가는 시인의 마음이 헐거워지면 꾸준히 성찰하고, 그러면서 엄격함을 유지해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시인의 시가 지니고 있는 쓸쓸함과 긴장감이 주는 미 또한 전쟁 같은 인류의 거대한 주제에서 오는 게 아니다. 자신과 타자들의 고단한 일상에서 오는 고독과 당위적 현실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용해되며 이루어내는 통합된 조화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무미건조한 일상과 그것을 넘어서는 세계로의 확장, 대극점이 공존하는 세계가 허영옥 시의 주조를 이루고 있다.
― 권영옥(문학평론가) 해설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