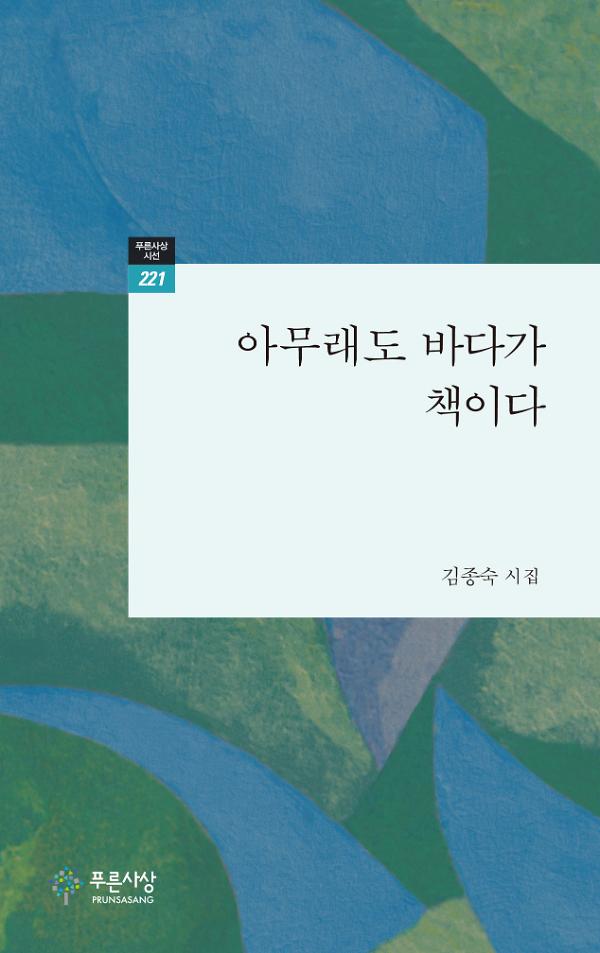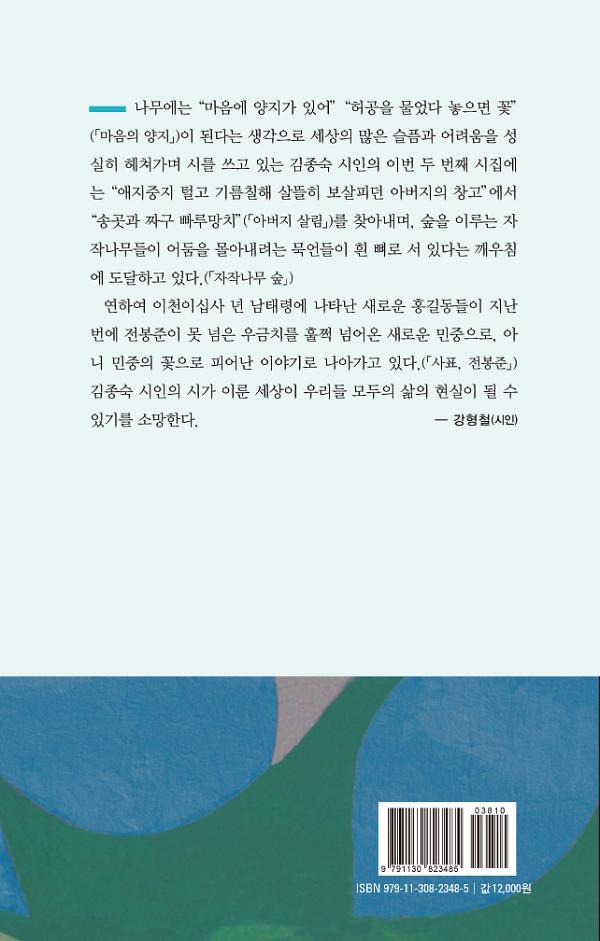작품 세계
높은 파고가 삶을 뒤흔들 때라거나, 강한 중력장이 절망의 방향으로 작동할 때라거나, 때로 무릎이 꺾이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을 순간이더라도,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삶을 살아내야 한다면, 그때의 자세는 무엇이어야 할지에 대해서, 시인 김종숙이 내놓는 답변은 명백하다.
인간은 언제나 길 위의 존재라는 것, 그러므로 멈추지 않고 움직이는 꼴의 자세가 요청된다는 것, 쓰러지지 않기 위해 내딛는 지금의 한 걸음이 다음의 한 걸음을 위한 디딤돌이 된다는 것, 즉 인간은 영원한 ‘호모 비아토르(homo-viátor)’라는 것, 이것이 시 「콘트라포스토」를 통해 제시한 시인의 명징한 명제이다. (중략)
「콘트라포스토」에서 멈추지 않는 삶의 자세를 선언한 사람이라야만, 〈어둠의 연작〉에서 볼 수 있듯이 먹빛 어둠에 깃든 수많은 빛들의 색을 발견하는 사람이라야만, 〈나무 연작〉에서 볼 수 있듯이 자연의 재생 능력을 통해 꽃이 사실은 모든 혼돈의 표상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이라야만, 이윽고 그러한 시선을 통해 아버지의 삶을 복원하고 기억하는 사람이라야만, 자신의 삶으로부터 출발하여 세계의 모든 존재에 깃든 운동성을 발견하는 사람이라야만, 이 시집의 3부에 실린 이른바 〈역사 연작〉을 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말이다. 시인의 일관된 시선은 이 지점에 이르러 기어이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넘어 애도를 종결짓지 못한 역사의 정동들이 깃든 대상을 발견한다. (중략)
죽음에 이른 그들의 삶이 살아남은 우리의 삶과 다르지 않다. 이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 시인은 “나는 어느 사이 권력에 결탁한/구부러진 담론의 생산자가 되었던가”(「푸코의 담론」)라고 자문하는 것이다. 스스로를 심문에 회부하면서, 철저한 자기부정의 길을 마다하지 않으면서, 쓰러질 듯 결코 멈추지 않는 콘트라포스토의 꼴로, 시인은 길 위의 존재임을 마다하지 않는다. 시집의 마지막 즈음에 슬며시 배치된 「호모 비아토르」에는 길 위를 걷는 사람으로서의 출사표가 쓰여 있다. 시인 김종숙의 정신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 일독을 권한다.
― 김영삼(문학평론가) 해설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