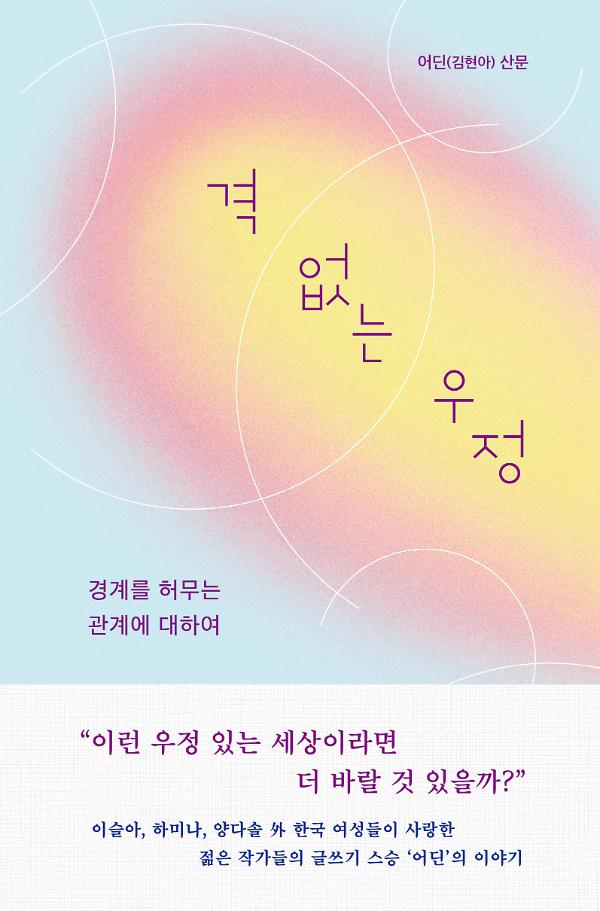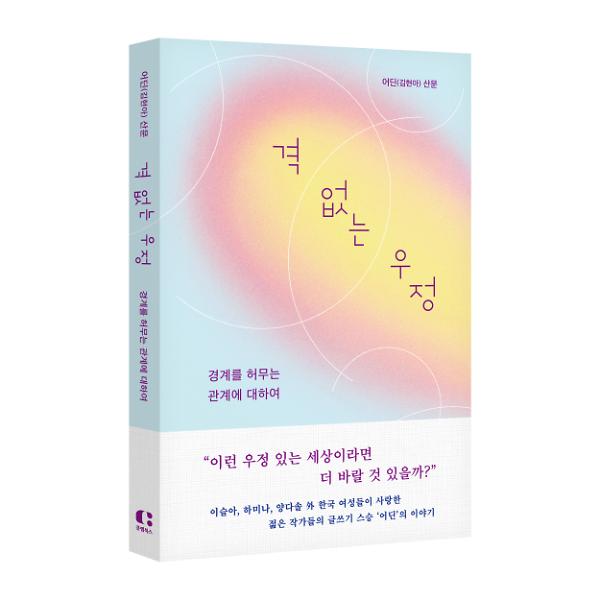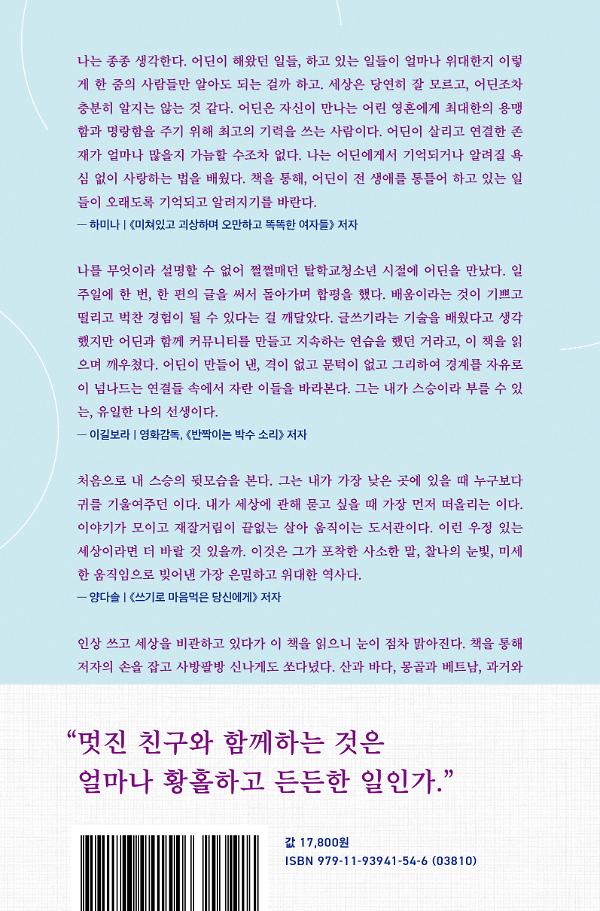스물네 살, 청춘의 나는 모국어로 하고 싶은 일이 따로 있었다. 독재를 타도하고 광주 학살의 진실을 밝히고 조국 통일의 과업을 완수하려는 이들의 이야기, 돌아오지 않는 화살이 된 이들의 이야기, 변방에서 들려오는 희미하지만 다급한 북소리, 청춘의 나는 그런 이야기를 쓰고 싶었다. 수줍어 수줍어서 고개를 못 드는 이야기, 부끄러워서 속으로 삼켜진 이야기,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 허공중에 흩어진 이야기. 그러므로 자본주의의 꽃인 광고를 하는 데 내 모국어를 쓰는 것은 치욕스럽다고, 1990년 스물네 살의 나는, 어이쿠, 그랬다.
- 18쪽 ‘누가 나에게 이 길을 가라 하지 않았네’ 중에서
어린이들이 선생님에 대해 쓴 글을 들을 때면 마음이 서늘할 때가 있다. 선생님의 한 마디, 선생님의 작은 행동 하나가 종종 어린이들의 삶에 커다란 파장과 울림을 만들어 냄을 깊이 새기어 그이들을 만날 일이다. 수업은 열정적으로, 고민은 집중해서 들어주시는 무엇보다 공평하고 너그러운 선생님과 공부할 준비가, 어린이들은 언제나, 늘, 항상 되어 있다. 인류의 유산이 전승되는 현장이다.
- 38쪽 ‘나도 막 살고 싶다 _어린이글방’ 중에서
글방에서 나는 세상의 모든 엄마를 만난다. 일곱 밤만 자면 돌아온다고 할머니 집에 맡겨두고는 서른 중반이 넘은 지금까지도 오지 않는 엄마, 알코올중독자 엄마, 사자의 갈기 같은 머리를 한 엄마, 나를 낳고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 해 일찍 죽은 엄마, 가부장제에 복무하는 엄마, 가부장제에 저항하는 엄마, 그 모든 엄마들은 딸의 글에서 생생한 표정을 얻는다.
- 56쪽 ‘유전자 혁명, 은밀하고 위대하게 _직장인여성글방’ 중에서
“결, 상황을 설명해 줄 수 있겠어?”
“저희가 청소년이다, 청소년이다 소리를 질렀는데도 마구잡이로 잡아갔어요. 개같은 경찰들이.”
“오케이, 지금 현장에 누구누구 있어요?”
“다 있어요. 저희 다요.”
“결, 내 말 잘 들어요. 오늘은 일단 집에 들어갑시다. 지금 다들 약간 흥분한 상태라 오늘은 집에…”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결이 대답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투는,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이었다. 떠별들이 거부 의사를 밝힐 때 쓰는 말은 주로 싫어요 혹은 안 돼요, 같은 것들이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라니. 이토록 분명하고 결연한 어투를 청소년에게 들어본 건 처음이었다.
- 121쪽 ‘아니오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겨우 이런 것인데, 고운, 혹여 살아가다 상심이 되거나 너를 의심하게 되는 날엔 꼭 나를 찾아오길. 네가 얼마나 담대하고 이쁘고 명민한 사람인지를 증언해 줄게. 그 이야기라면 아마 하루 하고도 반나절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야.
- 135쪽 ‘뒤늦은 연서’ 중에서
동지는 우연히 되는 건 아닌 거 같아. 도모하고 공조하고 연대하며 모험과 분투의 시간을 같이 보낼 때, 끝없는 노동과 남모를 수모를 함께 견디어 낼 때, 서로의 시련과 상처를 오오래 목격하고 증언할 수 있을 때, 동지, 비참과 위대를 동시에 지닌, 고결과 어리석음을 한몸에 간직한, 세상에서 가장 나약하고 동시에 가장 절박해서 강인한 나의 벗이 거기에 있지.
- 152쪽 ‘고귀한 것들은 사라지지 않고 전승된다’ 중에서
산소, 이제 비밀을 발설할 시간이 되었구나. 마침내 때가 온 것 같아 오래 간직한 이 비밀을 너에게 전하니, 이 말을 접한 네가 할 일은 언젠가 때가 오면 너 역시 누군가에게 이 말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한 번도 진 적이 없다. 사바나의 숲에서 두 발로 선 이후 지금까지 인류는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뭇 생명을 살리는 유전자가 승리하도록 진화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야. 고귀한 것들은 사라지지 않고 전승된다, 겨우 간신히 가까스로.
- 154쪽 ‘고귀한 것들은 사라지지 않고 전승된다’ 중에서
영국이나 프랑스, 미국, 스위스처럼 조금 더 선진적인 나라로 가지 왜 한국으로 왔냐고 누군가 물었을 때 NLD 회원 중 한 명이 말했다.
“한국은 광주 있잖아요. 시민들 힘으로 민주주의 만든 나라잖아요.”
속으로 생각했다. ‘이런 젠장, 오래 갈 관계야.’
- 187쪽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중에서
반 레는 그의 본명이 아니다. 죽은 친구의 이름이다, 시인이 되고 싶었던. 반 레가 시인이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이름 ‘레 지 투이’를 버리고 친구의 이름을 썼다. 그 친구가 이름 속에서 영원히 살기를, 자신이 시를 쓰는 것은 그 친구의 바람을 실현하기 위해서일 뿐이라고, 반 레가 되기로 한 반 레는 생각한 것이다.
- 208쪽 ‘굿 바이 반 레’ 중에서
그들이 주인이고 나는 객이었다. 그 느낌은 분명하고도 선연했다. 그들의 세계에 잠시 떠돌 뿐, 결코 장악하거나 소유하지 못하는 세상이 있다는 것만으로 마음이 충만해졌다. (…) ‘인간이 주인이 아닌 곳에서 인간은 아름다웠다.’ 바다 밑 24미터까지 내려간 날 잠수일지에 적었다.
- 223쪽 ‘생명의 얼굴’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