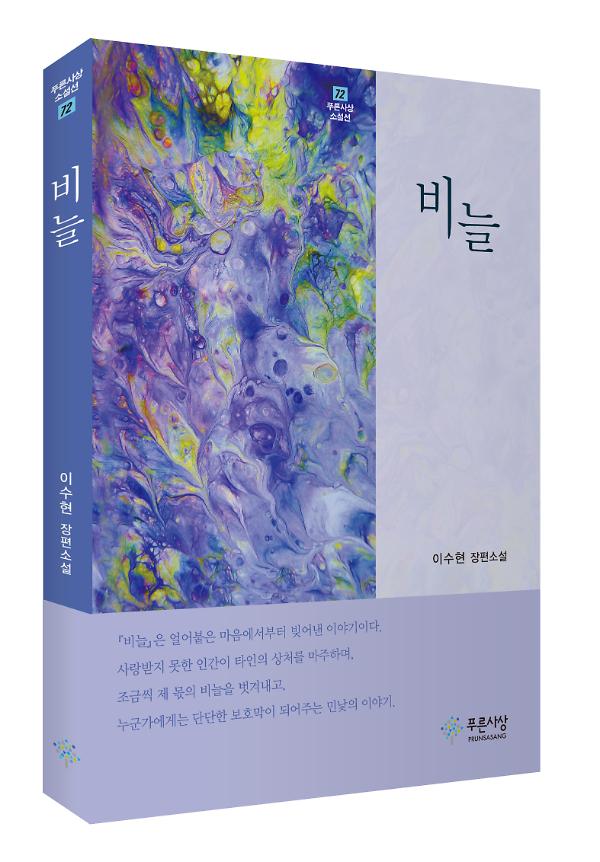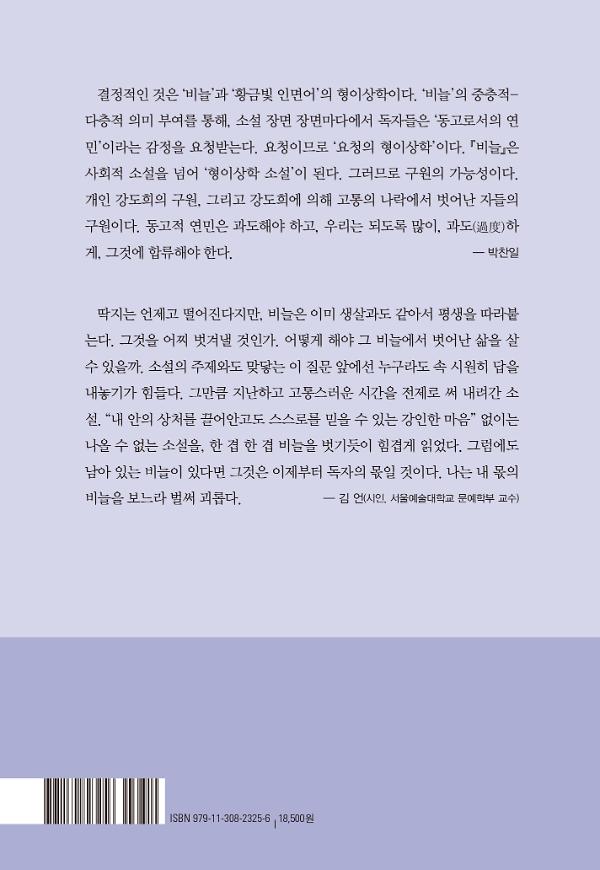그때, 인면어 한 마리가 눈에 들어왔다. 마치 바다의 왕이라도 된 듯 수족관 전체를 유유히 휘젓고 다니던 황금빛 인면어였다. 그 녀석이 천천히 내 쪽으로 헤엄쳐왔다. 발걸음이 얼어붙어, 나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다. 인면어는 마치 내 심연을 꿰뚫어보는 듯, 또렷한 눈동자로 나를 찬찬히 응시했다. 처음엔 그저 사람 눈과 비슷하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인면어들과는 분명 무언가 달랐다. 입을 뻐끔이며 황금빛 비늘을 찰랑거리는 모습은, 어쩐지 ‘만져보라’고 유혹하는 듯했다.
찰랑.
어느새 나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수조 안으로 집어넣고 있었다. 그 반짝이는 비늘, 한 번쯤 만져보고 싶다는 욕망이 나를 움직였다. 놀랍게도 황금 인면어는 도망치지 않았다. 오히려 조용히 내 손에 몸을 기대었다. 미끈거리는 비늘이 손끝에 닿는 순간, 짜릿한 전류가 번쩍. 온몸을 타고 퍼졌다. 눈앞이 번쩍이고, 온몸의 털이 곤두섰다. 등줄기를 따라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26쪽)
오랜만에 들여다본 어머니의 얼굴은 이미 생기와 양분이 다 빠져 있었고, 피부는 비늘처럼 얇아진 상태였다. 오랜 폭력으로 인해 상처받은 마음이 겉으로 드러난 듯 피폐해 보였다. 쉽게 벗겨낼 수 없는 생명체의 비늘처럼, 그녀의 얼굴에 알알이 새겨진 주름은 그녀가 감내해온 삶의 무게를 상징하듯 굵고 진했다. 언젠가부터 어머니의 웃는 얼굴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새집을 얻어 나와 잘 때도 어머니는 작은 몸을 늘 공처럼 둥글게 만 채 이불을 얼굴까지 뒤집어썼다. 마치 비늘로 제 몸을 방어하려는 듯, 동시에 모든 감각을 차단하려는 듯 말이다. (53쪽)
나는 다시 펜을 집어 들며 속삭이듯 기도했다. 연화와 예리가 이 거대한 상처 속에서도, 비록 아물지 않는 비늘일지라도 조금 더 나은 세상을 향해 헤엄쳐가기를 인간의 변화는 더디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품는 것이야말로 인간다움의 증거일지도 모른다. (13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