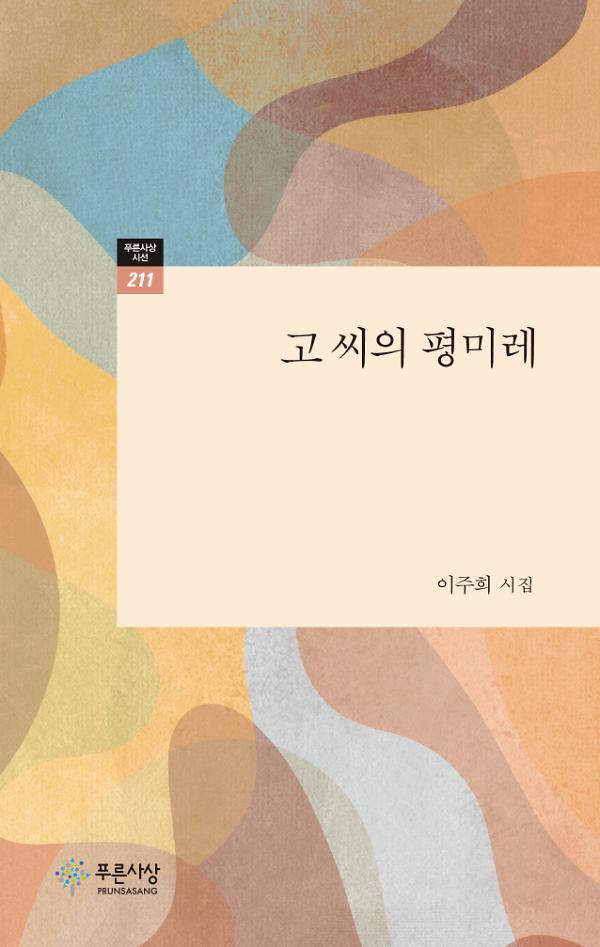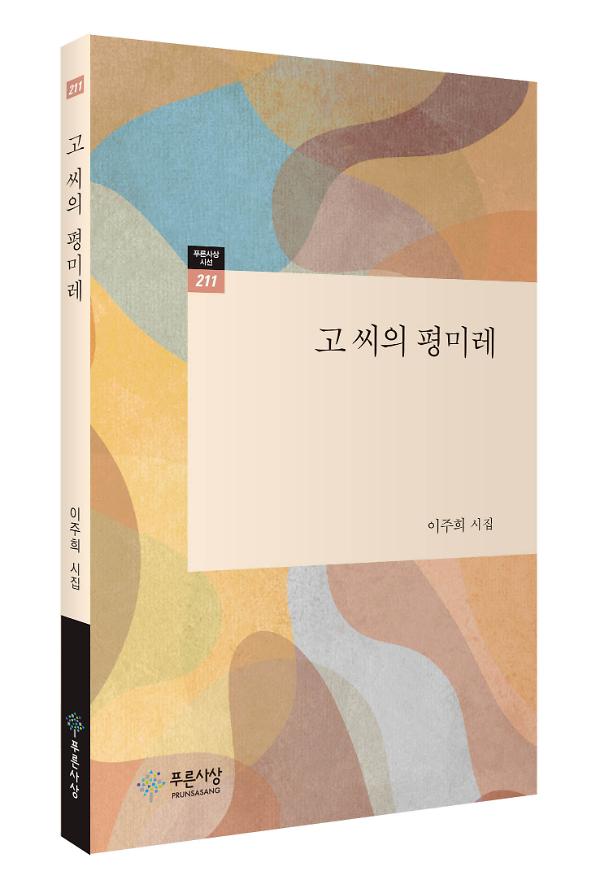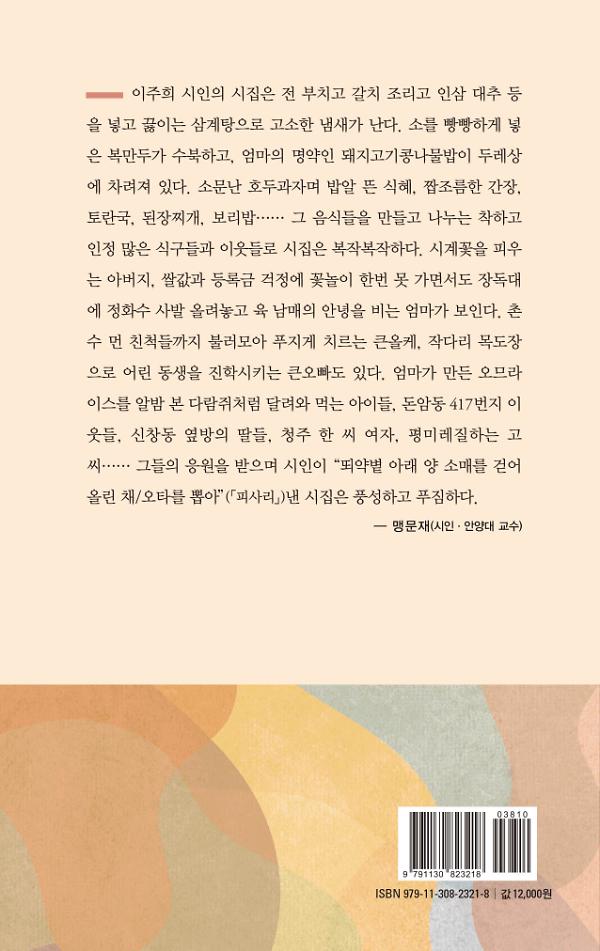나의 알천 돈암동
성당집 할머니는 일요일마다 식구들과 설빔 차림으로 나서며
천당도 함께 가자고 이웃에게 손을 내밀었다
소아마비로 다리를 저는 같은 반 친구 동춘이네는 차관집이었다
일하는 할머니가 가끔 귀뚜라밋국을 끓인다며 난처해하는
그 애 엄마를 겸손하고 착하다며 모두 칭찬했다
소꿉장난할 땐 은행집에서 집집이 선물한
코끼리 저금통에 동전밥을 먹이며 놀았다
인심의 화수분인 텔레비전집은 교수집이었는데
이은관이 배뱅이굿을 하는 날에는 밤늦도록 대문을 열어놓았다
주인이 기억나지 않는 두 집은 내겐 권 대감집과 이 대감집이었다
고욤이 잔뜩 매달린 나뭇가지가 아랫집으로 넘어왔는데
오성이 권율 장군의 사위가 된 이야기를 들은 후부터였다
고무줄놀이를 하던 정옥이네는 민영환의 친척집이라 했다
적산가옥이라는 이층집은 멋진 정원에 담쟁이덩굴로 덮인 집채
열어놓은 창문에서 뻐꾸기시계가 울어 동화 속 마법의 성이었다
맨 아래 병원집이 있었는데
한밤중에도 왕진을 오는 의사의 웃음은 약사여래를 닮았다
북한산 줄기를 이고 있는 동굴집은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했다
눈비에도 끄떡없고 그네도 매여 있어 나는 무시로 드나들었다
순옥이 동생이 내가 타는 그네에 부딪혀 넘어졌을 때
그 엄마는 되레 자기 아들을 나무랐다
곗돈을 타먹은 계원이 도망가자
계주였던 세탁소집 아줌마가 시름시름 앓다 죽었다
악다구니 대신
마을 어른들은 남은 식구의 반찬을 만들어 나르고
아이들은 그 집 꼬마와 놀아주었다
나의 알천 돈암동 417번지
오르막 삼거리 가장 꼭대기 우리 집은
둥구나무 아래 평상처럼 늘 복작복작했다
고 씨의 평미레
실개천이 끝나는 곳의 쌀집 주인은
고무줄 자[尺]라는 소문이 자자했어요
평미레를 끝까지 미는 말질에
어쩜 쌀 한 톨까지 깎아버리냐 항변하면
추수 마친 논바닥처럼 밀 뿐이라 대꾸했지요
그래도 손주를 데리고 사는 옴팡집 할머니나
거스러미 같은 아들과 사는 강진댁이
되쌀을 사러 오면
머슴밥처럼 담았고요
도래솔에서 소탱소탱 소쩍새 울던 날
흥부 자식처럼 누더기 차림인
산마루 기찻집 오누이에겐
따끈한 밥을 내주고 너끈하게 덤까지 주었지요
하루는 말쌀을 사러 온
파란 철대문집 아주머니가
다른 이들에겐 후하면서
내게만 야박하냐고 따졌다지요
고 씨의 대답
요즘 세상에 아이들이
배고픈 설움은 없어야 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