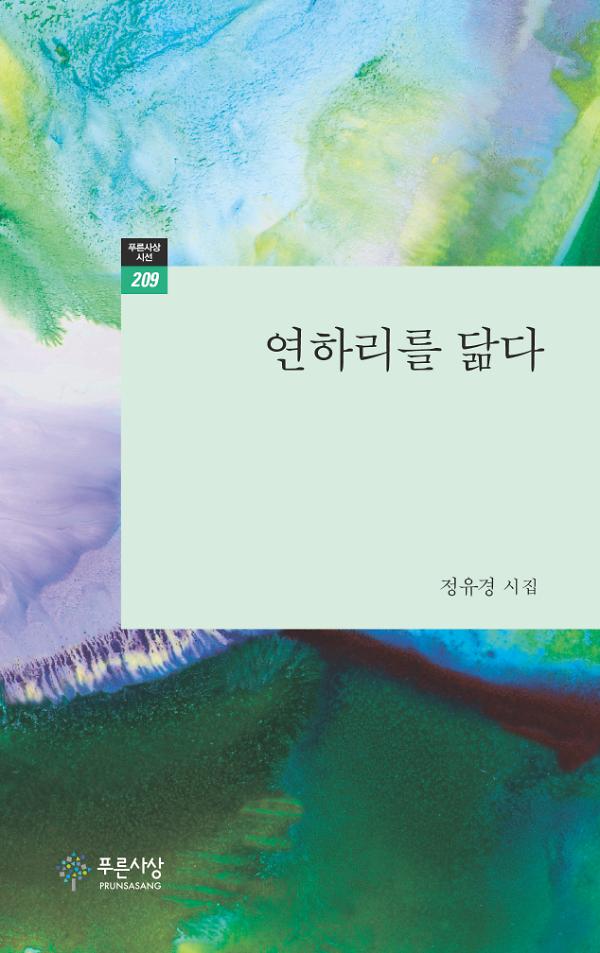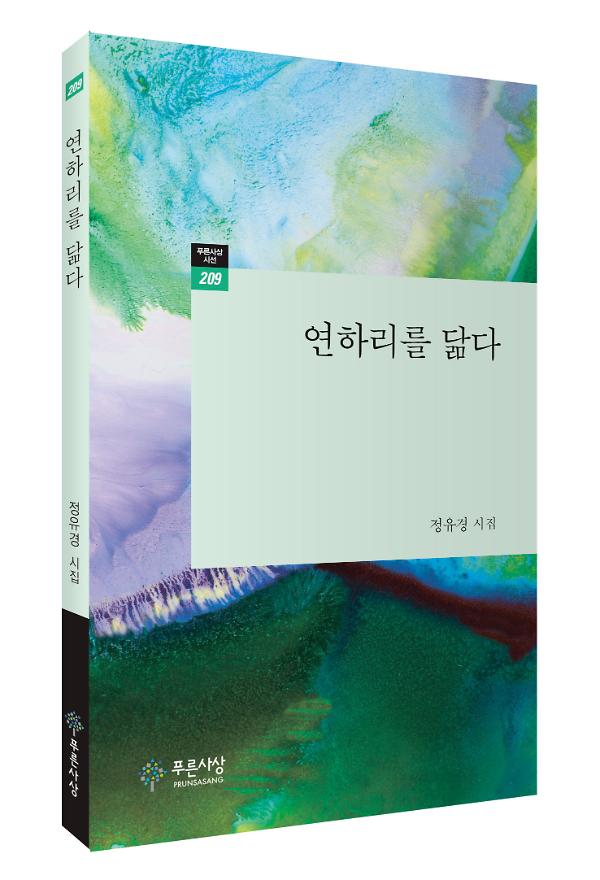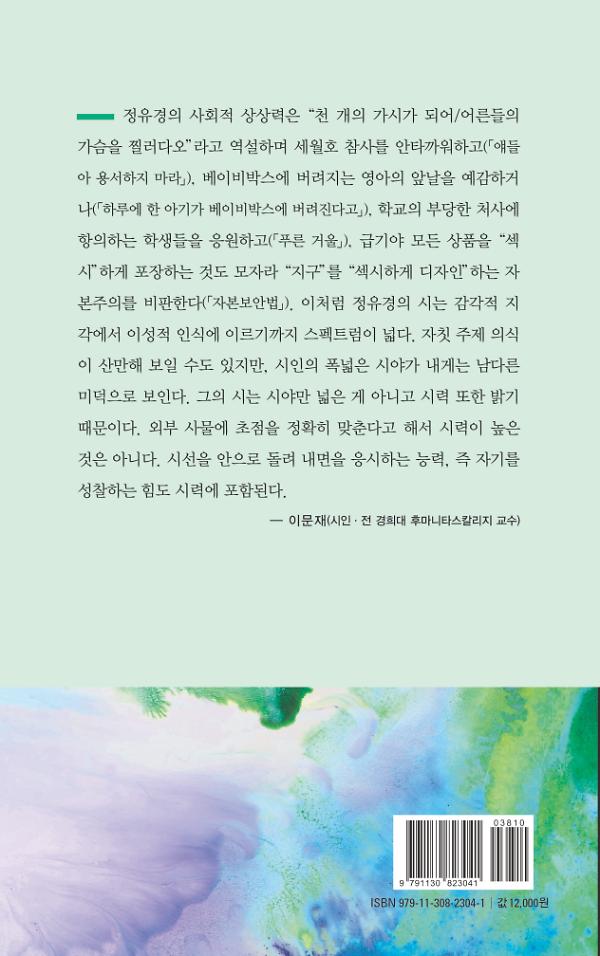정유경의 시를 시이게 하는 ‘다른 인생’은 무엇인가. 그리고 다른 인생으로 이루어진 시는 독자에게 어떻게 ‘선물’이 될 수 있는가. 우리의 존재와 삶이 그렇듯이 시가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지 않는다면 좋은 시라고 말할 수 없다(누군가에게 선물이 되지 않는다면 그 삶은 실패한 삶이라고 말한 이는 이반 일리치다).
정유경의 이번 시집은 네 개의 ‘다른 인생’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하리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른바 ‘문제아들’, 그리고 연하리의 또 다른 어엿한 주민인 뭇 생명이 그 둘이고 나머지 둘은 심도 깊은 자기 성찰과 사회 현실에 대한 비판적 관점이다. (중략)
좋은 시를 판별하는 여러 기준 가운데 하나가 ‘감각 지각’이다. 독자의 감성을 자극해 독자로 하여금 세계감(世界感)을 깨닫도록 하는 시가 좋은 시다. 위 시에서 살펴보았듯이 정유경의 시는 감응을 통한 인식 지평의 확장, 즉 아이스테시스의 모범을 보여준다. 랑시에르의 관점을 빌리자면, 아이스테시스는 곧 정치(민주주의)와 직결된다. (중략)
정유경의 사회적 상상력은 “천 개의 가시가 되어/어른들의 가슴을 찔러다오”라고 역설하며 세월호 참사를 안타까워하고(「얘들아 용서하지 마라」), 베이비박스에 버려지는 영아의 앞날을 예감하거나(「하루에 한 아기가 베이비박스에 버려진다고」), 학교의 부당한 처사에 항의하는 학생들을 응원하고(「푸른 거울」), 급기야 모든 상품을 “섹시”하게 포장하는 것도 모자라 “지구”를 “섹시하게 디자인”하는 자본주의를 비판한다(「자본보안법」). 이처럼 정유경의 시는 감각적 지각에서 이성적 인식에 이르기까지 스펙트럼이 넓다. 자칫 주제 의식이 산만해 보일 수도 있지만, 시인의 폭넓은 시야가 내게는 남다른 미덕으로 보인다. 그의 시는 시야만 넓은 게 아니고 시력 또한 밝기 때문이다. 외부 사물에 초점을 정확히 맞춘다고 해서 시력이 높은 것은 아니다. 시선을 안으로 돌려 내면을 응시하는 능력, 즉 자기를 성찰하는 힘도 시력에 포함된다.
― 이문재(시인·전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해설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