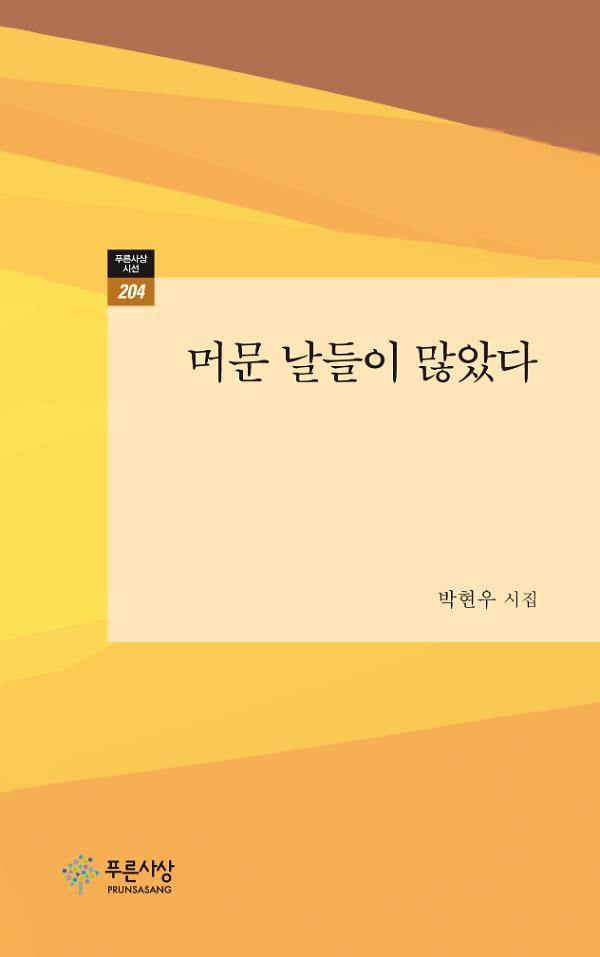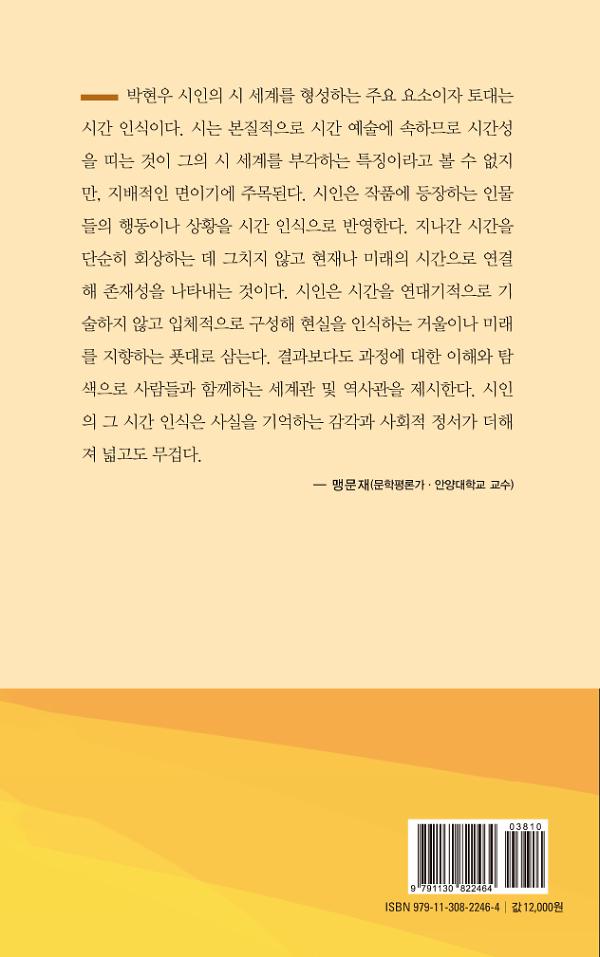박현우 시인의 시 세계를 형성하는 주요 요소이자 토대는 시간 인식이다. 시는 본질적으로 시간 예술에 속하므로 시간성을 띠는 것이 그의 시 세계를 부각하는 특징이라고 볼 수 없지만, 지배적인 면이기에 주목된다. 시인은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행동이나 상황을 시간 인식으로 반영한다. 지나간 시간을 단순히 회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재나 미래의 시간으로 연결해 존재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시인의 시간 인식에는 자기를 긍정하는 세계관이 들어 있다. 이 세계 속에서 자기 존재를 부정하거나 배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견지한다. 자기의 처지를 비관적으로 여기기보다는 만만하지 않은 삶의 조건들을 기꺼이 품고 나아간다. 분노나 불안 같은 정서에 굴복당하지 않고 “세상에 눈감는 자가 되지 않”(「꽃 편지」)는 자세로 사회적 참여를 늘인다. 이기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주체적인 사고로 타인과의 친밀감을 높이고 신뢰를 쌓는다.
자본주의 체제에 순응하는 사람들은 자기 이익의 추구에 함몰되어 다른 이들과 경쟁할 뿐 연대의 기회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공동체 가치를 추구하지 못해 “너무 많은 뻥에 뻥튀기를 당”(「뻥을 튀기는 리어카 옆에서」)하는 것은 물론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소외당한다. 시인의 시간 인식은 이와 같은 상황에 놓인 사람들의 자기애를 회복하는 역할을 한다. 사회적 존재성을 자각해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품는 인간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다.
시인은 시간을 연대기적으로 기술하지 않고 입체적으로 구성해 현실을 인식하는 거울이나 미래를 지향하는 푯대로 삼는다. 결과보다도 과정에 대한 이해와 탐색으로 사람들과 함께하는 세계관 및 역사관을 제시한다. 시인의 그 시간 인식은 사실을 기억하는 감각과 사회적 정서가 더해져 넓고도 무겁다.
― 맹문재(시인·안양대 교수) 해설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