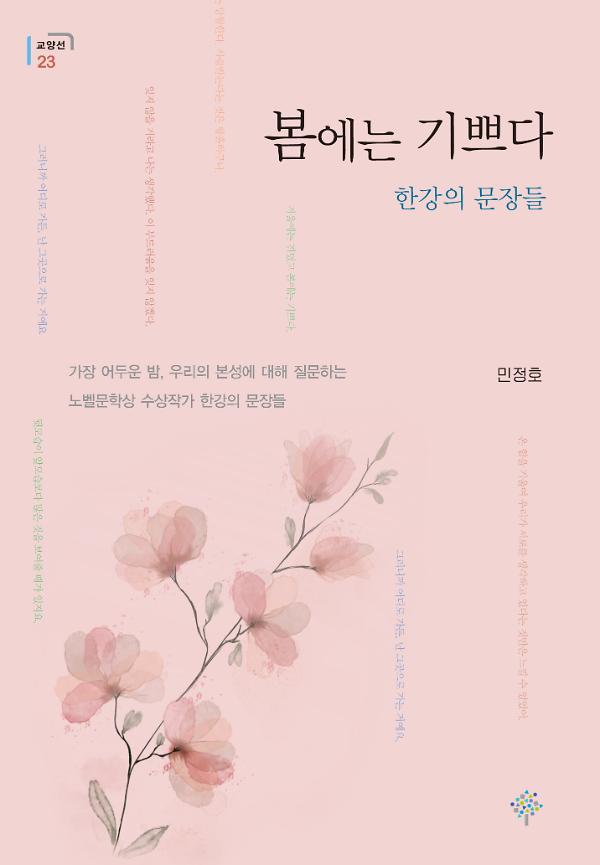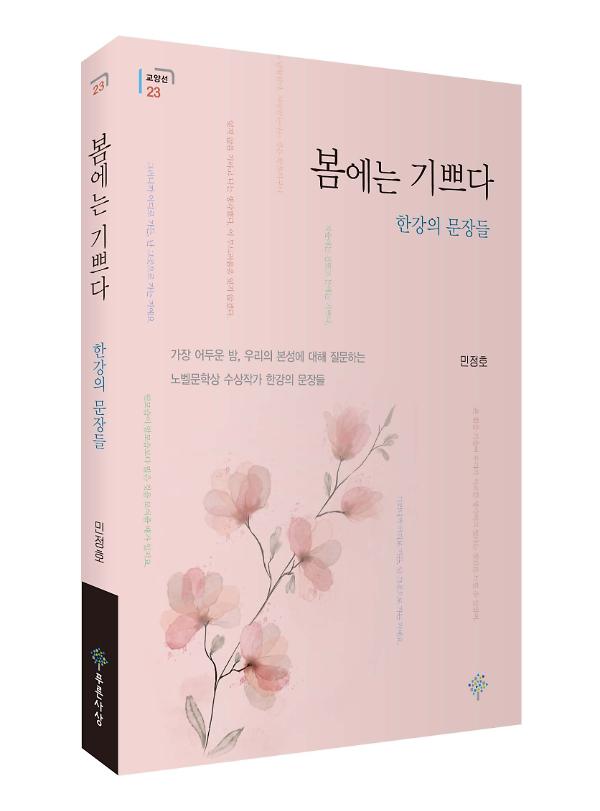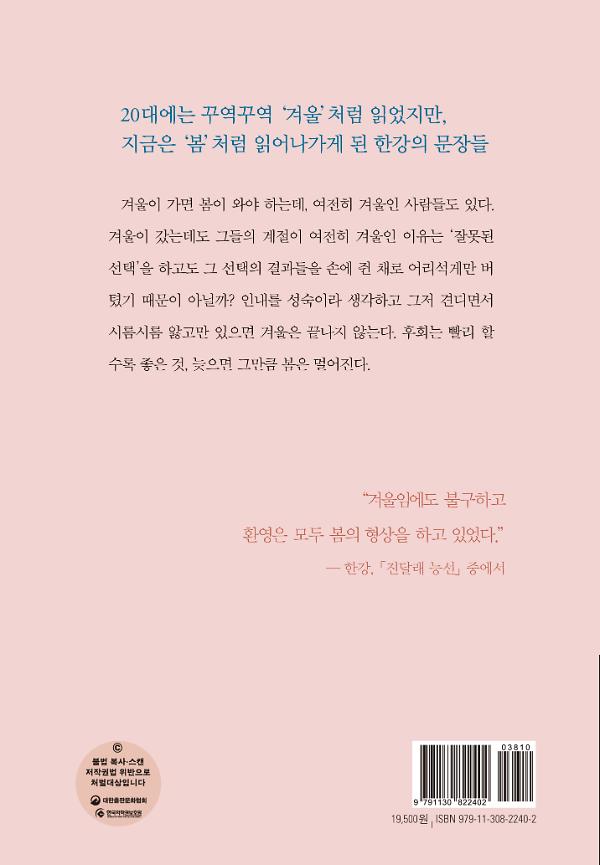겨울이 가면 봄이 와야 하는데, 여전히 겨울인 사람들도 있다. 『고흐 그림 여행』을 보면, 고흐는 파리에서 두 번 살 기회가 있었지만, 도회적인 인상파 화가들의 화풍을 흡수하지 않고 자신의 “농촌 지향적인 성향”(134쪽)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한다. 만약 고흐가 자신의 농촌 지향적 성향을 세련된 도회지와 비교하며 촌스럽다 느끼고, 이를 감출 목적으로 도회적인 인상파 화풍만을 따라하며 그 상태를 버티고 또 버텼다면? 누구나 좋아하는 지금의 고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고흐가 아니었을 것이다. 결국, 겨울이 가도 여전히 겨울인 이유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도 그 선택의 결과들을 손에 쥔 채로 어리석게만 버텼기 때문이 아닐까? 소설에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으니. “눈물로 세상을 버티려고 하지 마라.”(119쪽) 나는 내 선택의 정당성을 훼손하지 않으려 희생하고 헌신하는 가장이라는 미명하에 어리석게도 눈물로 버텨나간 꼴이었으니,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그날 새벽, 아내와 이야기한 후? 정신이 번쩍 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아내 덕분에 나는 겨울에는 견뎠고 봄에는 기쁘다. (17쪽)
수전 손택은 『해석에 반대한다』에서 “지금 중요한 것은 감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우리는 더 잘 보고, 더 잘 듣고, 더 잘 느끼는 법을 배워야 한다.”(34쪽)라고 말했다. 예전에 계절학기로 개설된 글쓰기 수업을 이공계열 학생 하나가 수강했다. 그때 항상 심드렁했던 그 학생 표정이 마음에 걸려 쉬는 시간에 조심스럽게 수업이 어떠냐고 물은 적이 있었다.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던 그 학생은 문학이라는 게, 또 감성이라는 게, 하나의 비현실적 환상 같다는 말로 나를 적잖게 당황시켰다. 자신은 당장 4학년이라서 취업을 해야 하는데, 이런 수업이 자신에게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고도 말했다. 그런데 그 학생의 대답을 들으면서 나는 역설적이게도 수전 손택의 지적, ‘감성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바로 그 주장이 생각났다. 구구절절한 말들이, 혹은 지나치게 풍부한 설명들이 오히려 뻔할 뻔자라는 확신을 만들고, 감성적 해석의 여지 자체를 줄여버리는구나. 다시 말해서 기억하고 소통할 가능성 자체를 배제해버리게 만드는구나. 여기서 중요한 건 감성이구나, 하고 말이다. (95쪽)
사실 나도 많이 궁금했다. 인선 어머니는 왜 그렇게 아픈 몸을 이끌고 제주와 육지를 오가며 전문가도 구하기도 힘든 자료들을 모았을까. 인선은 좋은 감독 커리어를 쌓고 있다가 혹평을 받을 줄 알면서도 세 번째 다큐멘터리에서 갑자기 제주 4·3사건을 왜 다뤘을까. 게다가 혼자 감당하기에 너무나 버거운 ‘작별하지 않는다’ 프로젝트를 왜 그렇게까지 손가락이 잘리면서까지 준비해야 했을까? 인선이 1948년 제주도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가지고 영화제에 참석했을 때,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아버지의 역사에 부치는 영상시”(236쪽)라는 부제가 붙었는데, 인선은 이 부제를 전면 부정한다. 이 영상이 아버지를 위한 게 아니라는 말이다. 경하는 다시 그 프로젝트를 언급하는 인선에게 자신이 꾼 악몽은 더 이상 광주와는 상관이 없다고, 자신에게 있었던 안 좋은 가정사가 꿈으로 나타난 거라며, 꿈의 의미가 바뀌었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그때 인선은 경하에게 이런 말을 한다. “……내가 있잖아.” 나는 이 대답을 보고 알게 되었다. 인선은 경하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 프로젝트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인선이 다큐멘터리를 만든 것도 아버지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걸. 인선 어머니가 아픈 다리를 이끌고 자료를 모으고 유족회 활동을 한 건 오빠 유골만을 찾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걸. 그건 모두에게 “……내가 있잖아.”라고 말하기 위해서라는 걸 말이다. (128~12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