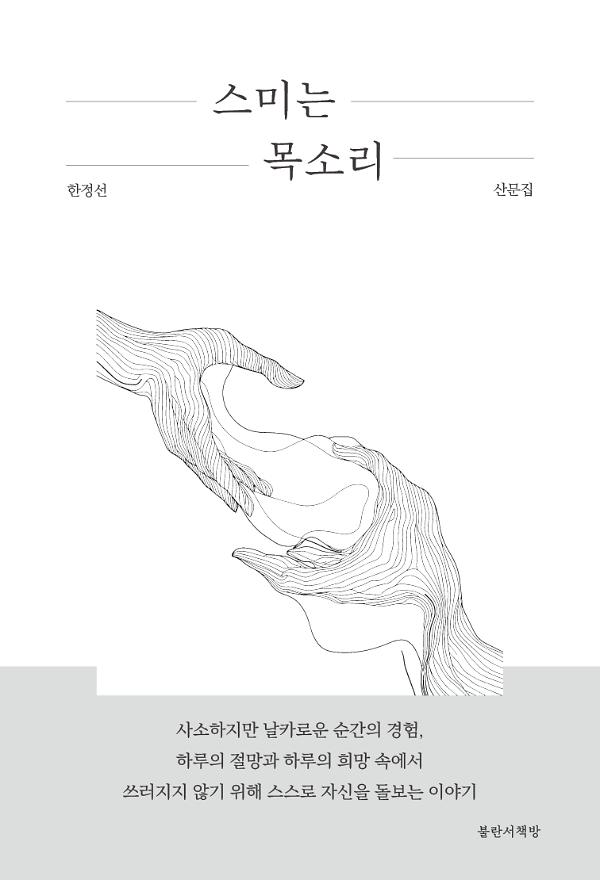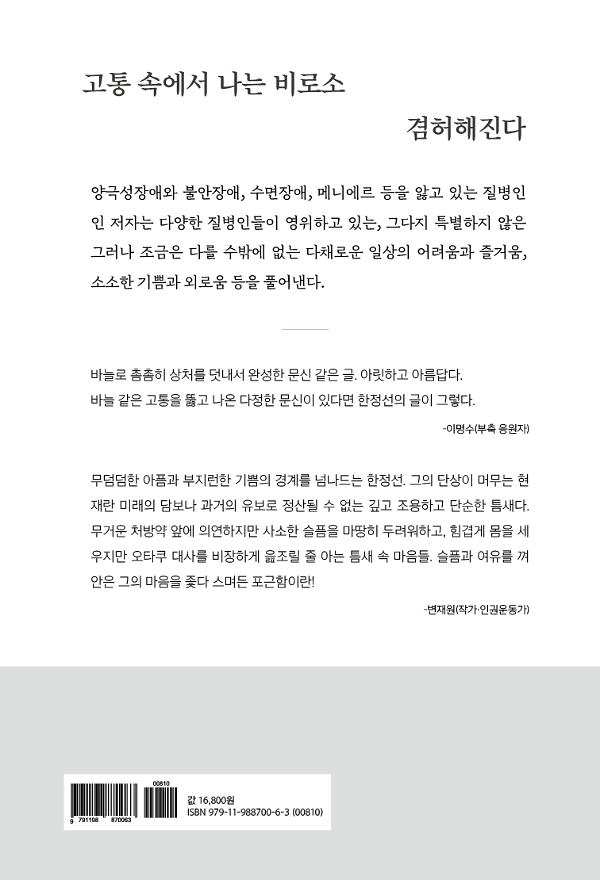무수히 아팠던 시절의 일기 같은 것이다. 청소년기 때부터 시작된 중증 우울증은 길고 긴 세월을 흘러 조울증으로 변이해 갔다. 여성혐오와 아동·청소년 혐오로 얼룩졌던 젊은 시절에 아주 큰 교통사고를 겪고 범불안장애가 자리 잡았다. 비둘기만 거리에 있어도 무서워서 피하느라 차도로 뛰어든 정신 나간, 사실은 공황 상태가 잦은 나날이었다. 불안장애는 공황을 몰고 왔다. 조울증은 수면장애와 짝이었다. 번아웃된 상태로 직장을 그만둔 이후 메니에르가 찾아왔다. 지독한 어지러움은 앉아 있든 누워 있든 제정신을 차리기 힘들었다. 이명과 구역감은 필수 옵션이었다. 이 모든 것들이 중첩돼 차츰 심신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던 시절, 살기 위해 글을 썼었다. 어떻게든 살아내기 위해서 어떻게든 존재하기 위해서, 쓰면서도 다 헛되고 무의미하다고 한숨짓다가도, 그래도 나는 나를 기록해야 한다는 알 수 없는 마음을 따라갔었다.
자신에게만 침잠하고 골몰하며 바라본 세상을 써내기도 했고 때로는 세상에서 수합되는 사건들을 살피고 고민하고 드러낸 내 이야기이기도 했다. 골몰하는 나도 관찰하는 나도 모두 세상과 내가 관통하는 순간에 이뤄진 고통과 기적의 순간이었다. 관통하는 것은 고통을 수반한다. 관통한 틈으로 캄캄한 어둠이 밀려 나오고 나면 비로소 거기에 빛이 스며든다. 바로 기적의 순간이 있다. 캄캄한 어둠이 반짝이는 그 틈을 헤집고 벌리고 바라본다. 이 책은 이런 기록을 담아내고 싶었다.
그러나, 그러나 지금은 여름의 나날이다. 무더워서 선풍기 아래로 기어들어 가야 하는 시간, 길거리 계단 어디든 앉아 맥주 한잔하며 친구와 이야기를 나눠도 좋을 시간, 이웃의 소음과 이웃의 냄새를 어쩔 수 없이 열린 창으로 공유하는 시간, 데운 물이 아니더라도 샤워가 가능한 시간, 무언가 활짝 벌려놓고 그대로 집도 문도 나도 하늘도 다 최대치로 열린 것 같은 시간이 시작됐다는 신호, 여름. 가난한 주머니를 뒤적여 맥주 한잔 들고 옥상에 올라가 별을 보다가 모기에게 물려서 긁느라 피가 나도 내 가난이 비참하진 않을 것 같은 날이다.
활자화된 것들이 다양한 형태를 띠고 다양한 음색을 띠고 율동적으로 유영한다. 모든 것은 건반이고 모든 것은 그사이를 헤엄치는 글자 물고기들 같다. 행복하게 팔딱이는 글자들. 나는 그 글자를 잡고 어루만져 내 하늘에 띄워 별자리를 만들고 무지개를 그려낸다. 세상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글자들이 반짝거리며 속삭인다.
바깥이 아니라 안에서 밝히는 빛이라 그림자가 드리우지 않기를, 때론 누군가의 안에서 캄캄하게 빛을 낼 사람이 있기를, 때론 부디 그러할 수 있기를 다시 기도한다.
빛이 때론 상처를 헤집고 목도하게 하고 베어내기도 하더라도. 그 자체로 자신을 직시하며 그 자체로 세상을 직시하며, 그저 살아낼 수 있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