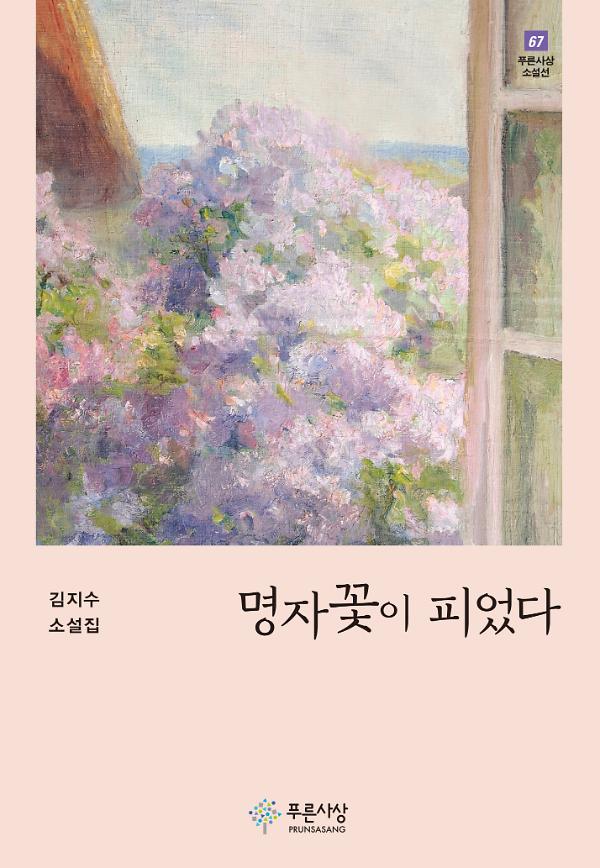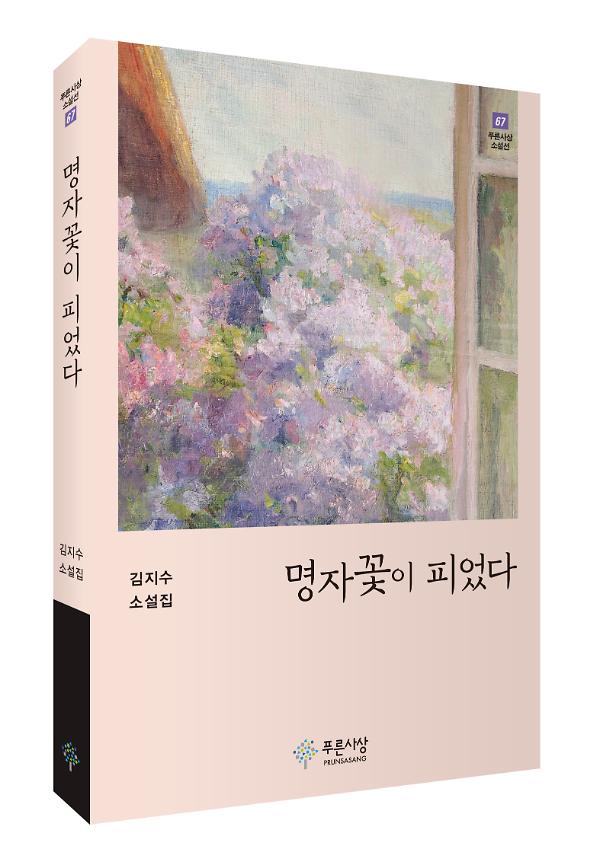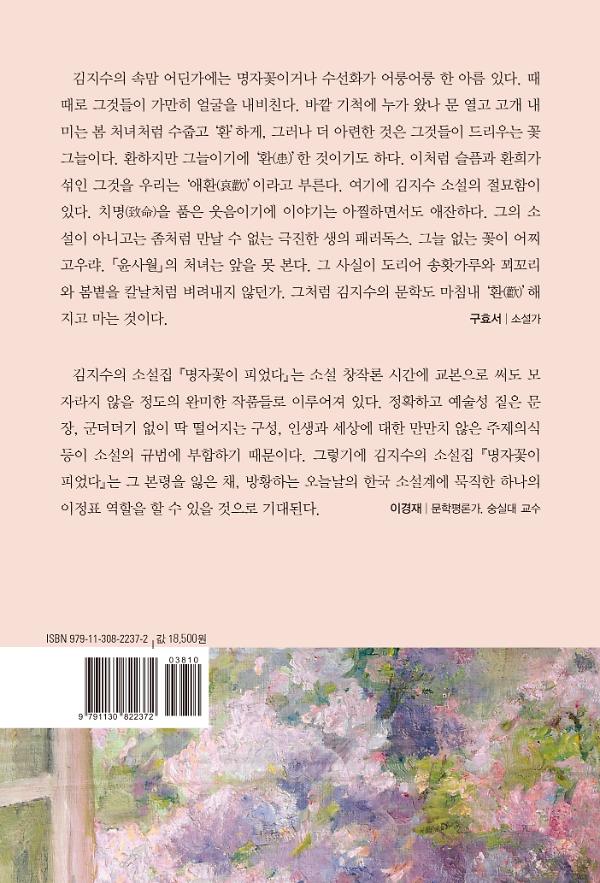작품 속으로
산 중턱에 접어든 혜민이 아득한 눈으로 길고 좁게 뻗어 있는 먼 길의 끄트머리를 바라보았다. 언젠가 맨발의 여자와 맞닥뜨린 지점이었다. 결연하게 제 갈 길을 가던 여자 대신 뿌연 안개 같고 아지랑이 같은 기운이 산모롱이에 흐릿하게 몰려 있는 것 같았다. 그것들은 다 무엇일까.
저기 온다. 저기 부르지도 찾지도 않았건만 많은 것들이 다양한 형태로 다가온다. 평탄하고 온순한 일상 사이로 불의하고 불친절하고 온당하지 못한 것들도 날을 세우고 몰려온다. 어떤 것이 헛것이고 어떤 것이 땅에 속한 것일까. 어쩌면 누구나 이 불명확한 천체의 한 부분에서 제각각의 명분으로 하염없이 유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맨발 걷기」, 33쪽)
마스크로 입을 가린 얼굴들은 어찌 보면 억지로 욕망이 차단된 상징처럼도 보였다. 먹고 마시고 뱉고 삼키고 웃고 떠들며 그 입을 열어 얼마나 많은 욕구 발산을 해댔던가. 하루아침에 조심스러워진 그 같은 행위가 이제 공공의 장소에서 억눌러지고 제재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았다. 어쩌면 이제 그만 입 닥치고 네 안의 소리를 들으며 내면을 탐구해보라는 계시이지는 않을까. 고통스럽게. 바짝 숨을 조이며. (「그 봄에도 새는 지저귀고」, 85쪽)
“서로 어려……웠을까. 난 그 사람들이…… 어렵……더라만.”
고모가 손바닥에 쏟아놓은 일용할 약들을 헤아리며 느릿느릿 말했다. 어렵지요. 어렵고말고요. 유효기간이 너무 오래 지난 냉장고 안의 식료품들을 바닥에 꺼내놓고 정리하던 명주가 고모의 말을 낮게 입속으로 받았다. 청소년기의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느꼈던 관계와 사회생활과 결혼생활에서 겪었던 관계의 얽히고설킨 난해함이 묵은 감정의 찌꺼기처럼 되살아났다. 그것들은 유효기간도 유통기한도 없이 목숨 줄이 다할 때까지 질기게 살아남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고모의 연배처럼 오래 살다 보면 누구나 어느 정도 삶의 의미를 곱씹는 철학자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명자꽃이 피었다」, 16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