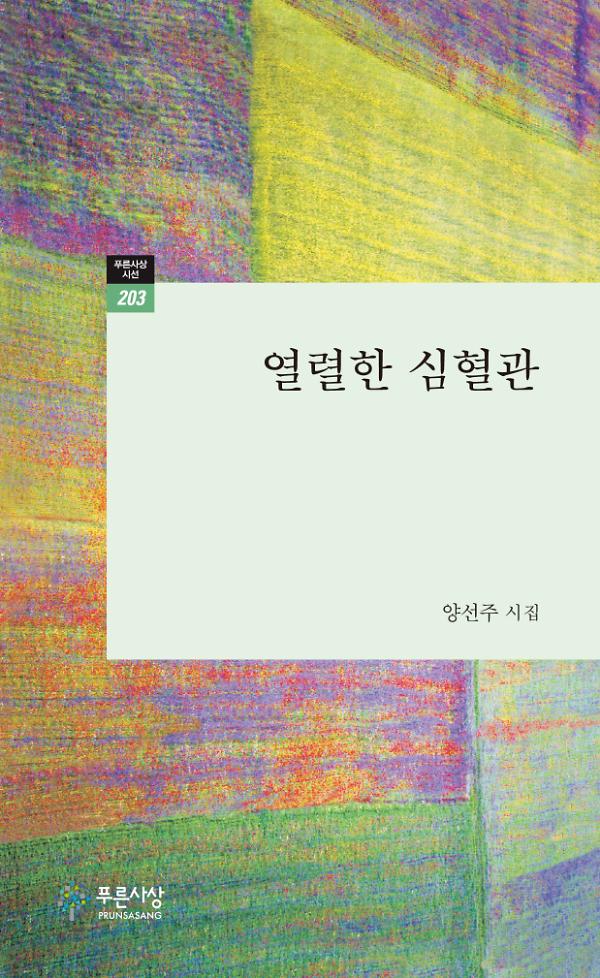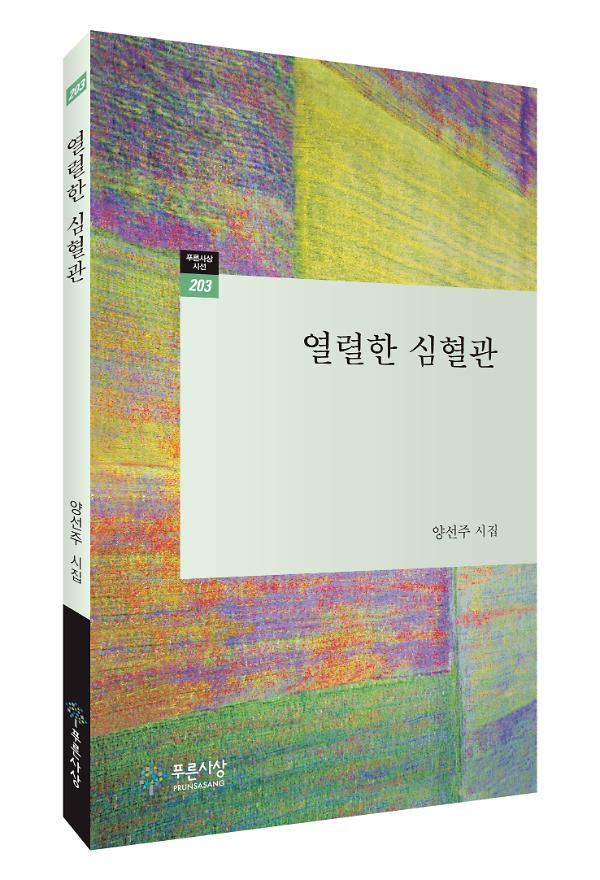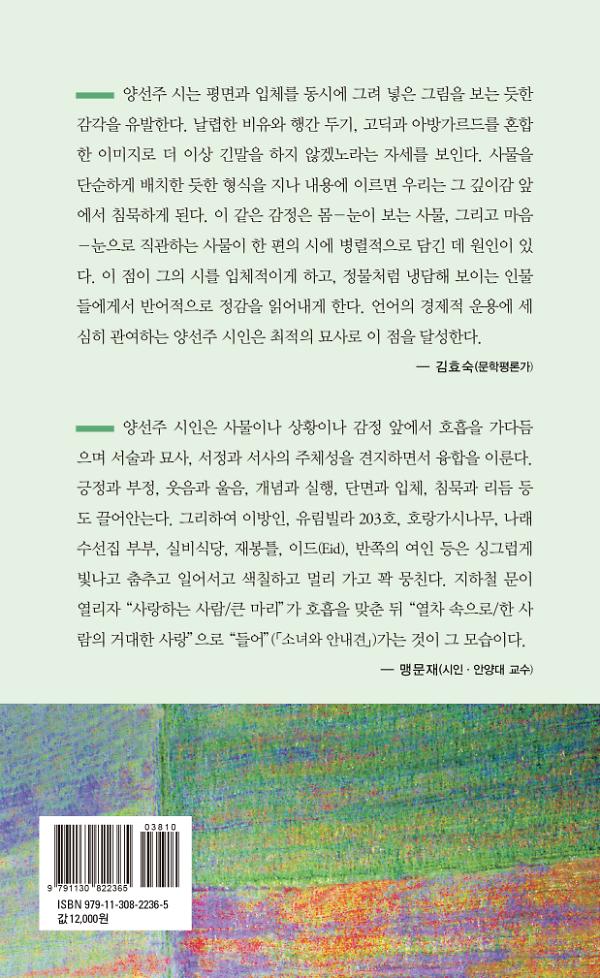작품 세계
양선주 시인은 자신과 부단히 대화를 나눈다. 지난 과거를 현재로 만들고, 미래마저 다가올 현재로 만들면서 오직 현재성을 발언하는 일의 가능성을 열어나간다. 남다른 모색과 새로운 언어 실험으로 자신이 시 쓰기의 주체라는 점을 알린다. 시인은 정물을 움직이게 하는 어떤 힘의 작용점을 『열렬한 심혈관』에 세심하게 담아낸다. 조용히 놓여 있는 정물, 정물 같은 사람들이 문득 깨어나 움직이는 순간을 써 나간다. 한 편 한 편 다면체 같은 면모를 지녔으면서, 한편에서는 신체의 눈으로 사물을 대하는 감각을, 다른 편에서는 마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는 감각을 발휘한다. 앞은 형상적 이미지를, 뒤는 이미지가 모호해지는 그 순간에 관념이 발생하는 시 언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특히 입체주의 미술품을 보는 듯한 시에서는 평면의 화폭에 담긴 대상이 전체상이 아니라 부분들의 난립처럼 보인다. 이때는 전체상이 모호해지기 때문에 부분들을 통하여 시인의 의도를 짚어낼 수 있다. (중략)
양선주 시는 평면과 입체를 동시에 그려 넣은 그림을 보는 듯한 감각을 유발한다. 날렵한 비유와 행간 두기, 고딕과 아방가르드를 혼합한 이미지로 더 이상 긴말을 하지 않겠노라는 자세를 보인다. 사물을 단순하게 배치한 듯한 형식을 지나 내용에 이르면 우리는 그 깊이감 앞에서 침묵하게 된다. 이 같은 감정은 몸-눈이 보는 사물, 그리고 마음-눈으로 직관하는 사물이 한 편의 시에 병렬적으로 담긴 데 원인이 있다. 이 점이 그의 시를 입체적이게 하고, 정물처럼 냉담해 보이는 인물들에게서 반어적으로 정감을 읽어내게 한다. 언어의 경제적 운용에 세심히 관여하는 양선주 시인은 최적의 묘사로 이 점을 달성한다. ― 김효숙(문학평론가) 해설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