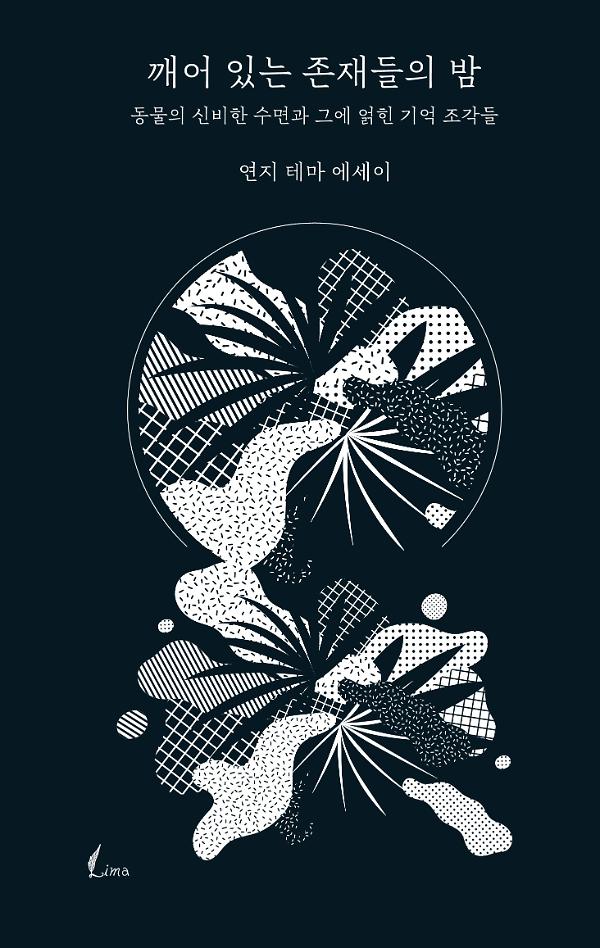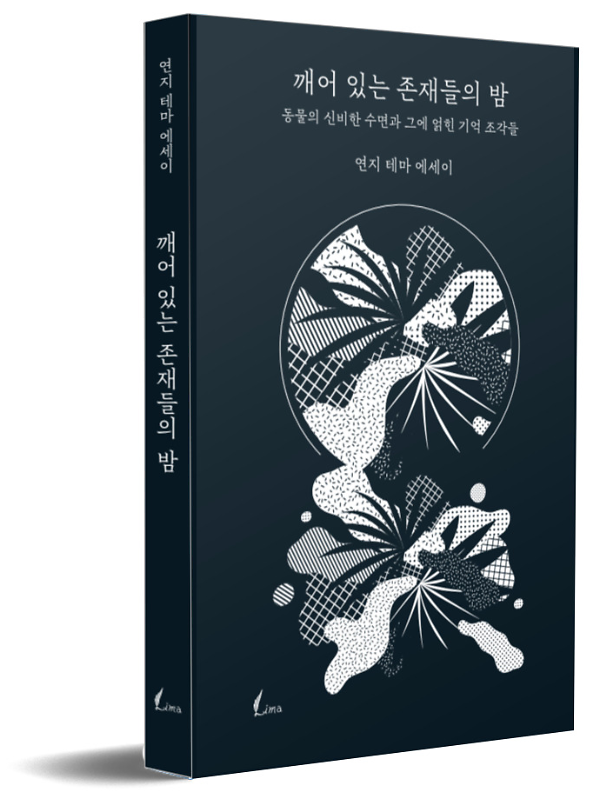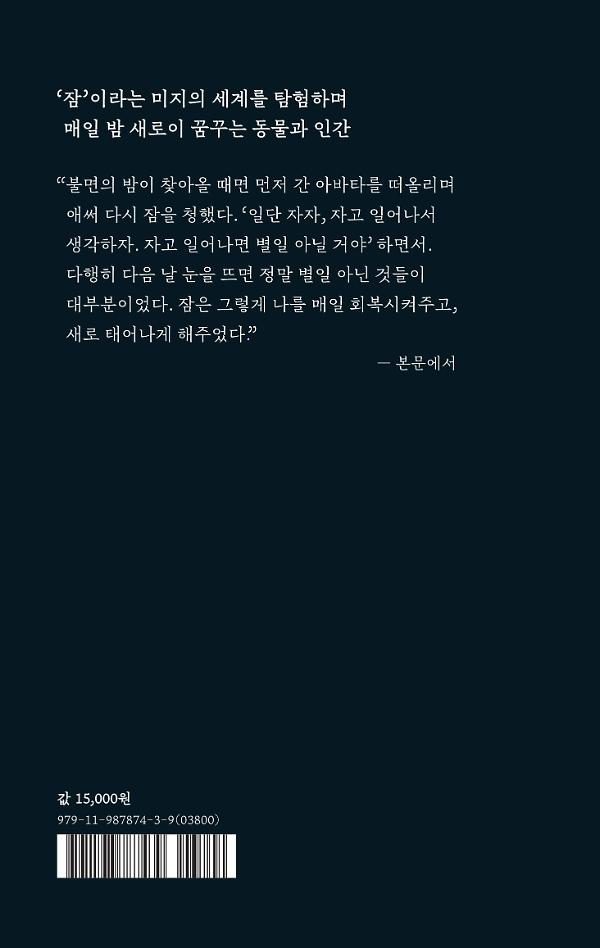뚱뚱한 고양이와 스칼렛 마카우를 떠올리며 애써 잠을 청하던 어느 밤, 문득 궁금했다. 이 친구들은 매일 잘 자고 있을까. 그런데 기린처럼 목이 긴 동물은 어떻게 잘까, 박쥐는 잘 때도 거꾸로 매달려 있으려나, 길리 섬에서 만났던 바다거북은 잠도 바닷속에서 자는 걸까, 다들 나처럼 꿈도 꿀까……. (5-6p)
처음엔 동물학자도, 과학 전문 저널리스트도 아닌 내가 동물의 수면에 대한 책을 써도 될까 망설여지기도 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다.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책이 아닌 그에 얽힌 개인적인 경험과 생각을 담은 에세이라면, 내 삶을 걸고 책임질 수 있는 이야기를 함께 담은 글이라면 독자들과 떳떳하게 만날 수 있지 않을까.’ (6p)
하지만 박쥐라고 다 똑같진 않다. 거꾸로 매달려 지내지 않는 박쥐만도 6종이나 있다. 그중 마다가스카르흡반발박쥐는 머리를 위로 향한 채 말려 있는 커다란 잎사귀 표면에 붙어 잔다. 이 박쥐 종은 발이 갈고리 모양이 아니라 빨판 모양이다. 덕분에 나뭇잎에 발을 착 들러붙일 수 있다. (33-34p)
사실 인간의 집단 수면 또한 사교적인 목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수면 혁명』의 저자 아리아나허핑턴은 함께 자는 행위, 즉 곁잠co-sleeping은 여러모로 “사교 활동이자 가족 간 결속을 다지는 수단”이 되어 왔다고 강조한다. 말하자면 친밀한 환경과 안정감을 제공해주는 행위인 것이다. (41p)
우리는 떡끈펭귄이 아닌 인간이다. 위버맨 수면법이나 에디슨의 쪽잠 실험을 무작정 따라했다간 괜히 건강만 버릴 수 있다. 잠을 제때 잘 못 자면 기억력도 감퇴하고 노화 속도도 빨라질 수 있다. 깨어 있는 동안 집중력도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 어디 그뿐인가. 단시간 수면은 면역체계를 악화시키며 비만과 당뇨병, 고혈압 같은 생활 습관병을 유발할 수 있다. 좋을 게 하나도 없다. (89p)
물론 여전히 잠은 종종 설쳤다. 어떤 날은 뭐든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처럼 꿈에 부풀었다가도, 어떤 날은 마냥 또 불안해지곤 했다. 불투명한 미래가 두렵기도 했다. 불면의 밤이 찾아올 때면 먼저 간 아바타를 떠올리며 애써 다시 잠을 청했다. ‘일단 자자, 자고 일어나서 생각하자. 자고 일어나면 별일 아닐 거야’ 하면서. 다행히 다음 날 눈을 뜨면 정말 별일 아닌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잠은 그렇게 나를 매일 회복시켜주고, 새로 태어나게 해주었다. (120p)
꿈은 감정과 기억, 상상력의 산물이다. 인간이 꿈을 꿀 때 일어나는 현상을 단순히 ‘수면 역학’을 넘어 ‘꿈’으로서 재해석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 꿈을 의식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동물도 꿈을 꾼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동물 또한 그런 존재임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물론 그들이 세계를 감각하고 표현하는 방식은 인간과 완전히 다를 수 있겠지만 말이다. (128-129p)
수면이라는 미지의 세계를 들여다볼 때면 신기하게도 깨어 있는 나머지 시간까지 낯설고 새롭게 보인다. 그나저나 나는 과연 매 순간 제대로 깨어 있는 것일까. 부디 그랬으면 좋겠다. (132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