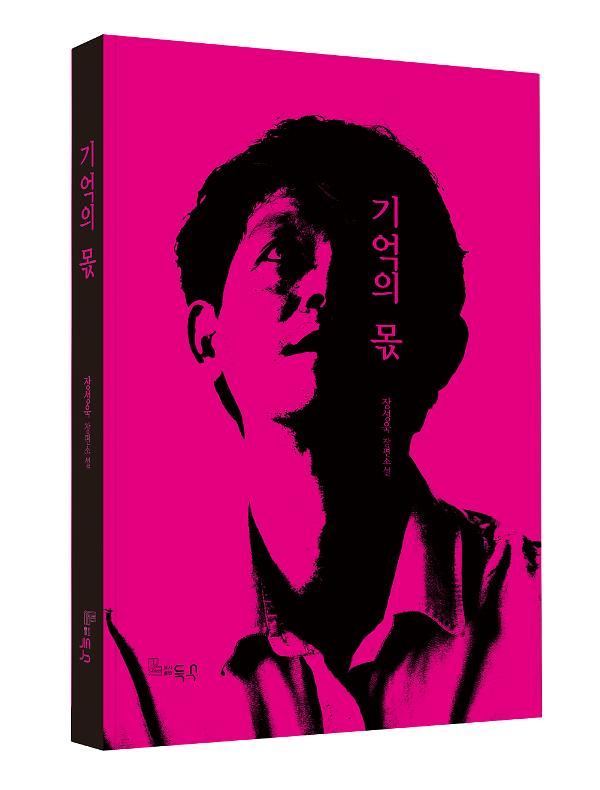후에 영빈은 이 장면에 대해 두고두고 생각하게 되지만, 분명한 건 그때 알았다고 해도 그 무엇도 바꿀 수 없었다는 사실이었다. 바꾸기 위해서는 더 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만 했고, 그런 일은 가능하지 않았다.
------------13쪽
교수가 잘리고 말고는 중요치 않았다. 영빈의 입장에서는 구설수가 있는 사람이 결혼식에서 주례를 본다는 사실 자체가 불쾌한 일이었다. 더 큰 문제는 아무 흠결도 없어야 할 계획이 자꾸만 통제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복잡해 보이는 문제일수록 단순하게 생각하고 움직여야 했다.
------------37쪽
중학교 시절 기남은 박선용과 마찬가지로 왕따였다.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도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알 수 없었다. 처음에 그들은 친구처럼 다가왔다. 수학 숙제를 보여 달라고 해서 보여주었고, 핸드폰을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줬다. 그다음에는 나중에 갚겠다며 미술 시간에 필요한 준비물을 사다 달라고 말하고, 얼마 되지 않는 액수의 돈을 빌려 가기도 했다. 모두 부탁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 때마다 친구라면 이 정도는 별일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속였다. 그 과정 속에는 어떤 물리적인 폭력도 없었다.
------------43쪽
넋두리가 계속되었고 그럴수록 현정은 이상하리만치 냉정해져 갔다. 급기야 노파가 손등으로 눈물을 찍어내기 시작했다. 노파에게 들고 있던 손수건을 건넸다. 그녀는 사건의 본질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저 학교의 선생이나 텔레비전에서나 보던 현정 같은 사람들을 이곳까지 찾아오게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 송구한 일인 듯했다. 그런 오해를 굳이 나서서 바로잡을 필요는 없었다. 어차피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할 게 뻔했다. 저런 사람이 보호자라니 선용이라는 애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모든 사람은 뿌린 만큼 거둔다고 생각하는 현정이 누군가를 안쓰럽다고 여기는 건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90쪽
“내가 이 담뱃불을 네 팔에 갖다 댈 거야. 소리를 내면 네가 지는 거고, 소리를 내지 않으면 내 패배야. 간단하지?”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온다. 내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때는 이게 어쩌면 기회라고 생각했다. 증거를 남길 수 있는 기회.
------------126쪽
너를 본다. 너의 두 다리는 철제 의자 다리에 묶여 있고 양손에 수갑이 하나씩 채워져 등받이 기둥에 결박되어 있다. 건물 아래서부터 업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까지 이동해 창고에 마련된 의자에 몸이 묶이는 순간까지도 너는 한 번도 깨어나지 않았다. 무척이나 피곤했던 모양이지. 그럼에도 너의 얼굴에서는 잠든 사람에게 쉽게 볼 수 있는 방심을 찾을 수 없다. 입을 벌린 채 침을 흘리거나, 눈이 반쯤 뜨여 있거나 혹은 그 흔한 잠꼬대나 코골이조차. 공들여 깎은 조각상처럼 무첫이나 평온하고, 아름답다. 보고 있기만 해도 어디선가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들려올 듯한 모습이다. 나는 그게 가장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토록 아름다운 네가 무엇이 부족해서 나한테 그런 짓을 했을까.
------------200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