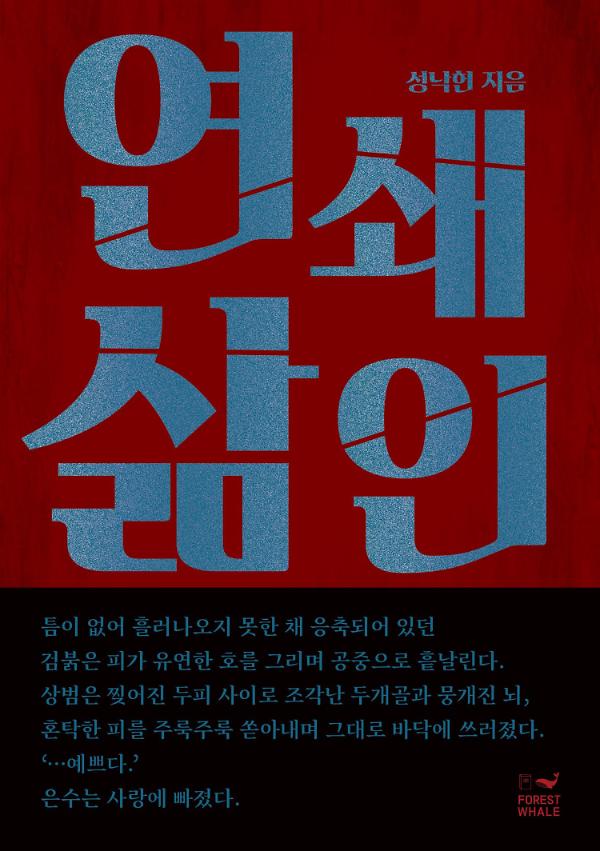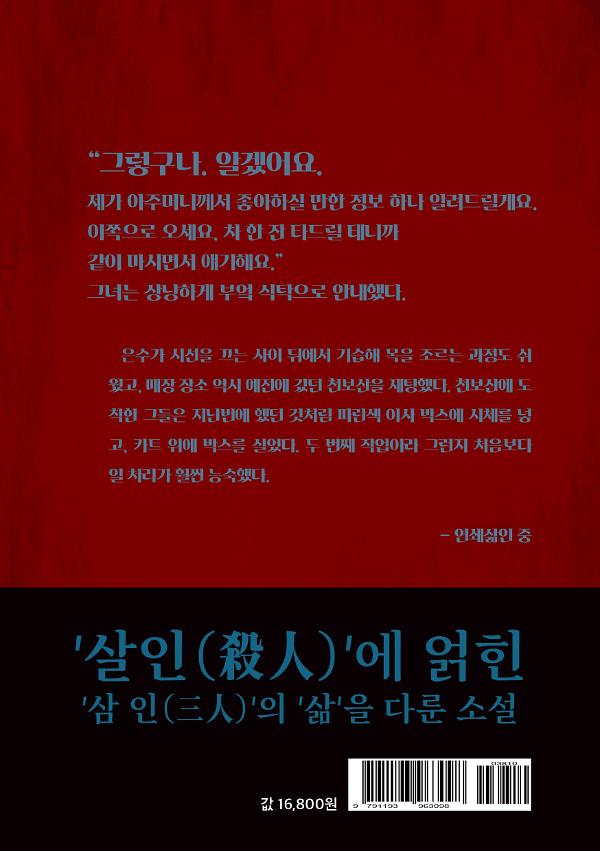오후 2시. 죽기로 다짐한 날. 진호는 침대에 누운 채 방금 꿨던 꿈을 떠올리려 애쓰고 있다. 굉장히 행복한 꿈이었는데,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
‘모르겠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느릿한 발걸음으로 방에서 나왔다. 화창한 햇빛이 텅 빈 거실을 비춘다. 그는 닫혀있는 안방 문을 쓱 쳐다본 뒤 화장실로 들어갔다.
쏴아아, 세면대에 차가운 물이 쏟아진다. 얼굴을 대충 헹구고 거울 속 자신과 눈을 맞춘다. 푸석해진 머리, 검게 드리운 눈 그늘, 하얗게 일어난 각질까지. 아직 죽지는 않았지만, 이것도 산 사람의 모습은 아니다. 몸에 생기가 빠진 걸 알았는지 화장실의 냉기가 앞다투어 뼛속까지 스며든다.
- 김진호 중 -
은수는 허탈했다. 내가 왜 이런 가시밭길을 걷고 있었는가. 그녀는 즐기기 위해 살아왔다. 공부를 열심히 한 것도, 돈을 벌기로 한 것도, 간호사가 된 것도 모두 인생을 즐기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전혀 즐겁지 않다. 여기서 평생 월급을 빌어먹으며 살아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제야 은수는 깨달았다. 이번 생은 이미 망했구나.
“죽자.”
은수의 입에서 미소가 실실 흘러나온다. 모든 것을 포기하자 마음이 편해졌다.
그때, 병원 출입문에 달아둔 자그마한 종이 딸랑거리며 울렸다.
- 서은수 중 -
경찰에 합격하고, 형사가 되었다. 조금은 풀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길준은 절대로 쉬지 않았다. 학창 시절 쉬는 시간에도 연필을 놓지 않던 그다. 휴식이란 개념은 버린 지 오래였다. 그래야만 했다. 어머니께 죄송하게도, 기억나는 게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말투도, 나이도, 심지어는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다. 아무리 기억을 되살리려 애써 봐도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 속 어머니는 베일을 덮은 듯 이목구비가 흐릿하다. 길준이 유일하게 기억하는 단서는 ‘전세영’ 세 글자. 어머니의 이름이다.
이름 세 글자와 영락보린원 근방이라는 두루뭉술한 지역 증거. 희미하고 아득한 단서다. 하지만 길준은 포기하지 않고 조사를 계속했다. 그러자 조금씩, 많은 것이 드러났다.
- 유길준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