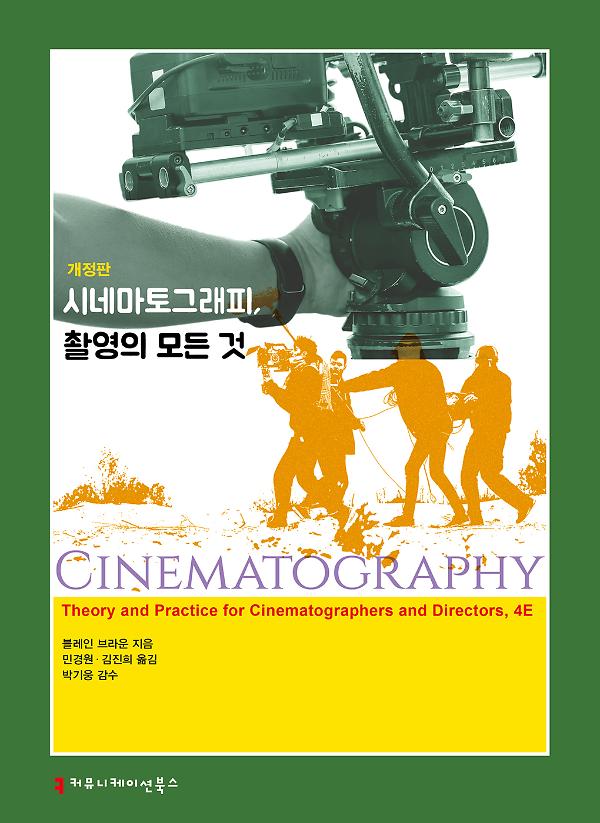위에서 설명한 기본적인 요소를 어떻게 조합하고 배치하는지에 따라, 프레임에서 무엇부터 인식할 것인지가 결정된다. 이러한 시각적 체계는 프레임의 구성을 논리적으로 만들어서 눈과 뇌가 정보를 종합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관객이 프레임 전체를 ‘한 번에 보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숏을 ‘읽으려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관객의 시선을 잘 안내해야 한다. 눈과 뇌의 장면 해석을 돕는 시각적 요소를 살펴보도록 하자.
02_“프레임” 중에서
영화는 한 장면씩 만들어지고, 장면은 한 숏씩 만들어진다. 제작 규모가 아무리 크고 복잡한 작품이라 할지라도 항상 한 번에 한 숏을 촬영한다. 숏의 궁극적인 목표는 다른 숏들과 잘 어우러져 최종적인 장면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매 숏을 찍을 때마다 이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연속성은 영화를 만들 때 항상 의식하고 있어야 하는 중요한 개념이다. 실수로 연속성을 놓치면, 몇 시간 동안 작업한 촬영본이 쓸모없게 되거나 편집할 때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렇다면 연속성은 무엇인가? 기본적으로는 영화가 현실감 있게 보이는 데에 필요한 이야기, 대사, 이미지의 논리적 일관성을 말한다.
04_“연속성” 중에서
컷어웨이는 촬영 중인 주요 등장인물은 아니면서 장면과 연관되는 사물이나 사람을 담은 숏이다(그림 5.13). 컷어웨이는 그때까지 장면에서, 심지어 마스터 숏이나 와이드 숏에서도 관객이 보지 않았던 내용이다. 창밖의 풍경이나 마루에서 잠든 고양이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컷어웨이가 어떤 행위를 강조하거나 장면의 정보를 더할 수도 있고, 등장인물이 바라보거나 가리키는 대상일 수도 있다. 전혀 다른 공간이나 장면과 무관한 내용을 담았다면 컷어웨이가 아니라 다른 장면이다. 컷어웨이는 편집 감독의 안전장치가 된다. 편집 과정에서 난관에 부딪혔을 때 컷어웨이로 연결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경험상 모든 장면에서 컷어웨이를 촬영해 두는 것이 좋다. 시나리오에 나오지 않고 장면에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라도 괜찮다. 편집 과정에서 컷어웨이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05_“촬영 기법” 중에서
원본 네거티브를 복원해 출시한 영화들에 대해서 들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Gone with the Wind)〉(1939), 〈아라비아의로렌스〉 등 여러 고전 영화가 훌륭하게 복원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긴다. 새로운 세대인 컬러리스트가 새로운 프린트를 만들때, 그 영화를 촬영한 촬영 감독의 예술적 의도를 제대로 살려 작업했을까? 그 촬영 감독은 (감독, 미술 감독과 협업하며) 이미지를 만드는 업무를 맡도록 고용되었던 전문가가 아닌가! 사실 그 점을 확인할 수 없지만, 이러한 복원 작업을 진행하는 사람들은 원래 제작진들의 예술적 의도를 보전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06_“카메라” 중에서
ARIB/SMPTE HD/UHD 컬러 바도 모양은 비슷하지만 순수 블랙이 0 바로 위와 아래에 추가된다. HD/UHD 컬러 바에서는 수치가 퍼센트를 뜻한다. 플러지는 모니터의 블랙을 적절하게 설정하는 데에 필수다. ‘블랙’ 부분만 맞춰서 모니터 조정을 해 블랙을 재현했다고 하자. 이때 블랙에 정확히 맞췄는지, 과해서 순수한 블랙보다 더 어두운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 모니터에서도 블랙은 블랙일 뿐이다. 플러지는 아주 약간 밝은 블랙을 보여 줘서 사용자가 ‘과한 블랙’을 설정하지 않게 한다. 블랙을 과하게 설정하면 어두운 영역뿐만 아니라 이미지의 나머지 부분인 미드톤과 하이라이트에도 영향을 미친다.
07_“디지털 측정” 중에서
영화 제작에서 사용하는 모든 LED 조명 장치는 여러 개의 발광 다이오드로 만들어진다. 그러나 제조 공정의 변화 때문에 LED의 색상과 출력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LED 제조사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비닝binꠓning을 사용해 왔다. LED는 테스트를 거쳐, 발생하는 빛의 특성에 따라 여러 그룹, 다시 말해 여러 빈bin 중 하나로 분류된다. LED 조명의 단가가 높은 이유 중 하나가 이때 탈락되는 불량품이 많기 때문이다. 비닝이 필요 없도록 일부 제조업체는 리모트포스퍼 기술을 고안했다. 기존의 백색 LED는 백색광 출력의 통합 장치를 제공한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밝은 점광원 여러 개가 동작하기 때문에 넒은 발광 표면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앞서 언급한 빛의 균일성에 문제가 있다.
12_“광원” 중에서
조명의 절대적인 규칙 중 하나는 모든 실용 조명은 반드시 디머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은 일반적인 벽 디머로 만들어진 소형 휴대용 디머인 핸드 스퀴저일 것이다. 대부분의 조명에서는 스크림, 그립 네
트, ND 젤, 조명 자체 조절 기능 등을 통해 강도를 조절할 수 있다. 실용램프에서는 이러한 조절 방법이 없으므로, 밝기를 조절하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은 디머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램프들이 프레임에 보인다는 점에서 정확하게 제어할 수 있는 핸드 스퀴저가 필수적이다.
13_“조명” 중에서
창문(과 유리문)은 딜레마를 일으키는데, 외부는 거의 내부보다 훨씬 더 강렬하다. 배우가 창문에 기대어 포즈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실내조명을 야외에 맞추려고 높일 수 있지만, 이러한 시도는 결코 실용적이지 않다. 그림 14.14, 14.15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데, 감독을 잘 설득해 배우 디렉션을 바꾸고 창문 조명이 배우를 비추도록 하면 된다.
14_“조명 세팅” 중에서
모래주머니는 영화 제작에 반드시 필요하다. 조명 스탠드, C-스탠드, 그리고 하이보이 스탠드 등을 안전하게 고정하는 데에 주로 사용되고, 열린 문을 잡아 두는 것에서부터 배우가 의자에 더 높이 앉을 수 있게 하는 것까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모래주머니는 그냥 모래가 아닌 고양이 모래로 채워져 있다. 모래주머니는 다양한 크기로 구성되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25파운드(11.3kg)고 15파운드(6.8kg) 와 5파운드(2.3kg) 모래주머니도 사용된다. 숏백shotbag은 더 작지만 납으로 채워져 있어 무게가 25파운드다. 숏백은 25파운드 모래주머니를 사용할 수 없는 곳에서 쓸모가 있다.
15_“그립” 중에서
초점은 영화 제작에서 많이 오해받고 있다. ‘초점’이란 무엇일까? 이론적으로는 초점이 맞는다는 것은 영화 영상에서 실제 물체가 ‘실생활에서처럼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의 눈은 모든 것을 초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것은 눈과 뇌의 상호 작용의 결과다. 사람의 눈이 볼 수 있는 화각은 상당히 넓지만 광학적으로 눈은 f/2에 해당한다. 우리 눈은 ‘광각’ 렌즈로 간주되기 때문에 실제로 세상의 많은 부분이 초점이 맞는다. 하지만 초점은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계속 변한다. 다만 인식하지 못할 뿐이다. 눈의 수정체를 조절하는 근육이 수정체의 형태를 변형시킴으로써 초점이 바뀐다.
17_“광학과 포커스” 중에서
일반적으로 촬영 감독은 입사식 노출계와 스폿 노출계, 이렇게 두 개의 노출계를 지니고 있다. 세코닉Sekonic 노출계(그림 18.2)는 이 두 가지 기능을 결합한 제품이지만, 촬영 현장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노출계가 사용된다. 색온도계도 유용하지만 일반적으로 항상 휴대하지는 않는다. 애덤윌트가 개발한 앱인 시네 미터 IICine Meter II(8장 “노출”의 그림 8.37, 8.38)는 실제로 세 가지 기능을 모두 수행하며, 입사 노출 측정을 위한 럭시돔Luxi dome이 추가로 구성되어 있다.
18_“촬영 현장” 중에서
촬영 현장의 데이터 관리에 적합하도록 비디오/오디오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백업하는 데에 특화된 여러 소프트웨어가 있다. 때로는 파일을 변환할 수도 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는 순환중복검사CRC와 같은 안전 기능을 제공한다. CRC는 RAW 데이터의 우발적인 변경을 식별하는 오류감지 코드다. 이러한 검사를 위한 다양한 선택 사항도 제공한다. 대개 롤명을 기입할 수 있고, 다운로드를 할 때마다 뒤에 자동으로 오름차순 숫자를 생성한다.
19_“DIT와 워크플로”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