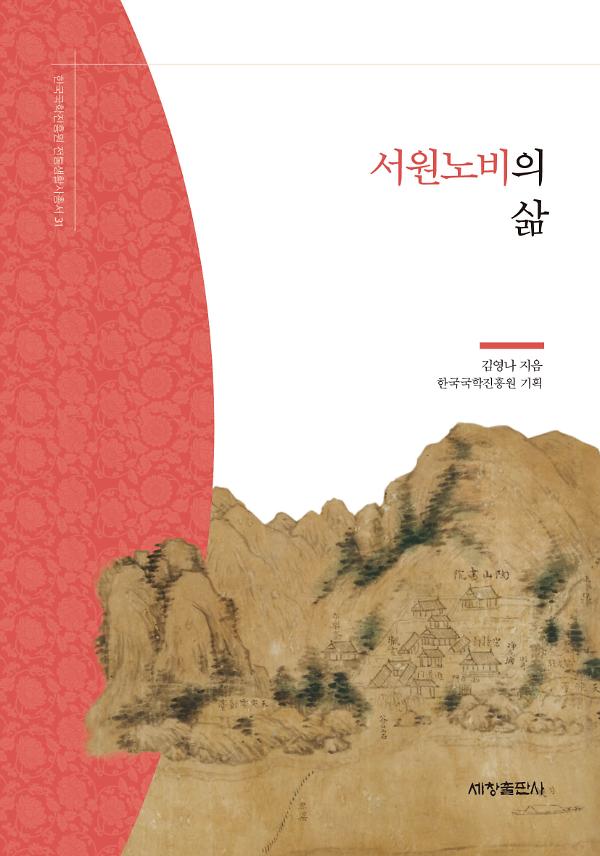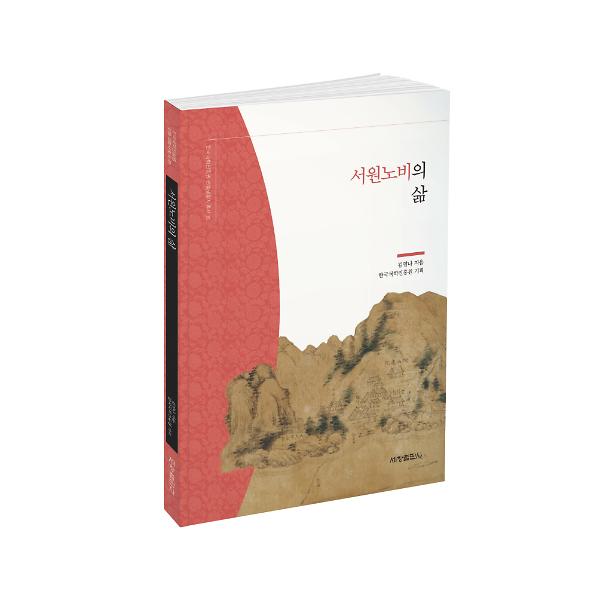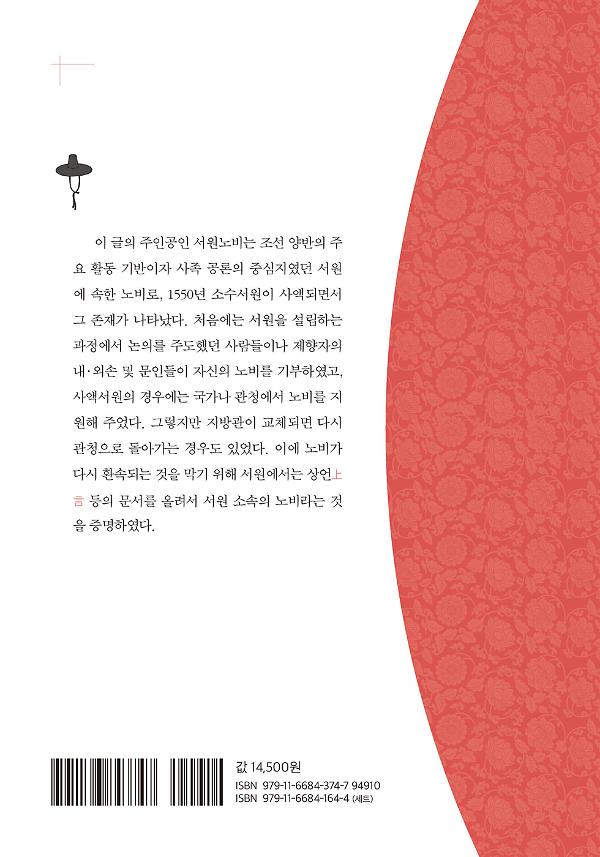조선의 신분제는 양인과 천인으로 구성된 양천제(良賤制)였다. 신분에 따라 하는 일이 다르고, 생활 방식에도 차이가 있었다. 신분상으로 양인이면서 사회 통념적으로 가장 높은 계층인 양반(兩班)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면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의 가장 최하층인 천인 중 노비에 대해서는 단지 국가나 양반에 예속되어 있는 존재이자 차별받고 천대받는 존재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지만 국가와 양반에게는 노비가 반드시 필요하였다.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 포로나 죄인이 노비가 되었으나, 대를 이어서 세습되었고, 하나의 신분으로 자리 잡았다.
_9쪽
이처럼 각 서원의 노비 수를 살펴본 결과, 대체로 17세기보다 18세기에 증가하였고, 심지어 수백 명이 있는 서원들도 있었다. 18세기에 서원노비가 증가한 원인은 국가나 다른 기관 소속 노비들이 서원에 소속되었거나 서원에서 노비를 샀기 때문일 수도 있다. 또한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서원노비는 혼인으로 태어난 자녀를 통해서도 늘어났다. 18세기에 가장 많은 노비가 있었다가 19세기를 지나면서 줄어들었는데, 서원에 따라 줄어드는 시기가 조금씩 달랐다. 19세기에 서원의 노비 수가 줄어든 요인은 법적으로는 1801년의 공노비 해방 및 노비의 신분 상승, 노비제의 변화와 연관이 있고, 지역적으로는 서원의 영향력이 차츰 약해졌기 때문이다.
_26쪽
서원노비의 경우, 서원에 사는 노비는 거의 없었고, 서원 바로 옆에 있는 서원촌인 ‘원저(院底)’에 사는 경우가 많았다. 여기에 거주하면 국가에 대한 의무인 각종 잡역과 환곡 등을 면제받는 대신에 서원에 경제적인 부담을 져야 했다. 원저에 사는 노비들은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서원 안의 각종 일을 하였고, 서원 근처에 있는 서원 소유의 땅이나 자신의 땅에서 농사를 짓고 수확물 중 일부를 서원에 납부하였다. 또한 원저 이외의 지역에 사는 노비들도 많았다.
_32쪽
정리하면 서원노비의 신공을 면제해 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다. 이 중 속량은 반드시 서원에 대가를 지불해야 하였고, 단순히 나이가 많아서 신역이나 신공이 제외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서원에 무엇인가를 바쳐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서원에 서는 서원노비에게 신공을 거두는 것이 점차 어려워지면서 이들의 가족이나 친척을 차지로 사용하여 신공 대상자들의 신공을 거두었고, 신공량을 채우지 못하면 차지 역시 공동 책임을 지게 하였다. 또한 속량이나 제공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서원에 손해가 되지 않게 하였다.
_89쪽
서원노비의 가계는 사노비보다 연속적으로 나타났다. 서원노비는 상속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인이 바뀌어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 가거나 가족끼리 흩어지는 경우가 적었기 때문이다. 또한 서원노비는 가족별로 파악되었다. 속량이나 매매를 할 때에도 가족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신역이나 신공은 개별적으로 담당하였지만 차지나 시정을 통해 가족들이 공통적으로 의무를 지기도 하였다. 한 가족이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도 많았다. 혼인 또한 부모의 혼인 상대에 따라 자녀의 혼인 상대가 결정되는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가계가 다른 공·사노비보다 많았다.
_162-16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