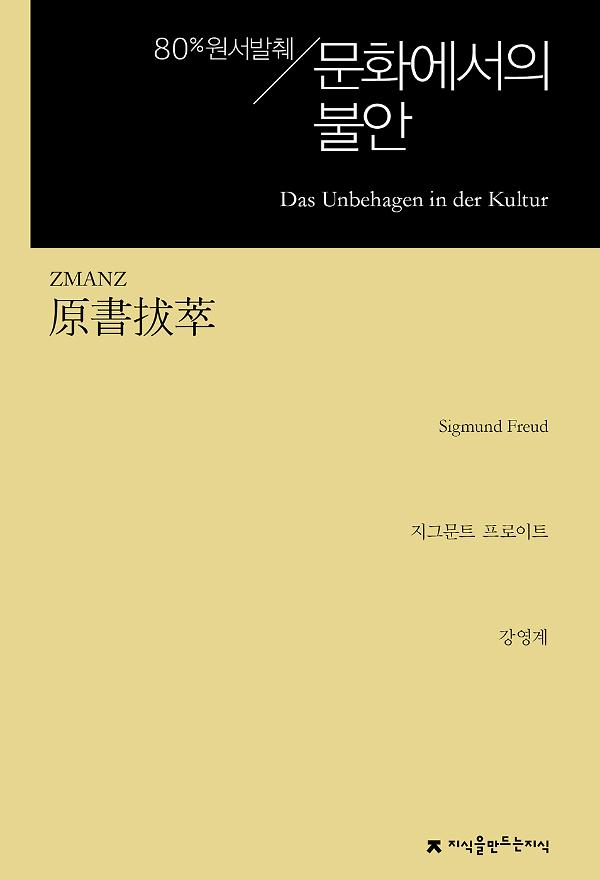1914년부터 1918년까지 계속된 제1차 세계대전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1920년부터 상상할 수 없는 인플레가 유럽 전체를 휩쓸었으며 경제공황이 밀려왔고 사람들이 기다릴 수 있는 것은 가난, 죽음의 불안, 그리고 암흑뿐이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비탄, 마음의 고통, 무의식적 증오심과 적개심 등으로 신음했다. 이때부터 프로이트는 여전히 종래의 개인심리학을 바탕으로 삼고 있으면서도 사회학적 주제들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프로이트 이후의 정신분석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전체가 개인심리학에 치우쳐 있다고 비난하지만,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은 확실히 사회심리학 쪽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프로이트는 학대증(Sadismus)과 피학대증(Masochismus)의 원천을 리비도라고 보았으며, 말기로 갈수록 이러한 리비도의 영역 역시 확대된다. 말기의 프로이트는 리비도를 에로스(삶의 충동)와 타나토스(죽음의 충동)로 구분한다.
≪문화에서의 불안≫은 충동의 욕구와 문화의 제약 사이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갈등 관계를 다루고 있다. 원래 프로이트는 이 책의 제목을 ≪문화에서의 불행(Das Unglück in der Kultur)≫이라고 붙였지만, 출판할 당시에는 불행을 ‘쾌적하지 못함(Unbehagen)’으로 바꾸었다. 다양한 문화 현상의 내면을 통찰할 경우 우리는 충동의 욕구와 이성적 자아의 억압을 수없이 발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관계에서 크고 작은 갈등이 생긴다. 이러한 갈등은 ‘쾌적하지 못함’의 정서를 유발한다. 특히 자아의 억압이 현대 문화에서 강할수록 ‘쾌적하지 못함’은 커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문화에서의 불안≫을 통해서 프로이트가 정신분석학적으로 문화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충동적 욕구와 자아의 억압 간의 갈등을 어떻게 해명하는지, 그리고 문화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쾌적하지 못함이 어떤 것이며, 그것들을 과연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고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