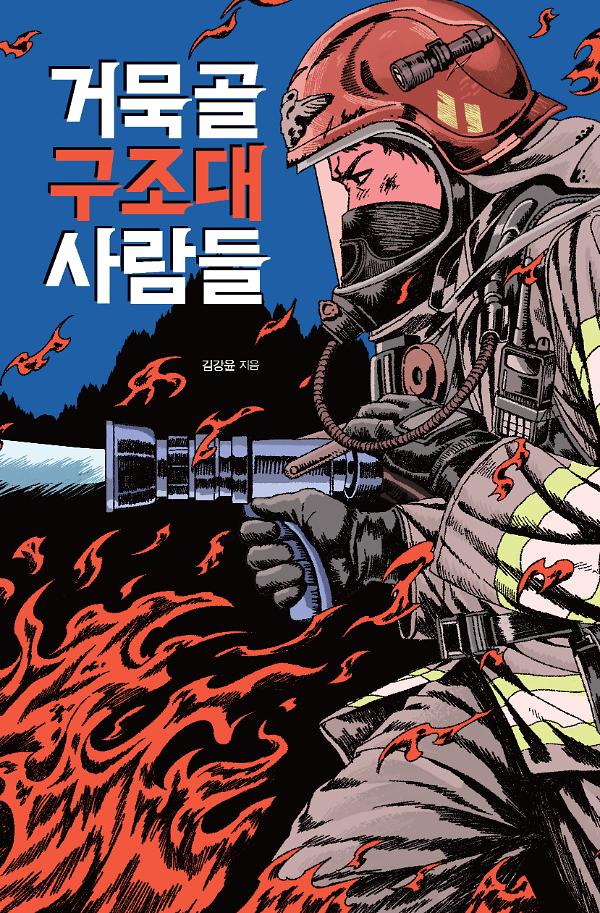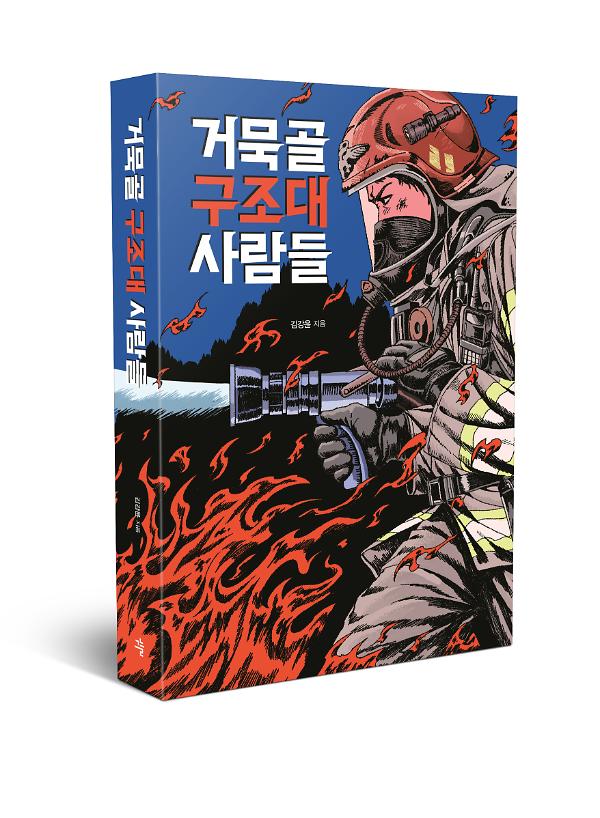“어, 어, 어.” 순간이었다. 도랑 옆 논두렁 가장자리에 있는 작은 볏짚단에서 허연 연기가 뭉게구름처럼 올라오고 있었다. 태우는 눈을 크게 뜨고 입만 벌린 채 바라만 보고 있었다. 심장이 벌렁거리며 미친 듯이 뛴다는 것을 알았을 땐 이미 늦었다. 볏짚단에 숨어 있을 누나를 구해야만 했다. 그러는 사이 허연 연기는 곧 벌건 화염이 되어 이미 짚단 전체를 무섭게 삼키고 있었다. 오래 지나지 않아 화염은 맹렬하게 솟아올랐다. 어느새 나타난 영찬이와 정수까지 아이들은 놀란 눈만 커다랗게 뜨고 바라보고 있었고, 항식이는 꽥꽥 소리를 지르며 불난 볏짚 주위에서 미친 듯이 날뛰고 있었다.
-12쪽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자원해서 들어온 해군 특수 부대는 태우에게 가혹한 팔자를 한 번에 뒤바뀌게 할 수 있는 수도(修道)와도 같은 일이었다. 더 고통스럽고 더 괴로워야 누나를 죽인 자신의 죄가 씻겨 나갈 수 있다고 여겼다. 학대하던 아비에게 강한 모습을 보여 주고 싶었다. 그래서 물러서지 않았다. 훈련을 할 때면 가장 앞에서 뛰었고 목이 찢어져라 소리를 질렀다. 물속에서 숨 참기 훈련 때는 혼자서 4분이 넘는 시간을 버텼다. 이때부터 교관들과 동기들이 그를 독종으로 여기게 되었다. 까맣고 비쩍 마른 몸이었지만 독기 어린 눈이 태우의 성정을 보여 줬다.
-37쪽
미리 한국의 언질을 받았음에도 태우는 또다시 치밀어 오르는 화를 억지로 눌러야 했다. 발령 공문을 보자마자 아침 조회에서 대장은 태우의 인사이동 소식을 전 직원이 보는 앞에서 전했고 짧게는 2년, 길게는 7~8년을 함께 근무했던 특수 구조대원들은 대장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먼 산만 바라봤다. 그때 태우는 솟아오르는 모욕감을 겨우겨우 참고 있었다. 이곳에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나들며 일했다. 목숨 바쳐 일했고 인정받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지난 10년이 이렇게 끝난다는 생각에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간단한 인사라도 하라는 대장의 말에 태우는 말없이 일어서 사무실을 나왔다. 곧 중택이가 뒤따라 나오며 혼자서 태우를 배웅했다.
-44쪽
흑산 소방서도 거기에 있는데 노란색인지 누런색인지 구분도 안 되는 색을 띤 2층짜리 건물이었다. 한쪽 벽면에 빨갛고 큰 글씨로 ‘흑산을 안전하게, 군민을 편안하게’라는 표어가 볼품없이 세로로 가지런히 쓰여 있었다. 1층에는 작동이나 될지 의심 가는 커다란 차고 셔터가 활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에 빨간 소방차 서너 대와 구급차, 지휘차 등이 가지런히 서 있었다. 흑산 소방서 역시 거묵골의 역사와 같이 했다. 잘나가던 시절 개서(開署)했던 당시에는 서장들이 가장 근무하고 싶어 했던 소방서였다. 돈이 넘쳐흐르는 동네에서 기관장 노릇이 퍽 좋았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갓 진급한 신참 서장이나 퇴직을 얼마 남기지 않은 말년 서장들이나 배치되는 곳이 되었다.
-48쪽
차고 옆 등나무 아래 모인 무목과 태풍 그리고 막내 만수가 조금 전 태우의 모습에 이런저런 말을 하고 있다. 태풍이 무목을 향해 몹시도 신기한 듯 팀장의 모습을 이야기하자 무목은 알 듯 모를 듯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막내 만수는 팀장님도 사람인데 가족 같던 구조견을 잃었으니 상심이 컸을 거란 말만 되풀이했다. 무목은 태풍과 만수의 말은 건성으로 들으면서 속으로 한때 존경했고 지금도 그럴 거라고 믿고 있는 태우가 결코 세간의 말처럼 나쁜 사람이 아닐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가 조금 더 커지고 있음을 느꼈다.
-93쪽
원래 그라면 만수는 그냥 심성이 나약해 구조대원 일을 할 수 없는 그저 그런 녀석이었을 뿐이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괜찮다고는 하지만 차고에서 본 만수의 표정과 눈빛이 지워지지 않는다. 하염없이 바닥만 바라보던 만수의 얼굴에서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무언가를 보았다. 잔상처럼 희미하게 남은 표정이 태우의 마음을 심란하게 했다. 태우는 지금껏 20년 가까이 소방관으로 살며 동료의 표정을 그렇게 유심히 본 적이 있었는가 생각했다. 단연코 한 번도 없었다. 태우에게 혼나고 욕먹으며 잔뜩 주눅 든 후배들의 표정만 봐 왔을 뿐이다. 태우는 만수의 얼굴을 어디선가 본 듯했지만 끝내 떠올리지 못했다. 또 자신의 그림을 보고 외로움, 벽, 스트레스, 트라우마와 같은 말을 쏟아 낸 상담사 말도 신경을 건드렸다.
-107쪽
팀장실에 혼자 서 있는 태우는 숨을 몰아쉬며 선 채로 안절부절못했다. 아쉬운 마음 토로하는 대원들에게 괜한 성질을 낸 것이 금방 후회됐다. 그리고 갑자기 외로웠다. 혼자라는 쓸쓸함이 거세게 몰려왔다. 최근 뭔가 좋아지는 것 같은 기분도 잠시, 또 각박하게 혼자서 모든 것을 헤쳐 나가야 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그리고 벽에 걸린 거울을 봤다. 어딜 가든 혼자일 수밖에 없는 남자가 서 있었다. 평생 누구와도 소통하지 못했던 고집불통의 남자. 태우는 결국 그런 사람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체념하듯 마음먹었다. ‘그래. 가자. 떠나면 그만이야.’
-280쪽
4층이건 10층이건 당장 가까운 소방관은 자신과 거묵골 구조대원들뿐이었다. 다 구해야 했다. 몸이 가장 가벼운 태풍과 만수를 높은 곳으로 보내는 것이 당연했다. 보조 호흡기에 한 명씩이라면 태우 자신과 나머지 둘이 4층으로 간다. 팀이 분리되는 위험을 감수해야 했지만 태우는 대원들을 믿었다. 잠깐의 정적이 흘렀고 태우는 다시 크게 숨을 크게 들이쉰 뒤 조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희들… 나를 믿고 따라 줘야 한다. 우리가 다 구할 거다.”
-325쪽
태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저 누나만 부를 수밖에 없었는데 누나는 울고 있는 태우를 그저 바라보며 웃었다. 웃는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태우는 누나를 만지고 싶었고 껴안고 싶었지만 누나를 불태워 죽였다는 죄책감은 여전했고 그것은 태우의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그냥 양손을 앞으로 들어 누나를 향해 휘휘 젓는 게 다였다. 하지만 태우의 손은 누나에게 닿지 않았다. 태우는 그것이 더 안타까워 계속 울고 울었다. 그리고 말했다. ‘미안해. 누나. 누나. 미안해.’ 누나를 만나 그렇게도 하고 싶은 말이었다. ‘아니야. 태우야. 괜찮아.’
-35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