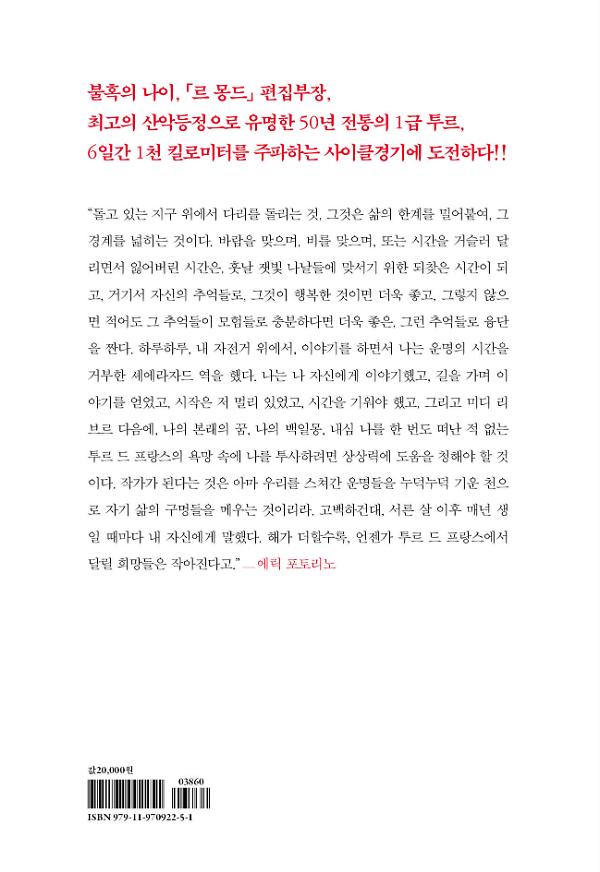저자는 사이클을 사랑한다. 짧은 애호가 아닌 전직 아마추어 선수로서의 길고 진한 애정이다. 이 작품을 시작으로 사이클 필자로서의 활동이 시작되었고, 이후 많은 사이클 책을 내고, 여러 관련 행사에 분야의 권위자로서 참가했다. 서지가 그것을 말해준다.
세계 최고의 투르를 보유한 나라 프랑스, 백년이 넘은 유수의 투르 드 프랑스는 프랑스의 국민 스포츠이자 국가적 행사다. 매년 7월 한 달 내내, 투르 드 프랑스의 열기는 온 국토를 녹인다. 장장 4천 킬로미터를 이어온 주파의 결승점, 샹젤리제에서의 돌고 도는 대미는 세계인에게 익숙한 인간 드라마의 생생한 이미지다. 그 투르의 유명한 전초전, 1949년 시작된 ‘미디 리브르 그랑프리’는 매년 5월 남불의 곳곳을 6일 동안 1천 킬로미터를 주파하는 일급 투르의 노정이다. 저자의 참여를 마지막으로 불가불 2002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이 전통의 투르에 감히 나이 마흔의 ‘늙은이’가 선수로서 참전할 생각을 한다. 어불성설의 무모함이자 실현 불가능의 만용이다. 가당치 않다.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을까? 그것이 가능할까? 이 책은 그 놀라운 드라마의 세세한 기록이자 생생한 훈련일지다.
책은 사이클의 A부터 Z까지 모든 걸 시시콜콜 밝히면서도 굳이 두 바퀴의 역사만을 논하지 않는다. 어쩌면 삶은 사이클이라는 상투적인 말이 가장 잘 어울릴지 모르겠다. 르 몽드 편집부장으로서, 불혹의 나이에, 1천 킬로미터를 주파하는 최상급의 전통의 사이클 대회에 한 명의 선수로서 참가하면서, 거기에 매일 밤 참전 기사를 송고해야 하는 무지막지한 업무를 소화해야 하는 지독한 사랑. 가히 사랑이 아니고서야 달리 표현할 길 없는 지독한 사랑. 그 투르에 임하는 6개월의 사랑 고백이다.
삶은 사뭇 무서운 사랑의 사이클이다.
르 몽드라는 세계적 언론사를 중심으로, 데스크로서 관찰해야 하는 본업인 격동의 국내 및 세계정치, 거기에 그가 자초한 새 임무인 국제사이클연맹(UCI)과의 관계 형성, 그리고 당시 온 나라와 세계를 떠들썩하게 한 사이클계의 도핑 스캔들 등을 배경으로 유장한 사이클 역사의 도도하고 웅장한 기라성들이 부침한다. 우리에겐 낯선, 그러나 프랑스인이라면 누구나 그 이름을 읊조릴 은하계 주자들의 전설이 샹송처럼 흐른다. 어린 선수였던 저자의 애틋한 추억과 인간승리의 위대한 주인공들의 대역사가 반추되는 한편, 이 놀라운 일인다역의 바쁜 삶 속, 기자이자 작가로서의 단상과 성찰이 무수한 일탈과 수렴으로 헤치고 모이기를 반복한다. 정신없는 삶으로부터의 도피인 듯, 한줄기 해방인 듯, 자전거 주자들의 놀라운 우정이 있고, 몸의 진솔함과, 육체의 모진 혹사를 감내할 수밖에 없는 온갖 경이로운 모험이 그려져 있다. 포토리노의 글은 사이클 휠처럼 계속 돌면서도 결코 넘어지거나 흐트러지지 않는다. 어지럽지만 하나도 어지럽지 않고, 한껏 자유로우면서도 지극히 자연스럽다. 일기이자 고백이자 성찰의 글쓰기.
어느 페이지를 열어도 사유를 위한 여백이 있다. 그 여백을 만들어주는 고마운 글쓰기다. 사이클을 사랑하든, 사이클을 모르든, 누구나 다가갈 수 있는 여백의 글쓰기다. 생각하게 하는 것, 글의 미덕이자 에릭 포토리노의 미덕이다. 그 성찬에 여러분을 초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