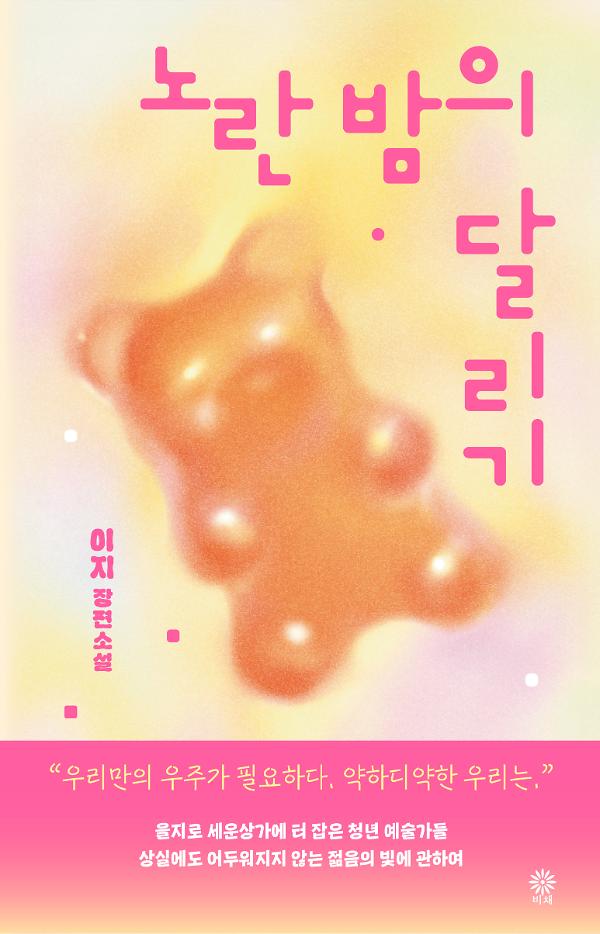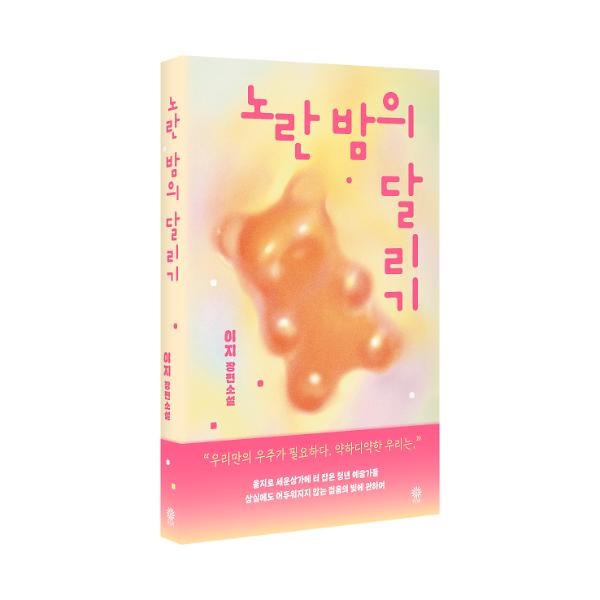남자란 종잡을 수 없는 존재야.
개란 종잡을 수 없는 존재야.
시계란 종잡을 수 없는 존재야.
바람이란, 물이란, 꿈이란, 종소리란, 비발디란, 잔디란, 음표란, 기타란, 형수 형이란, 아버지란, 아버지의 애인이란, 부모란, 엄마란. 그러다 마지막에 멈추는 것은 항상 엄마. 컴컴한 옷장에 날 남겨두고서 어디로 갔을까.
나의 요람은 옷장. 그래서 지금도 옷장을 좋아한다. 아닌가. 몹시 슬퍼하거나 무서워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역시 이건 내가 만든 신화다.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신화가 필요하니까.
엄마는 그냥 어느 날 불현듯 가출해서 돌아오지 않은 거고, 옷장에 가둬두거나 어디 묶어두거나 하는 그런 드라마틱한 학대를 하지는 않았다. 학대란 일대일의 대상이 되어야 벌어지는 일이 아닐까. 갇힌 공간에서 더 이상의 확장이 불가능할 때, 서로가 서로만을 바라볼 때 그래서 그것이 위협이 될 때 덜 약한 사람이 더 약한 사람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다. 나는 그냥 부스러기다. 엄마를 성가시게 하는 대상은 됐을지언정 위협하는 대상은 아니었던 것 같다.
_14쪽
생은 어쩌면 음식과도 비슷하다. 모르는 음식은 영원히 그 맛을 알 수 없지만, 한번 맛을 본 것은 모른다고 할 수 없다. 그러고 보면 맛은 단지 입으로만 느끼는 게 아니다. 미각이 첫 번째긴 하지만 후각이나 시각 또한 중요하고, 더 나아가 그 못잖게 중요한 게 또 있다. 바로 촉각이다. 면이 퍼져 있다면 더 이상 면이 아니고, 질긴 고기는 이미 고기가 아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된 촉각을 한 번이라도 맛본 사람은 그 전의 세계로 돌아갈 수 없다.
세상의 모든 전성기는 그 찰나다. 모든 것이 아주 잠깐 동안 딱딱 맞아떨어지던 그 순간. 우리는 모두 긴 어둠 속에서 아직 먹지 못한 음식을 기다리거나, 단 한 번 맛본 그 최고의 맛을 그리워하며 살아간다.
_43쪽
“만지지 마.”
내가 파이프에 손을 대려 하면 귀신같이 알고 말한다. 쳇. 그럴수록 더 만져보고 싶다.
엘은 눈이 뒤에 달린 것 같다. 이 말은 잘 이해해야 한다. ‘뒤에도’가 아니라 ‘뒤에’다. 즉 저렇게 안 보여주려고 하는 건 귀신같이 잘 보지만, 봐야 하는 건 잘 못 본다. 이를테면 내가 뻔히 앞에서 꽃을 들고 기다리고 있는데 산책하는 남의 집 강아지를 발견하고 나를 지나쳐 졸졸 따라가거나, 사러 갔던 물건 대신 엉뚱한 것을 사 가지고 올 때가 다반사다.
“이게 뭐예요?”
“응? 밤이잖아.”
아니 그러니까 밤을 왜 사냐고.
하지만 나는 더 묻지 않고 조용히 밤을 삶는다. 그러면 또 그녀는 삶은 밤을 다정하게 칼로 벗겨준다. 원래 해 먹기로 한 리코타 치즈 샌드위치 따위는 낼 수 없는 포근한 맛이다.
나는 엘을 만나 삶은 밤의 맛을 알게 됐다.
_87쪽
특별한 일이 없으면 작업실이 있는 세운상가로 출근을 한다. 태유와 내가 처음 들어올 때만 해도 아저씨들이 우리를 의아하게 바라봤는데 지금은 도도의 말에 따르면 백여 명이 넘는 또래가 있다.
서울의 도시재생 수순은 언제나 같다. 재개발이 발표되고 이랬다저랬다 하다 보면 땅값이 동결된다.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모인다. 가진 건 감각뿐인 우리는 우리의 눈을 위해 공간을 꾸며나가고, 그로 인해 동네 분위기가 조금씩 바뀐다. 입소문을 타서 사람들이 한둘 몰려들면? 그렇다. 상업지구로 변모하고 당연히 세가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곳으로 옮긴다. 옮기고 싶어서가 아니라 집세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오르고, 분위기도 엉망이 되기 때문이다. (이건 전부 내 기준이다.) 이 뫼비우스의 띠를 알면서도 도는 건 별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그나마 떠돌이 작업자들은 괜찮다. 다른 오래된 세입자들은 생계가 걸린 문제라 훨씬 민감하다.
_113쪽
“서울에 피사의 사탑이 있었으면 그것도 재개발했을 거 같아.”
엘의 말에 웃음이 터졌다.
“응. 최소 똑바로는 세웠을 거 같아요.”
똑바로 서게끔 재개발된 피사의 사탑을 생각하니 또 웃음이 났다.
“피라미드는 벌써 다 밀었겠지?”
“에이, 그래도 피라미드쯤이면 뒀겠죠. 경주도 고도제한해서 개발 안 하잖아요.”
“서울에 있었으면 모를 일이지.”
한산한 평일의 기차 안에서 엘과 나누는 농담은 무엇이든 유쾌했다. 늘 바쁜 엘이 어쩐 일로 시간이 났다. 나야말로 갑갑증이 생겨 서울을 떠나고 싶던 찰나였다.
창밖의 풍경들이 잠깐 내 것이 되는 프레임. 기차의 창이 좋다. 숲과 벌판이 스르르 지나가고 나뭇잎이 닿을 듯 펼쳐진다. 구름이, 매일 달라지는 구름이 창을 따라오다 힘에 겨워 흩어진다. 여행을 좋아하는 편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가본 데가 별로 없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 뇌와 눈에 산소가 공급되는 기분이 들었다.
_175쪽
눈 위에 눈이 쌓인다. 흩날리면서 눈은 눈과 만난다. 눈 위의 눈, 눈 위에 눈, 눈에 눈. 그리고 진흙. 아름다운 혼돈, 선과 선, 악과 악의 애매한 경계들. 그것들이 쌓이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기분이 든다.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작업을 묵묵히 해나갈 것이다. 작업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다.
엘과 나는 이제 서로 싫은 점에 대해 말한다. 나는 조심스럽고 엘은 서슴없다. 반대일 때도 있다. 물론 내가 싫어하는 점은 엘도 알고, 나의 단점은 나도 알지만, 또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지만 옆에 있는 사람은 의자가 아니라 사람이니까 얘기를 하고 싸우고 반성하고 화내곤 한다. 우리는 가족은 아니지만 가장 친한 사이니까 그렇게 합의를 본 셈이다. 그냥 그러면서 만나고 사랑하거나 미워하는 게 삶이라는 것 정도는, 또한 서로를 견뎌주고 가끔 도망갔다 되돌아오는 게 사랑이라는 걸 이제는 알기 때문이다.
_241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