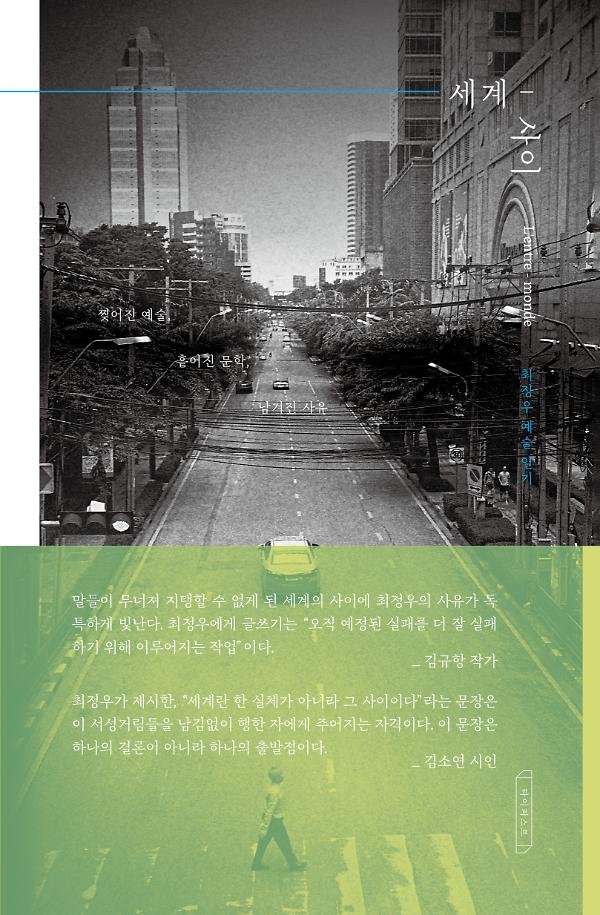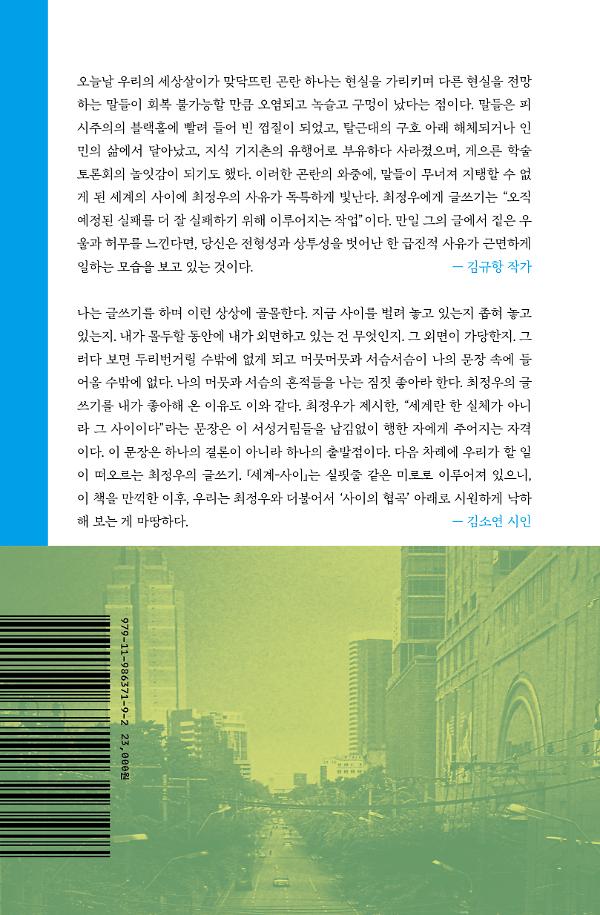세계는, 세계가 암호화되어 있다는 생각 자체로 암호화되어 있는 시공간이다. 우리는 세계가 비밀에 싸여 있고 그 비밀의 암호를 풀었을 때 세계의 진리가 드러난다고 생각한다. _20쪽
도시의 광고판과 전단지에서는 냄새가 난다. 하나의 도시에 도착하여 그 도시에 젖어 들기 시작한다는 것은 광고판에 익숙해진다는 뜻도 된다. 축약된 공감각의 어법, 전혀 다른 이미지의 후각적 문법. 그 이질적 감싸 안음 속에도 역시 냄새는 들어 있다. 도시는 냄새를 생산하고 다시 그 냄새를 지운다. _22쪽
다시금 황현산 선생의 저 한 문장을 새삼 떠올린다: “그러나 인간 너머를 생각하지 않는 인간적인 삶은 없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시대는 얼마나 ‘비인간적인’ 것들로 점철된 삶들의 시간인가, 또한 그럼에도 나는/우리는 인간을 끊임없이 넘어갈 저 가장 인간적인 것을 또 얼마나 치열히 붙들어야 하는가. _62쪽
누군가의 글은 모두 그가 그 시절에 보냈던 구조 신호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에 문장들의첫 글자들만 이어 보거나 가로로 쓰인 글을 세로로 읽는다거나 그렇게 해본 이들은 구조 신호가 글에 숨겨져 있는 게 아니라 쓰인 글 자체가 구조 신호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쯤
아, 그러니까 이 글을 쓴 이는 결국 구조되지 못했음을
글 자체가 바로 그 실패한 구조의 증거임을 그리 자세히 알 것도 없이, 바로 알게 된다. _96쪽
한 시대, 한 사회의 사유 방식은―그것이 어떤 중요한 것을 망각한 것처럼 보이는 때라도, 아니, 어쩌면 오히려 바로 그러한 ‘망각’의 때에야 비로소!―그 자신의 가장 실재적인 해석의 욕망을 드러내는 것이다. _162쪽
타자의 언어란 그러한 기쁜 깨달음의 순간들임과 동시에 매번 새로운 고통의 벽을 실감케 하는 완벽히 낯선 이물감의 현상이기도 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타자의 언어를 학습한다는 것은 어쩌면 동지의 힘으로 적의 말을 배우는 일과도 같다고 느낄 때가 많다. _189쪽
밤의 동물들, 또는 밤에, 동물들. 그 나약함weakness. 약하다는 것, 그것은 삶의 징표, 태어나면서부터 평생 달고 살게 될 상처의 각인, 곧 배꼽의 흔적을 통해 우리가 얻은 삶의 낙인과도 같다. 곧 그것은 생래적이다. _199쪽
내게 영화는, 그 자체가 찰나의 허구이거나 일시적 환상이라기보다는, 그 영화가 끝나고 밖으로 나와 다시 마주친 ‘현실’의 ‘가능’ 세계가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것이며 또한 그렇게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임을 보여 주는 ‘실재’의 구멍이자 ‘불가능’의 거울이었다. _204쪽
해학은 언제나 비참과 악수하고, 웃음은 언제나 울음 속에서 태어나며, 흥그러움은 또한 언제나 그로테스크와 마치 두 대의 인력거처럼 서로 충돌한다. _248쪽
완전한 이해라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삶은 어쩌면 그저 몇 개의 무인도들 사이를 옮겨 다니기만 하는 짧은 항해, 풍랑 잦은 물결 위를 그저 혼자서만 노를 저어 가는 짧은 여행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나 그 찰나의 순간 속에 영원의 역사가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에 언제나 나는 경이를 느껴 왔다. _266쪽
우리의 몸은 여전히 모든 것이 충돌하는 전장이고, 예술은 언제나 바로 그 현재에서 가장 격렬하게 정치적인 행위이다. 예술은 그러한 미학‐정치 위에서 작동하는 이데올로기이자 감각적인 것의 체제이다. _404쪽
니체의 말을 따라, 언제나 어린아이처럼 살아야 한다. 그것이 니체적인 맥락에서 가장 [건]강한 존재일 것이다. 푸생이 그린, 자신의 마지막 소유물인 사발을 던져 버리는 디오게네스처럼. 그러나 어린아이가 될 수 없다면 차라리 사자의 삶이 더 낫다. _408쪽
정신은 물질이라는 항성恒星 주위를 공전하는 우주적 먼지이거나 그 먼지들이 뭉쳐서 만들어 낸 행성行星이다. 정신은 그 스스로는 자전하면서 그렇게 밤과 낮을 만든다. 물질이라는 태양이 만들어 낸 낮의 이면에서 밤의 이성이 괴물을 낳는다. 이성의 낮은 괴물이고 그 괴 물의 밤은 다시 이성이다. _423쪽
여행이라는 ‘수단’은 삶이라는 ‘결과’와 마찬가지로 진리를 구성하는 하나의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 단순한 부분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여행과 삶은 단지 진리를 구성하는 흩어진 개별적인 요소들이 아니라, 그 자체로 삶을 구성하는 하나의 진리이자 그 진리를 향해 걷는 여행의 길이므로. _453쪽
나는 글을 쓴다. 그러나 세계는 단지 둘이 아니며, 내가 쓰디쓰게 쓰는 곳의 방점은 ‘두 세계’가 아니라 그 ‘사이’에 있다. 하여 그 사이란 그렇게 ‘곳’이면서 동시에 ‘때’이다. 세계‐사이는, 세계의 시간이면서 동시에 사이의 공간, 뒤섞인 시차들의 세계이면서 동시에 얽힌 관계들의 사이이다. 나는 그 사이에 있고 또 없다. 나는 그렇게 사라지면서 남겨질 것이다, 상실되면서 잔존할 것이다. _455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