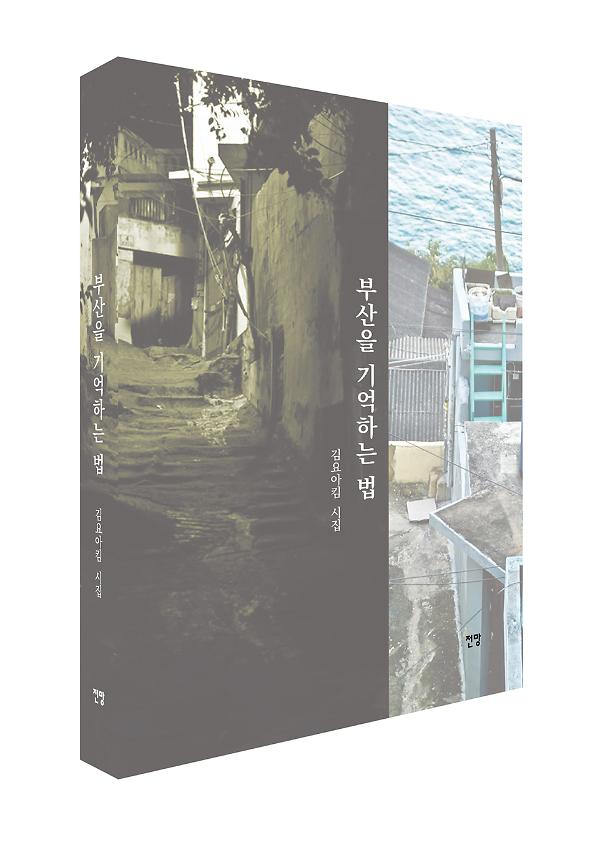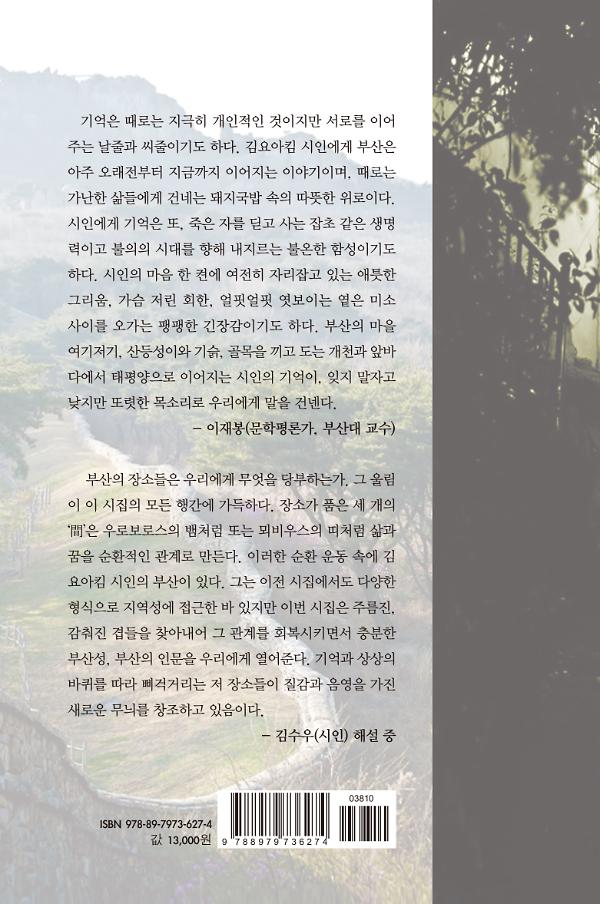우두커니 앉은 방안의 어둠이 짙을수록, 창밖 산 그림자가 선명하게 드러났다
생의 감각이 날밤을 새우며 통증으로 이어지던 날, 조금씩 산의 오솔길이 보이기 시작했다
마음을 내려놔야 한다는 처방을 떠올리며 지금껏 짊어온 무게를 저울질하려할 때 길섶의 꽃무릇이 슬며시 다가왔다
배고픔을 하얗게 속이던 하루하루를 보내며 무심코 지나쳤을 그 숲속 길냥이에게 비로소 인절미 과자 하나를 뜯어주었다
끈적하게 지상에 발을 디뎌온 날들 하늘의 명을 알아야 할 지금, 마침내 마음이 환하게 열리었다
―「개심開心-금정산을 맞았다」
상석床石의 제물은 죽은 자의 몫이 아니다
떼로 날아든 까치의 수런거림 뒤로
시대를 관통하는 배고픔이 도사리고 있다
대여섯 살, 전설의 고향에서나 볼 법한
하얀 소복 입은 긴 머리 그림자
살기 위한 몸부림 앞엔 무서움도 사치다
매캐한 화약내, 가릴 것 없는 민둥 자리로
이방인의 묘비는 산 자의 주춧돌이 되고
대를 이어갈 든든한 옹벽이 되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무명옷을 다듬질할 방망이는
끊임없이 비문을 두드리고
유골함은 이미 항아리가 되어 부엌을 지켜왔다
가끔씩 ‘이따이, 이따이’ ‘아츠이, 아츠이’ 하는 소리가
들려온다는 소문만이 무성할 뿐
아무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 아미동에
산 자와 죽은 자의 경계는 없다
여기는, 가난으로 생과 사를 초월하는 힘을 가진 곳이다
―「아미동은 여전히 힘이 세다」
동해와 남해가 나뉘는
서늘한 경계에서
목숨보다 더한 이념의 광기가
시퍼런 파도를 적셨던 그곳은
거센 소용돌이로 누구도 빠져나오지 못할
창백한 역사의 쉼표 어디메쯤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영문도 모른 채 끌려나와
새끼줄에 묶인 무수한 손발
전쟁이 터진 그해, 오로지
단 한 발의 총성도 아까워
확실하게 증거를 인멸하려 했던
그곳은 지금, 유람선이
유행가를 매달고 하염없이
부산항으로 돌아오라 넘실대고 있지만
저 먼 쓰시마 해협까지 떠밀려간
그때의 잔혹한 기억들을 떠올리며
좌우로 떠 있는 방패섬과 솔섬이
결국 우삭도 하나였음을 오륙도는
썰물처럼 여전히 노래하고 있다
―「오륙도 비가悲歌」
산군山君이 사라졌다
인왕을 거처로 남북 수백 리를
옹골차게 호령했을 깊은 산중의
왕좌는 이미 폐위되었다
유난히 도드라진 산맥의 힘줄
속속들이 헤집으며
놋대야보다 더 큰 광채로
어둠 밝힌, 숲속의
이 경외敬畏로운 자세는
백두대간을 틈타 목을 축이며
천천히 하늘을 바라본, 여기
호계천까지 이어졌다
아들을 잃은 한 아낙의 젖이
어린 범을 살려냈다는 소문이 끝없는
산군의 은덕으로 귀결되었던
가난한 마을의 전설은
전쟁을 피해
먹고 살기 위해 부산하게 모여든
거친 생의 디딤이 되어줄
안창이었다
군주가 없는 시대, 여전히
도도한 바위와 넉넉한 나무 그늘 아래로
다시 한 번 큰 대륙을 향해 포효할
용맹한 족적이, 지금
골목 벽화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다
―「포효-안창, 호랭이 마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