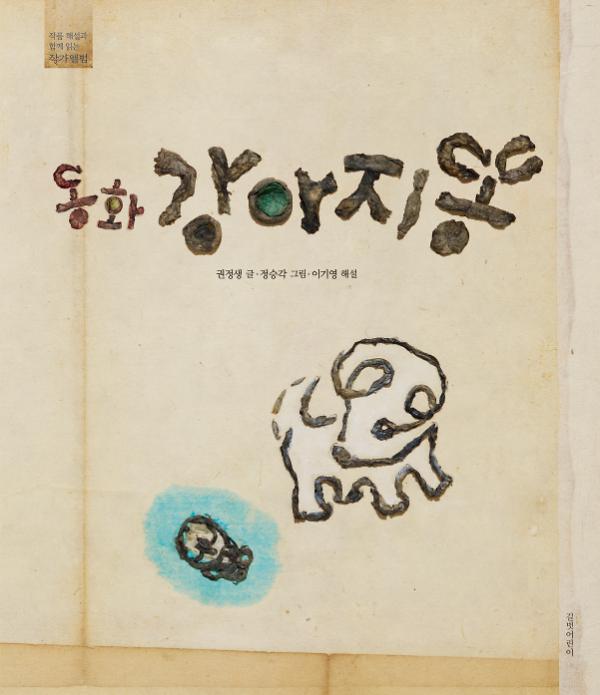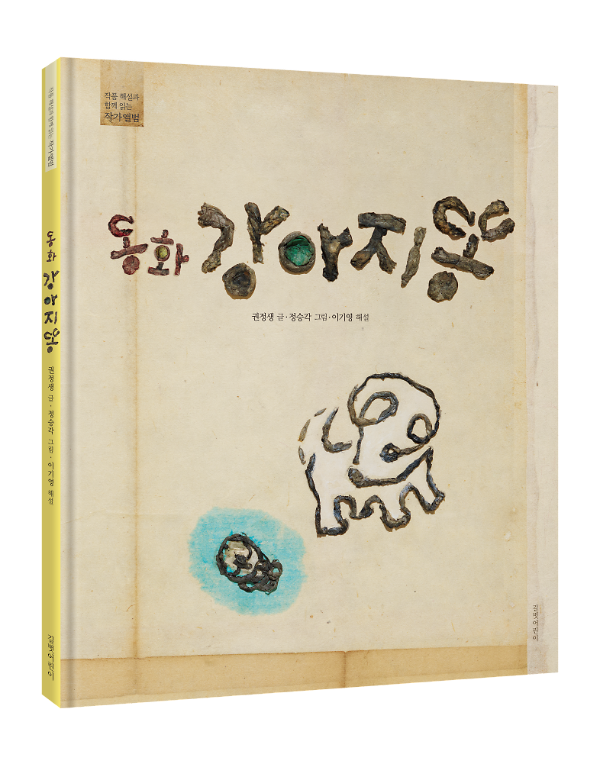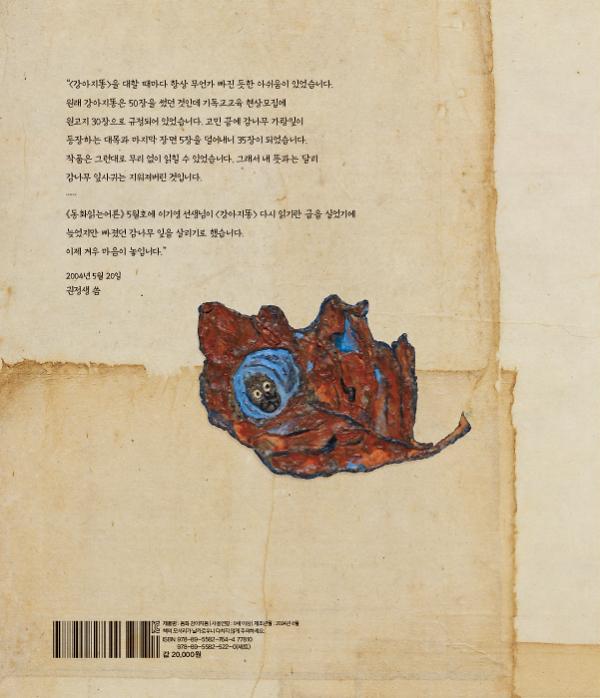p. 10~11

참새 한 마리가 포로롱 날아와 강아지똥 곁에 앉더니
주둥이로 콕! 쪼아 보고, 퉤퉤 침을 뱉고는,
“똥 똥 똥……. 에그 더러워!”
쫑알거리며 멀리 날아가 버립니다.
강아지똥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똥이라니? 그리고 더럽다니?”
무척 속상합니다. 참새가 날아간 쪽을 보고 눈을 힘껏 흘겨 줍니다.
밉고 밉고 또 밉습니다. 세상에 나오자마자 이런 창피가 어디 있겠어요.
p. 24~25

그때, 과연 저쪽에서 요란한 소달구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나는 이제 그만이다.’
흙덩이는 저도 모르게 흐느끼고 말았습니다.
“강아지똥아, 난 그만 죽는다. 부디 너는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나 같은 더러운 게 어떻게 착하게 살 수 있니?”
“아니야, 하느님은 쓸데없는 물건은 하나도 만들지 않으셨어. 너도 꼭 무엇엔가 귀하게 쓰일 거야.”
소달구지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흙덩이는 눈을 꼭 감았습니다.
강아지똥은 그만 자기도 한몫 치여 죽고 싶어졌습니다.
으르릉…… 쾅!
그런데 갑자기 굴러오던 소달구지가 뚝 멈추었습니다.
“이건 우리 밭 흙이 아냐? 어제 이리로 가다가 떨어뜨린 게로군.”
소달구지를 몰고 오던 아저씨가 한 말입니다. 그러고는 흙덩이를 조심스레 주워 듭니다.
“우리 밭에 도로 갖다 놔야겠어. 아주 좋은 흙이거든.”
흙덩이는 무어가 무언지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달구지 한 편에 얌전히 올라앉자,
방긋방긋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밭으로 도로 돌아가게 된 것을 그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p. 30~31

“난 감나무 잎이야.”
“감나무 잎이 왜 땅바닥에 굴러다니니?”
그제야 강아지똥은 눈을 뜨고 감나무 가랑잎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겨울이잖니, 우리 모두 엄마 나무에서 떨어져 흩어졌단다.”
“겨울이면 엄마 나무에서 떨어지니?”
“그럼, 우리가 모두 떨어져 죽어야만 엄마는 내년 봄 새 아기 이파리를 키우거든.”
“엄마야! 불쌍해라.”
“불쌍해도 어쩌지 못하는걸. 이 세상엔 누구나 한번 태어나면 언젠가 죽는단다.”
“하지만, 아까 낮에 있었던 흙덩이는 죽지 않고 살아서 도로 밭으로 가는 걸 봤는데.”
강아지똥은 낮에 있었던 흙덩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나무 가랑잎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 춥던 것도 무섭던 것도 많이 가시어졌습니다.
“그래, 하지만 흙덩이는 아직 죽을 때가 아니었나 봐, 세상엔 우리보다
아주 오래오래 사는 애들도 많거든.”
감나무 가랑잎이 잠깐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럼 빨리 죽는 것하고 오래 사는 것하고 다르니?”
강아지똥이 물었습니다.
p. 42~44

강아지똥은 눈부시게 쳐다보다가 어느 틈에 그 별들을 그리워하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아름다운 불빛.’
이것만 가질 수 있다면 더러운 똥이라도 조금도 슬프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강아지똥은 자꾸만 울었습니다. 울면서 가슴 한 곳에다 그리운 별의 씨앗을 하나 심었습니다.
p. 48~49

‘아, 과연 나는 별이 될 수 있구나!’
그러고는 벅차오르는 기쁨에 그만 민들레 싹을 꼬옥 껴안아 버렸습니다.
“내가 거름이 되어 별처럼 고운 꽃이 피어날 수 있다면, 온몸을 녹여 네 살이 될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