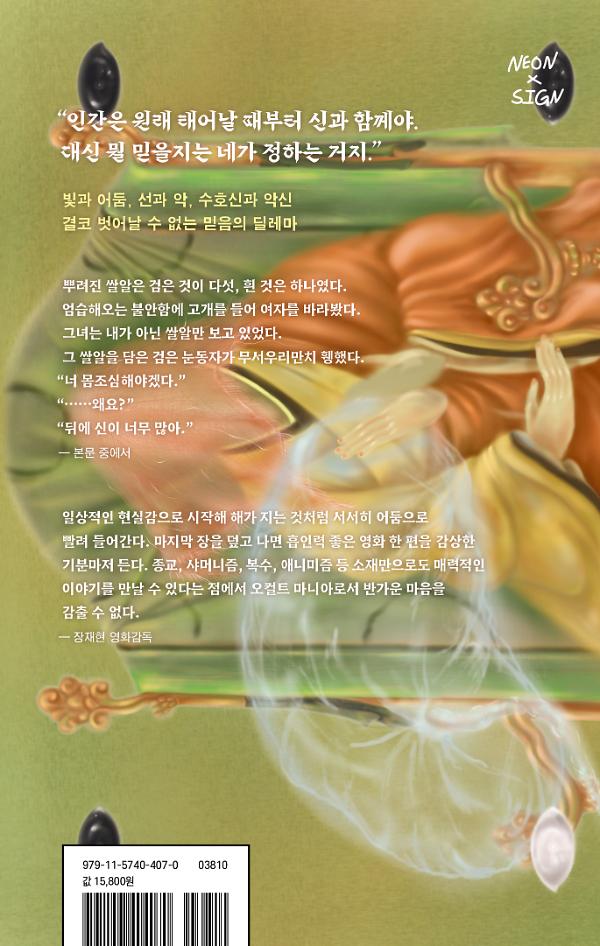신의 저주인가 가호인가
연이은 불행 속에 피어나는 의심
며칠 동안 똑같은 꿈을 꿔본 경험이 누구나 한 번쯤 있을 것이다. 꿈에서 깨고 나면 기억도 흐릿해지지만 여러 번 반복되는 꿈은 때로 호기심을 넘어 두려움을 불러일으킨다. 여기, 좋아하던 남자가 죽은 후부터 ‘흰 소’가 나오는 악몽을 반복해서 꾸게 된 인물이 있다.
‘이원’은 같은 철학 동아리원 ‘경우’가 죽고 난 뒤부터 매일 밤 꿈에서 흰 소를 마주한다. 그러던 어느 날, 새 동아리원으로 종교사학과 신입생 ‘설’이 들어온다. 소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점을 비롯해 닮은 점이 많은 두 사람은 급속도로 가까워지기 시작하고, 악몽 이야기를 들은 설은 급기야 이원을 돕겠다고 나선다. 뜬금없는 호의에 당황스러우면서도 이원은 설에게 의지한다. 불행 속에 나타난 구원의 손길에는 거부할 수 없는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원이 너, 설이랑은 친해?”
“나름요.”
(……)
“같이 일하는 근로장학생이 종교사학과 1학년이라 내가 물어봤거든? 근데 좀 이상해.” (61~62쪽)
『수호신』은 “인간은 날 때부터 수호신과 악신 모두와 함께한다”는 설(說)을 시작으로 이야기가 펼쳐진다. 이는 설의 손에 이끌려 찾아간 점집에서 이원이 들은 점사의 일부기도 하다. 이원의 악몽과 불행은 끊이지 않는다. 게다가 가까워질수록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설의 태도에 이원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꿈에 나오는 소의 정체, 알 수 없는 설의 마음, 뭔가 아는 듯하지만 말해주지 않는 엄마까지.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게 불분명한 그때, 의심의 불길은 가장 강력해진다. 설은 과연 이원을 구원할 수호신일까, 그녀에게 내린 악신의 저주일까. 신과 인간은 매듭지어져 있다는 태초의 가정이 한 인물의 모든 판단과 믿음을 쥐고 흔들 거대한 혼돈의 씨앗이 된다.
‘믿음’에 대한 질문
오컬트 장르만의 매력
『수호신』 속에는 신을 대하는 여러 관점이 흥미롭게 등장한다. 어떤 이는 신의 숭고함을 우러러보고, 어떤 이는 신의 존재를 거부하며, 또 어떤 이는 신을 향한 믿음에 혼란을 느낀다. 이것은 현실의 우리가 종교를 대하는 견해들과 흡사하다. ‘신이 존재하는가’에서 시작해 ‘과연 어떤 신을 믿어야 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 이르기까지, 작품 속 인물에게 던져진 질문이 독자에게 그대로 넘어오는 경험이야말로 오컬트를 읽는 이유이지 않을까.
“난 안 믿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것들.”
믿지 않는다고 육성으로 말하는 순간 어렴풋이 깨달았다. 나는 알게 모르게 꿈과 악신, 그 모든 것을 다 믿고 있었다. 믿지 않겠다는 선언 자체가 사실은 악신을 믿고 두려워한다는 반증이었다. (58쪽)
이원은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피어나는 의심과 두려움을 마주하고 깨닫는다. 믿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결국 신의 존재에 누구보다 깊게 몰입하고 있음을 말이다. 이 같은 순간을 통해 우리는 한 번쯤 ‘믿음’의 본질에 대해 생각해보게 된다. 점집의 무당도, 심지어 설조차도 이원에게 신을 믿으라고 종용하지 않는다. 결국 대상을 향한 믿음은 완벽한 자의로 만들어진다. 자신도 모르는 새에 조용히, 그것이 옳고 그른지도 분간할 수 없는 채로. 그러니 다른 누군가의 탓으로도 돌릴 수 없다.
결국 이원은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제 발로 어두운 미궁 속에 걸어 들어간다. “매듭도 보여야 풀 수 있”다는 설의 말처럼 자신을 옭아맨 지독한 고리의 시작을 향해 천천히 전진한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이원이 풀어야 할 실타래다. 여전히 답변해야 할 질문이 그대로 남아 있다. 무엇을 믿을 것인가? 지금 당신의 곁에 신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수호신인가, 악신인가? 질문에 대한 나름의 답을 찾아 이 책의 결말을 확인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