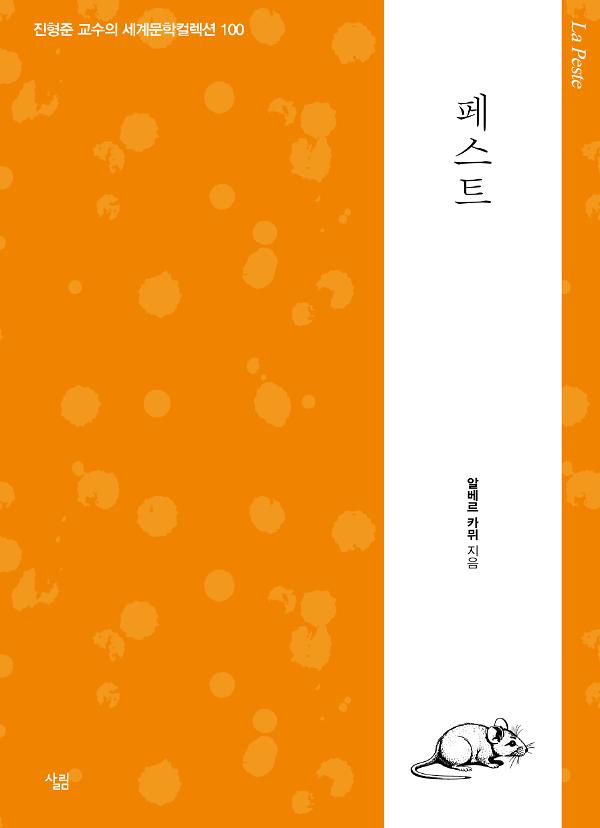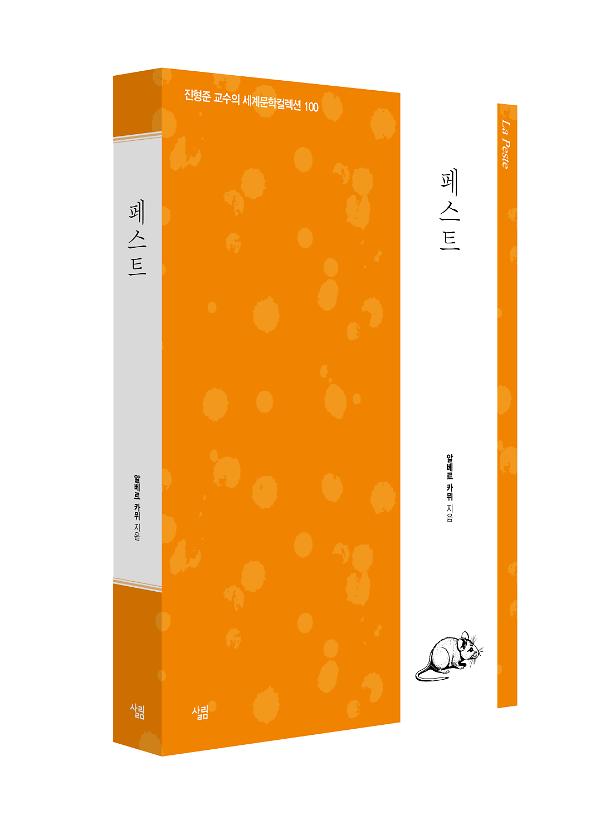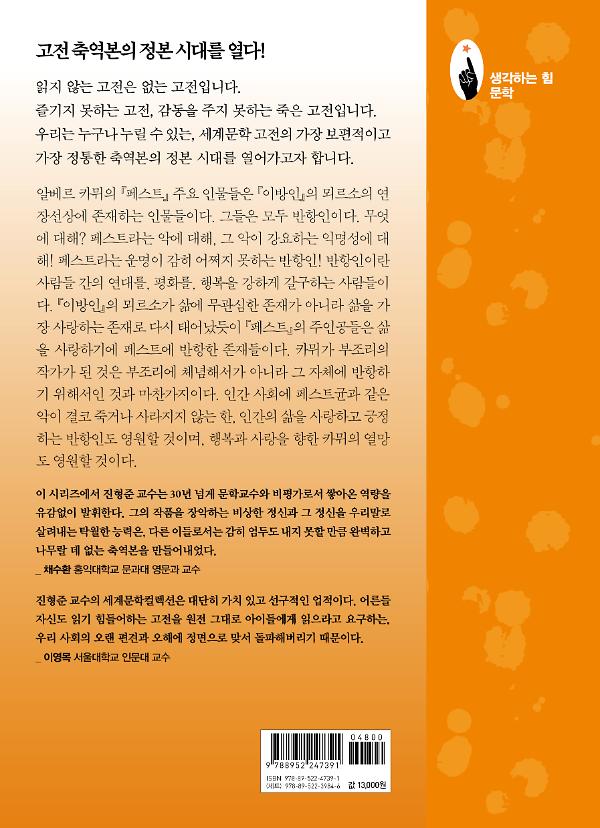‘죽음’이라는 가장 개인적인 실존 앞의 연대감, 가장 성실하고 진정한 인간은 반항인이다! 200자 소개 1940년대, 알제리의 도시 오랑 시에 페스트가 창궐한다. 오랑 시는 외부와 격리되어 폐쇄되며 시민들은 고립된다. 의사 리외는 지식인 타루와 함께 시민들의 페스트 치료에 힘쓰고 신부 파늘루, 기자 랑베르 등도 구호활동에 참가하며 죽음 앞의 실존에 힘쓰는 다양한 개인의 모습이 등장한다. 사람은 누구나 제 안에 페스트를 지니고 있다. 페스트는 이 세상 그 누구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이다. 얼핏 보기에 페스트는 사람들을 하나의 공동운명체로 묶어주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묘한 역설이 있다. 페스트라는 재앙에 의해 형성된 ‘공통감정’은 ‘개인적인 감정’의 말살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공통감정은 사람들을 맺어주는 긍정적 감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주된 고통’이 된다. 개인적인 운명의 말살 위에 세워진 감정이기 때문이다. 페스트에 갇혀 지내면서 페스트는 일상이 되어버린다. 시민들은 자기들이 페스트의 지배하에 살고 있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한다. 예를 들면 페스트 환자의 시체를 소각하면서 연기가 발생하자 시민들은 페스트균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며 소각장 이전을 요구한다. 그들은 연기만 보이지 않으면 페스트가 없는 것처럼 생활한다. 페스트는 구체적인 현실감을 상실한 추상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그 상황은 말하자면 나와 상관없는 추상적인 논리와 합리성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방인』의 상황과 같다. 『이방인』의 뫼르소는 그런 추상적 이념이나 논리의 세상을 거부했다. 그 세상은 뫼르소라는 개인의 실존과는 상관없는 ‘환상적’인 세상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만일 뫼르소라는 인물을 페스트가 창궐하는 오랑 시에 등장시킨다면 그가 감연히 ‘반항인’이 되었으리라고 확언할 수 있는 것은 그 때문이다. 이방인의 마지막 대목은 죽음에 가까이 이르자 비로소 세상을 향해 자신을 여는 뫼르소의 모습이다. 그는 그토록 나와 무관했던 세상이 자신과 너무 닮았다고 느끼고 너무 형제처럼 여겨졌다고 말한다. 그렇기에 행복했었다고, 여전히 행복하다고 느낀다. 그 행복은 세상의 무관심에서 다정함을 느끼면서 얻은 행복이다. 그러나 그는 그 무관심이 ‘증오’의 함성으로 바뀌어 나를 맞아주기를 바란다. 증오를 통해서라도 타인과 맺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가 소망하는 타인과의 연대감은 나를 지운 상태에서 생긴 것이 아니다. ‘죽음’이라는 가장 개인적인 실존 앞에서 느낀 연대감이다. 개인적인 실존이 지워지면 연대감도 없다. 뫼르소는 앞으로 그 연대감, 그 행복이 너무 소중해서, 절대로 개인이라는 실존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뫼르소를 만일 오랑 시에 데려다 놓는다면 그가 가장 격렬하게 저항했으리라고 우리가 믿는 것은 그 때문이다. 왜? 페스트는 ‘나’를 또 다시 익명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이다. 그의 행복과 사랑과 연대감은 ‘나’를 익명으로 만드는 모든 것에 대한 ‘저항’과 ‘반항’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제 우리는 『페스트』의 주요 인물들을 뫼르소의 연장선상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그들은 모두 반항인이다. 무엇에 대해? 페스트라는 악에 대해, 그것이 강요하는 익명성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