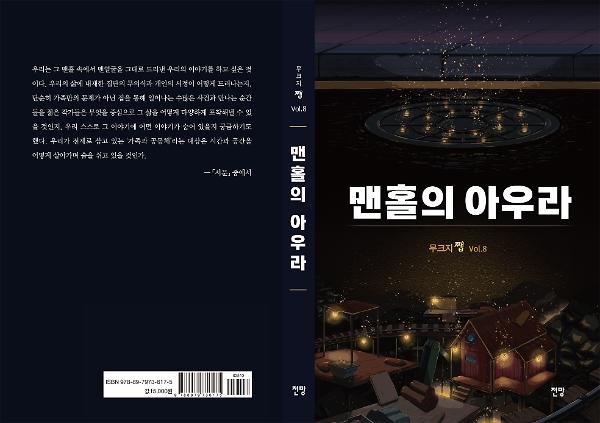빌린 정원/박길숙
옆집 원규네 고양이가 담을 넘는다 나비라는 이름을 넥타이처럼 매고
난간에 걸터앉아 빛을 그러모은다 빛을 놓친 손등을 핥다가 사타구니를 핥는다
시폰 원피스를 입은 빛이 가만히 내려앉는다 난간 돌무늬에 집중한다
나비가 솟아오른다 입에 붉은 옷자락을 물고 잽싸게 달아난다
원규가 운다
나는 오월의 달력으로 만든 상자에서 귀뚜라미를 꺼낸다
여치를 꺼낸다 날개를 뗀 곤충들을 쏟아낸다
원규가 운다 구멍 난 잠자리채를 손에 꼭 쥐고
일층 원상사네 마당에는 감나무가 있다 연못이 있는데 물고기는 없다
감나무는 푸르다 잎도 열매도 의심도 푸르다
이층 우리 집까지 손을 뻗는다 종종 옆집 담장을 넘보기도 한다
원상사네 할머니는 아주 큰 울화통을 지녀 큰 소리를 지른다
언 놈이 생감을 다 따버린겨? 이 우라질 놈들, 손모가지를 잘라 담벼락에 하나하나 꽂아 버릴껴!
나무에 앉아있던 새가 놀라 똥을 지리며 날아가고 팔을 뻗던 나무는 슬몃 새끼손가락부터 거둬들인다 원규네 나무창이 덜컹덜컹 닫힌다
나비는 돌아오지 않고 오후의 배경에 서 있던 엄마는 젖은 수건을 탈탈 턴다
물방울 하나에서 빛이 막 태어나던 순간이었다
서촌구석몰길/석민재
구석은 완전하고
구석 이상의 구석은 없다
하루도 어김없이 해가 지는 일과 골목을 위한 골목의 의지와
같은 시간에 산책하는 개와 아저씨와 세 발 오토바이와
아문 상처와 절망의 끝이 어디쯤인지 알고 있는 눈동자
우리 머리 위로 그림자가 필 때
소 키우던 아저씨가 죽고
은퇴한 비행기 조종사가 이사 왔다
크게 놀라지 않고 크게 실망하지 않고
새로운 구석을 만들기 위해 구석을 낭비하지 말자
오늘이 가고 내일이 가고
같은 이야기를 주인공만 바꿔가며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종점에 꽂혀있는 깃발이 아니다
구석은 서촌에 있고
구석은 구석에 몰려있다
집으로 돌아가자/오성인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애도함
집을 나간 아이들이 돌아오지 않는다
배가 고프다고 이 앞에서 맛있는 것
사서 금방 오겠다고 했는데 코로나로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과
오랜만에 약속을 잡았다고 한껏 들뜬 채로
늦지 않게 오겠다고 했는데
가게에서 먹고 싶은 음식은 샀는지
그토록 보고 싶었던 친구들은 만났는지
밤이 늦도록 어째서 소식이 없는 걸까
핼러윈, 오늘은 죽은 영혼들이
되살아나 돌아온다는 날인데 주머니에
사탕과 초콜릿을 가득 채우고 누구나
재회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오전과 오후에 손을 흔들면서 얼른
다녀오겠다고 집밖으로 나선 너희는
신발과 가방, 헝클어지고 찢어진 옷만
남겨두고 어디로 가버린 것일까
맛있는 음식을 사러 나가는 길과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길을 도대체 누가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만들었을까
늦지 않았으니 그만 집으로 돌아가자
금방이라도 골목 끝에서 웃는 얼굴로
나타날 것만 같은 너희를 기다리는 집으로
우태자 꽃집/오윤경
낯선 사내 하나가 엄마를 사갔다 뚝, 마디를 부러뜨리는 고무나무 금전수 잎들이 나뒹굴었다 얼어 죽은 행운목은 발끝이 까맸다 나는 아버지가 누운 화분에 흠뻑 물을 주었다 빛을 주었다 비좁은 화분과 주먹질과 싹둑 움찔, 아버지의 팔이 움직였다 감자에 싹이 나서 잎이 나서 감자감자뽕! 하나빼기! 주먹은 떨고 나는 더 많이 떨고 약봉지처럼 떨고 있는 엄마 햇빛이 잘 드는 곳만 생각했다 젖은 엄마를 말리고 나는 잘라낸 아버지의 팔을 창가에 접붙였다 쭉쭉 팔은 자라서 방을 뒤덮고 천장을 뒤덮었다 나는 그 넝쿨에 쪼그리고 앉아 온종일 눈물을 만들었다 방안 가득 쌓이는 화분들 엄마, 어서 빨리 아버지를 팔아야 해요 오빠를 팔고 언니, 동생을 팔고 액자와 이불과 가위와 시크라멘, 연산홍, 꽃기린, 동백을 팔았다 나도 팔고 팔 수 있는 건 전부 팔아치웠다 아빠는 팔리지 않았다 나는 엄마를 사간 사내가 돌아올까 봐 아무도 몰래 화분을 내다 버렸다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 햇빛을 피했다 엄마가 말라 죽은 스킨 넝쿨을 뽑아내고 그 자리에 싱싱한 웃음을 파종했다 웃음은 뿌리 없이도 잘 자랐다
수야리, 여름의 집/이소회
까막눈이었지만 할머니는 읍내서 수야 오는 버스를 한 번도 틀린 적 없다 할머니가 만든 떡밥이면 수야못에서 새우가 한 소쿠리다 할머니 징거미새우국은 아무리 더워도 시원하다.
누가 나를 업어 가더란 소리에 할머니는 밭에서 호미를 든 채 달려왔다 나는 툇마루에 앉아 까딱거리고 방바닥에 뒹굴고 감나무 올려다보고, 밭으로 돌아가서 할머니는 눈이 삔 남지 아지매와 한판 떴다.
선주 언니하고 대청마루서 노는데 스님이 와서 목탁을 쳤다 나는 뒤주를 열어 쌀을 바가지 가득 담았다 할머니 말로 얼라들만 있는 집이었다 저녁에 온 할머니는 땡중을 두고 대문 밖까지 욕을 했다.
저녁상을 물리고 수박도 물리고 정지 소제까지 다 끝나야 겨우 해가 진다 평상에 누우면 할아버지는 모깃불을 피운다 매캐한 연기 사이로 새우 눈알처럼 하늘 못에 별들이 돋아난다 손가락 끝이 간질거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