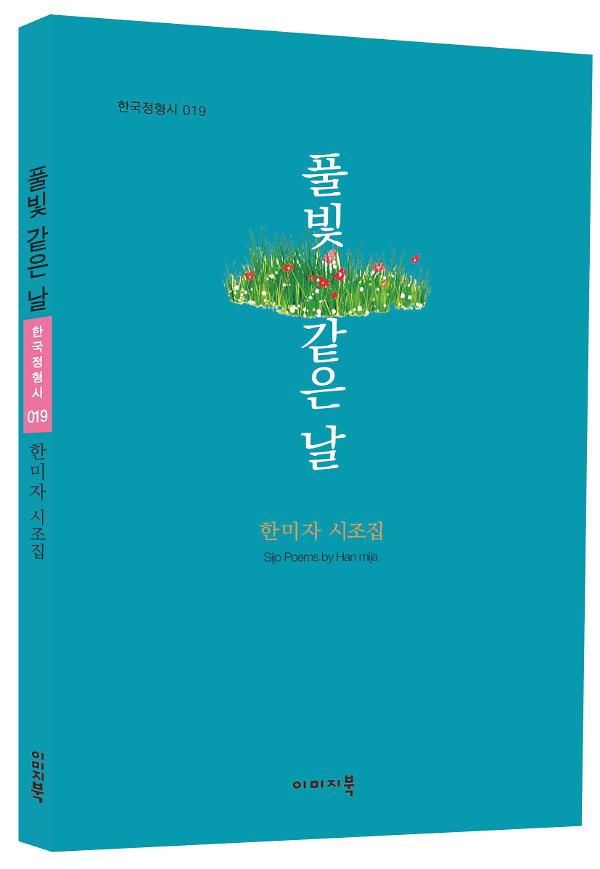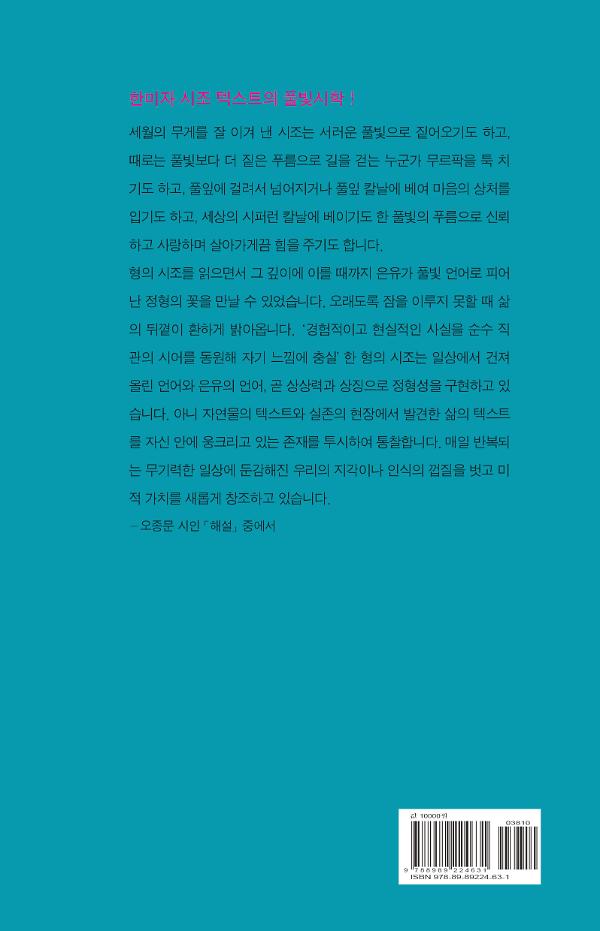한미자 형! 24년 만에 두 번째 시조집을 내시는군요? 1992년 〈문학세계〉 신인상으로 문단 등단하고, 1999년 첫 시조집 『그루터기의 말』을 발간했으니 말입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등단 후 시조단 행사에서 만나 연을 이어온 지금까지 형은 한결같은 시인이었습니다.
당시 시조의 깊이보다는 의욕만 앞서고 객기만 넘쳐났던 나의 30대 시기, 대책 없는 후회에 빠지기도 합니다만 시조문학에 대한 순수한 열정만은 진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만난 형은 단아한 외모에서 느껴지는 한 편의 단형시조 같은 이미지였습니다.
때로는 큰누님 같기도 한 동료 시인의 도반으로 시조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면서 갑작스러운 형의 건강 때문에 문학을 멀리하고, 다시 건강을 추스르기까지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동안 바람의 풍문으로 소식을 접하기도 했고, 안부가 궁금했지만 쉬이 연락도 하지 못했습니다.
형이 고향 김포에 생활의 뿌리를 다시 내리면서 건강을 회복하고, 난蘭을 옆에 두면서 심성을 더 곱게 다듬고, 텃밭에 작물을 기르면서 자연과 호흡하고, 근래에는 배우의 길까지 걸으면서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을 때까지의 일들을 잘 니다. 그동안 쓴소리처럼 들렸을 잔소리를 다 받아내고, 그래도 시조의 끈을 놓지 않고 작품을 발표하는 형을 보면서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긴 세월의 시간이 편편의 작품으로 고스란히 익어 두 번째 시조집의 결실을 보게 된 것을 그 어느 때보다 기쁘게 생각합니다. 형이 밝힌 ‘시인의 말’에처럼, “소중한 내 기억들, 그것들을 간직하고 싶었”지만 “이런저런 구실로 멈추는 날이 더 많았”고, 오랜 시간 시조를 두고 뒤뚱거렸던 그 시간을 품에서 내린다는 말이 왠지 안쓰럽고 서운하고 비장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