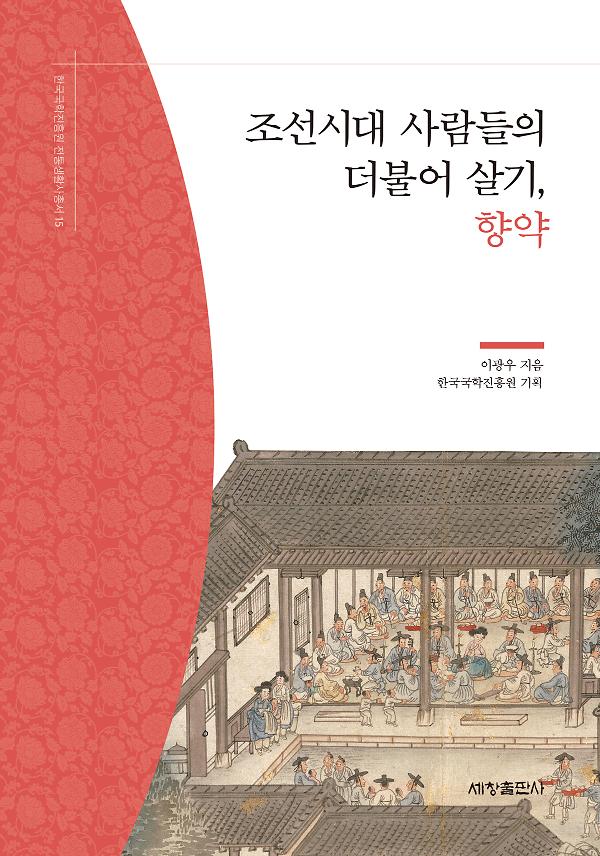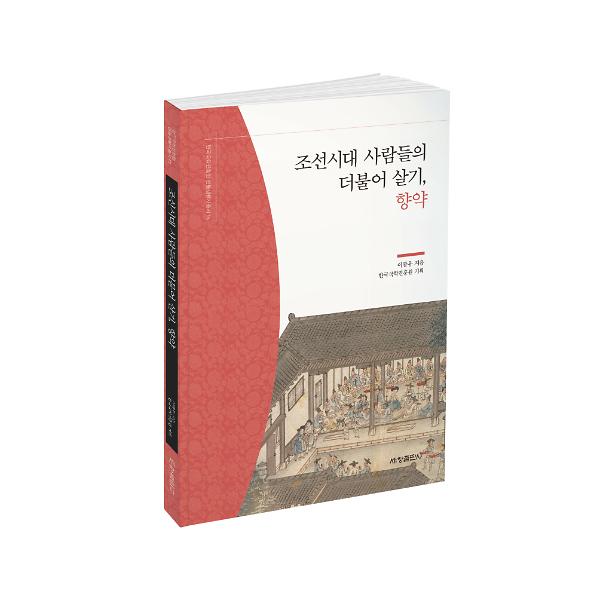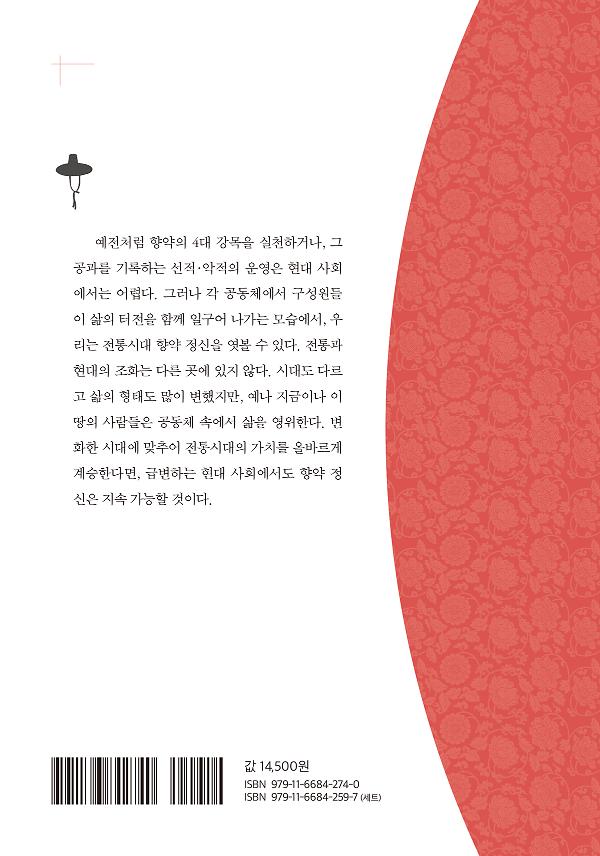p. 18
예나 지금이나 음식을 나누어 먹는 행위는 사람과 소통하고 친목을 다지는 필수적인 행위이다. 음식을 나누어 먹는 행위의 빈도와 범위를 통해, 참여자가 소속된 공동체 조직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런 관계로 과거 지방에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사는 곳을 표현할 때 ‘향’이라는 문자를 사용하게 된 것이다.
고대 중국에서도 왕조의 권위가 높아짐에 따라, 율령(律令) 체계가 지방에 전파되었지만, 그와 별개로 ‘향’에서는 관습적으로 행해지던 공동체 단위의 여러 자치 규약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자치 규약이 율령 체계보다 지방의 현실과 문화를 좀 더 생생하게 담고 있다.
p. 47-48
현대의 지방자치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천이듯이, 향약 운영은 당대의 통치 이념인 주자 성리학의 실천이었다. 따라서 사대부 계층은 자신들의 자치 조직에 성리학의 향약을 투영하기 시작하였다. 현대의 지방자치와 버금가는 조선시대 자치 조직이 바로 유향소이다.
조선 왕조도 향약을 예의주시하였다. 우리나라 역대 왕조는 중앙집권적 통치체제의 정립을 모색하면서도, 자치적 성격을 가진 사회 조직을 묵인해 왔다. 법제적 장치만으로는 피통치 대상의 절대다수가 존재하는 지방을 통치하기가 어려웠다. 즉, 중앙은 자치 조직을 통치 권력과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보완 장치로 인식하였던 것이다. 더구나 향약은 왕조의 통치 이념인 성리학의 자치 규약이었다. 왕조 입장에서는 향약 장려를 통해 자연스레 교화를 이끌어 낼 수 있었고, 사대부 입장에서는 향약을 시행함으로써 자신들 주도의 향촌 지배 질서를 구축할 수 있었다.
p. 79
향약은 자치 규약을 표방하고 있지만, 규약 중 상당 부분은 질서 유지에 기본이 되는 자기 규제에 해당한다. 향약 시행의 목적도 향촌질서를 안정시키는 데 있다. 원활한 지방 통치를 도모하던 수령들은 이러한 향약의 효용성을 주목하였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중종 연간 김안국과 기묘사림 출신의 수령들이 향약 시행을 통해 효과를 본 적이 있었다. 당시 정부도 지방 통치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림파의 건의에 따라 향약을 간행·배포하였다. 기묘사화 이후 정부 주도의 향약 시행은 중단되었지만, 그 효용성을 주목한 수령들은 개별적으로 향약을 시행하곤 했다.
p. 105
신미양요(辛未洋擾)가 향약 시행의 계기가 된 사례도 있다. 1871년(고종 8) 미국은 1866년에 일어난 제너럴셔먼호 사건의 책임을 묻고, 나아가 통상 교섭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조선 정부가 거절하자 같은 해 6월 강화도를 공격하였다. 압도적인 군사력을 바탕으로 강화도를 점령했지만, 조선군의 완강한 저항 때문에 미국은 강화도에서 물러났다. 당시 집권하고 있던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은 통상 수교에 대한 강력한 거부 의지를 피력하기 위하여 전국에 척화비(斥和碑)를 세우는 등 기존의 쇄국정책을 이어 나갔다. 한편으로 정부는 군사적 요충지에 대한 방비를 강화했는데, 해안에 위치한 경상도 창원도 그중 하나였다.
p. 179
오늘날 향약의 의미는 완전히 퇴색해 버린 것일까?
조금만 눈여겨본다면 우리는 일상 속에서 4대 덕목으로 대표되는 향약 정신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직장에서, 마을에서, 친우들끼리 경조사가 있으면 저마다 힘을 보태 준다. 재난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는 자기일 마냥 두 팔을 걷고 봉사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실현하기 위해 협동 정신을 발휘하기도 한다. 향약의 상호부조와 자치정신이 가지는 실효성을 감안한다면, 우리 주위에서 향약 정신이 가미된 여러 행태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새마을운동과 주민자치가 대표적인 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