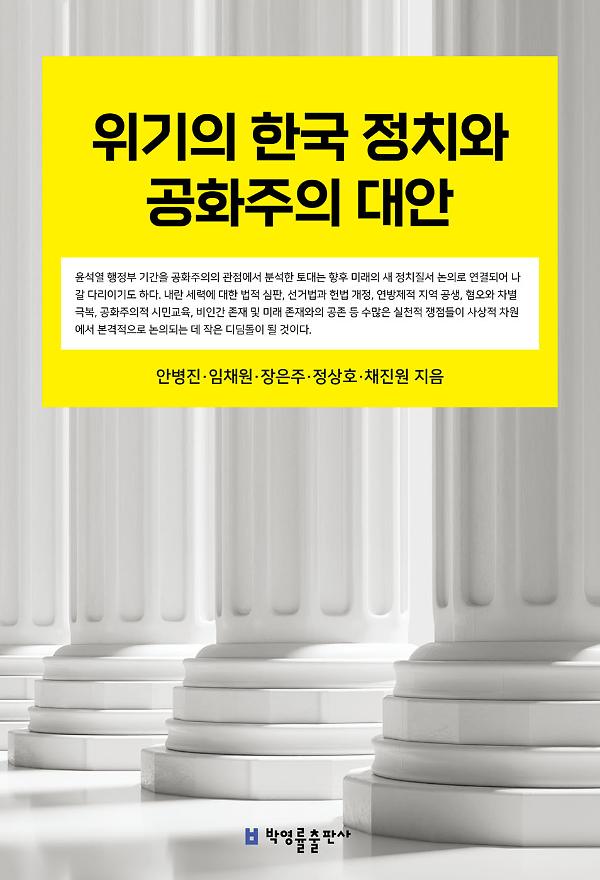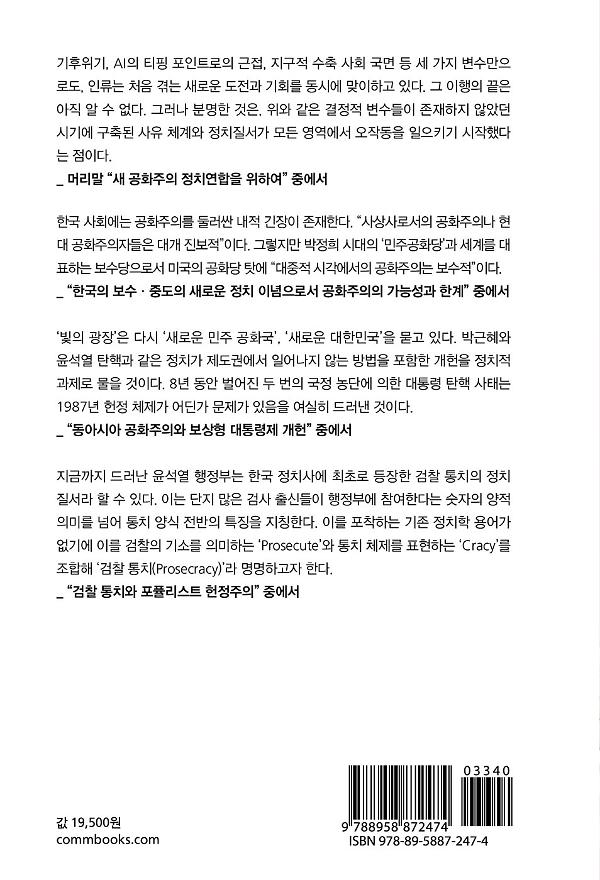무너진 질서 위에서 새로운 공화국을 세우기 위한 사상적 탐색
마침내 내란 정국이 막을 내리고 국민주권정부를 내건 이재명 행정부가 탄생했다. 그러나 선거에서 확인한 민의는 단지 내란 세력 심판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열망으로 집약된다. 한국 정치는 이 어려운 과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며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갈 수 있을까? 이 책은 정권 교체라는 현상 너머, 향후 10년, 20년을 관통할 새로운 사상과 가치와 공고하고 폭넓은 정치연합의 구축을 위한 ‘새 공화주의’를 사상적 등대로 제시한다.
왜 다시 공화주의인가?
기후위기, AI 혁명, 수축사회가 닥쳐오는 전례 없는 대전환의 시기, 과거의 낡은 사유 체계는 모든 영역에서 오작동을 일으키고 있다. 사회주의는 실패했고 자유주의마저 흔들리는 지금, 이 책은 모든 영역에서 자의적 지배를 방지하고 공존공영의 질서를 구축하고자 하는 공화주의의 오랜 사상적 전통에서 대안을 찾는다. 특히 서구 이론의 단순한 수입을 넘어, 동아시아의 사상적 자원과 한국 정치의 구체적 현실에 뿌리내린 공화주의를 모색하며 21세기 문명 전환을 위한 ‘새로운 건립의 사유(Founding Mentality)’를 제시한다.
‘검찰 통치’의 기원에서 새로운 헌정 질서의 구상까지, 위기의 한국 정치를 해부하다
이 책은 단순한 정세 평가를 넘어 한국 정치의 위기를 사상적 차원에서 파헤치며 치열한 논쟁의 장을 연다.
정상호는 최근 보수·중도 진영에서 부상한 공화주의를 진보적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점검하며 사상 투쟁의 서막을 연다. 장은주는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검찰 통치’가 어떻게 한국의 역사적 경로와 정치문화 속에서 출현했는지 그 기원을 분석한다. 임채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동아시아 사상과 접목하여 ‘보상형 대통령제’라는 구체적인 개헌 대안의 씨앗을 제시한다. 참고의 글로서 실린 안병진과 채진원의 글은 각각 검찰 통치의 포퓰리스트적 성격과 진보적 공화주의에 대한 반론을 담아 앞선 논의를 더욱 풍부하고 논쟁적으로 만든다.
이 책이 앞으로 본격화될 내란 세력 심판, 사법개혁과 헌정주의 공고화, 시민 정치 참여 제도화, 그리고 모든 시민의 존엄한 삶을 위한 수많은 실천적 쟁점들이 사상적 차원에서 논의되는 데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