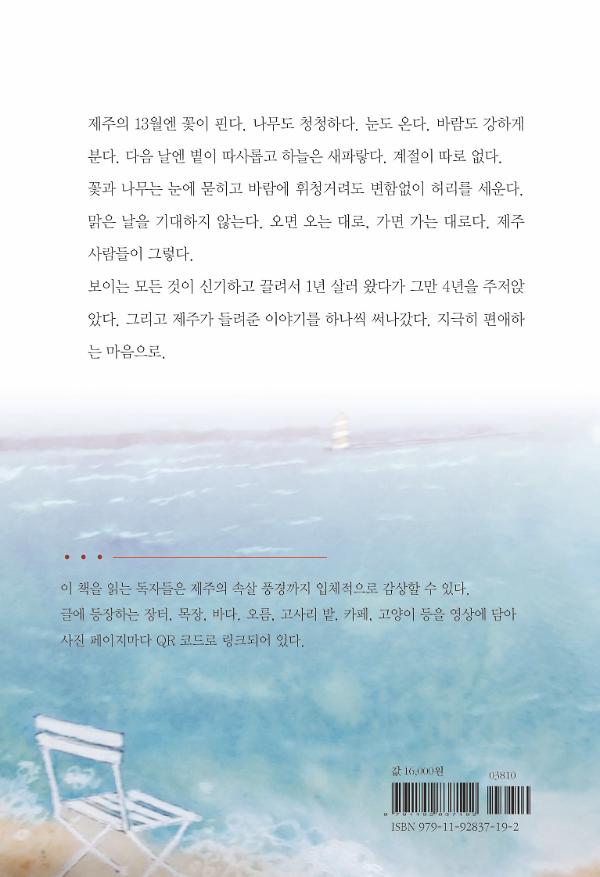구멍이 상처 난 자리라는 생각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었다. 현무암은 그 구멍에 물을 담고 공기를 품는다. 비가 오면 땅으로 스며들어 건천이 돼도 식물이 무성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 생명을 키우는 것이 바로 땅속의 구멍 난 돌이 아닌가 싶다.
미나 여인이 바로 그런 돌이었다.(25쪽)
-〈미나 의상실〉 중에서
언제 소란이 있었나 싶게 줄은 순조롭게 줄어들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기다리는 일이 까마득하게 느껴졌다. 땀을 줄줄 흘리면서 서 있는 사람들이나 나나 서 있는 이유조차 모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사정이 딱한 사람에게 누구도 양보하지 않고 나만 낙오되지 않으면 그만이라고 모른 척할 만큼 대단한 줄서기였을까.
장터 마당에 조그만 나라가 있었다. 시끌벅적해서 정겹고, 의리와 믿음으로 똘똘 뭉치고, 솔선수범하는 사람들이 많던 두부 나라. 그 나라가 한순간 주저앉았다.(36쪽)
-〈두부 왕의 추락〉 중에서
상대방의 조건과 스펙이 월등해서 경쟁할 생각을 접은 사람이나, 실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밀려난 사람이라면 음식점 경쟁에서 맛을 우선순위로 평가한 공정성에 속이 후련한 기분마저 느끼리라. 내가 그렇다. 대리만족한다. 그곳에 가면 사는 동안 받았던 억울한 처사나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던 패배감을 위로받는다.(48~49쪽)
-〈춘자 씨의 ‘과거를 묻지 마세요’〉 중에서
누구나 제 길이 있고, 다들 묵묵히 살아갈 뿐. 그 길이 꽃길만 있거나 흙길만 있진 않으리라. 하긴 꽃길만 걷는다고 마냥 좋기만 할까. 어느 꽃에서 벌이 튀어나올지 모를 일. 흙길이라고 해서 먼지만 일겠는가. 발에 챈 돌멩이가 금덩어리일지도 알 수 없는 일.
보석 언니가 가는 길에서 발부리에 금덩어리가 채이길 바란다는 말은 하지 않겠다. 그 길에 따뜻한 사람, 예쁜 고양이, 시원한 바람 한 줄기, 노래 한 가락이 있어 동행했으면 좋겠다.(83쪽)
-〈‘보석상자’에서 찾은 것〉 중에서
황금향, 레드향, 천혜향, 한라봉… 귀한 대접을 받는 귤들에 관심이 쏟아질 때, 맛이 그만 못해서 관심 밖인 하귤, 빗줄기에 떨어지는 꽃송이를 하나라도 부여잡으려 혼자 아등바등했을 테지. 사나운 바람에 겨우 맺힌 열매가 떨어질세라 노심초사하고, 늘어진 가지가 땅에 닿으면 열매가 상할세라 안간힘을 다했으리라. 열매에 과즙을 채우려 부지런히 수분을 날랐을 뿌리와 가지, 그렇게 키워낸 자식들이 내 앞에 놓여 있다. 어느새 나무에 모성애를 느끼는 나.(162~163쪽)
-〈어린 귤나무와 시인〉 중에서
다음 날 뉴스에서 우려와는 달리 큰 피해 없이 태풍이 빠져나갔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럴 줄 알았다. 새벽에 본대로라면 폭력을 싫어하는 태풍이 분명했으니까. 덩치만 컸지 그악스럽게 달려들어 손톱을 세울 줄도 모르고, 억센 주먹으로 어퍼컷을 날릴 줄도 모르는 바람인 줄 알았으니까. 장난기 많고 외로움을 타서 관심을 끌고 싶어 하는 그 바람은 처음부터 큰 태풍이 되기 싫었던 모양이다. 마지못해 와서는 미적거리다가 열린 창문을 발견하곤 일단 놀고 난 후에 생각하자 했을지도.(215쪽)
-〈태풍도 직무유기를 할 때가 있다〉 중에서
도요새가 내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모래를 뒤적이고 있었다. 오늘의 먹이에만 집중하면서. 먼 여정에 대한 두려움도 없이 한가롭고 태평한 몸짓이었다. 골똘히 보니 새가 부리로 올려낸 것은 자연의 대답이었다. 도요새의 비행은 이제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는…. 만일 저 새가 더 멀리 날기를 포기하고 이만큼이면 됐다고 제주 바다에 머물게 된다면 지구에는 엄청난 변수가 생기고 말 거라는…. 그 변수를 상상이나 해 보았느냐고….(219쪽)
-〈안녕, 도요새〉 중에서
이미 바다와 한 몸인 해녀들은 뭍에서 쉬는 숨으로는 부족한 듯, 바다에 들면 아가미와 지느러미가 저절로 돋기라도 하듯 살아있는 동안 바다를 떠나지 못한다. 아니 죽어서도 바다로 돌아가겠다고 하지 않는가.
뭍의 시간은 늙어가고 병들어가는 시간, 그러나 해녀에게 바다의 시간은 흐르지 않는 시간. 바닷속에선 귀도 어둡지 않고, 머리도 아프지 않으리라. 지팡이도 필요 없이 나비처럼 가벼우리라. 물고기처럼 자유로우리라.(232쪽)
-‘영화 〈물꽃의 전설〉을 보고’ 중에서
“바람에 밀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절로 다릿심을 주어야지요. 아무래도 근육이 붙겠죠. 사람만 그러겠어요? 나무는 뿌리에 힘을 줄 거고 새도 날개에 힘을 싣겠죠. 살아 있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하죠. 바람이 강하니 섬에 사는 생명들은 맞서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섬사람들의 기질이죠.”(248쪽)
-〈바람이 사람을 세운다〉 중에서
어떤 길은 길고양이나 뱀이 다니는 길을 닦고, 허공에 나비와 새의 길을 냈다. 낙타가 다니는 길을 만들 땐 바다에서 젖었던 몸이 버석하게 말랐다. 길은 숨 쉬는 것들하고 관계를 맺고 있었다. 내가 하늘에 낸 길로 이동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러니 길도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가 아닐까. 바다로부터 끊임없이 혈액을 공급받아 움직이는 생명체.(278쪽)
-〈길이 바다에서 태어난다는 설設〉 중에서
‘배롱허게’ 보이는 것도 궁금증을 부추긴다. 해무에 가려 모호해진 수평선, 안개 속인 듯 분명하지 않는 풍경, 베일에 싸인 듯 윤곽이 뚜렷하지 않은 얼굴, 저물녘의 실루엣…. 흐릿해서 더 신비롭고 알고 싶은 세상. 제주에서 알아가는 모든 것들이 그랬다. 제주 사람들의 삶도 마음도, 제주의 역사와 문화도….(285쪽)
-〈일뤠 강생이, 배롱허게 보이는 것처럼〉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