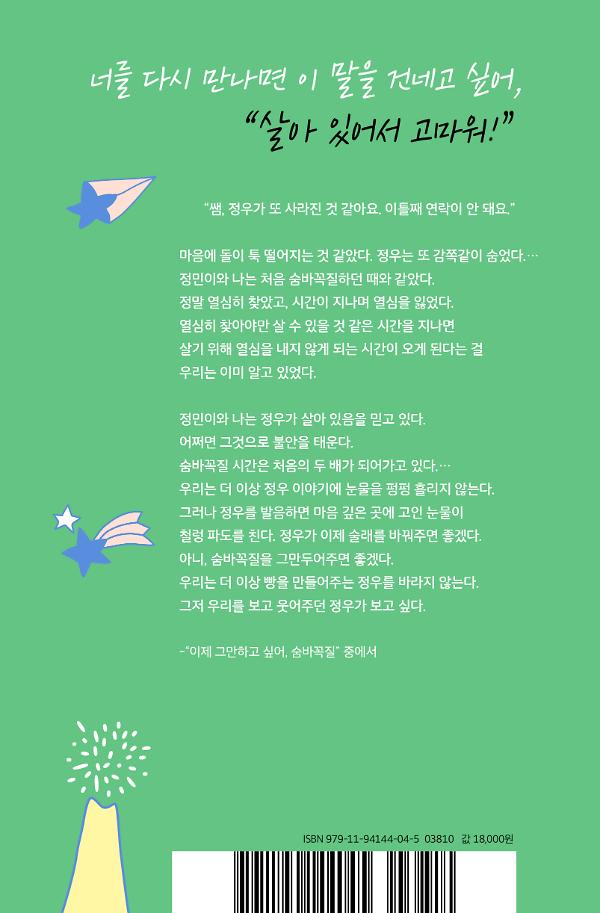우리는 이런 만남을 백 번도 넘게 반복했다. 우리는 둘 다 대단했다. 나는 왜 이렇게 짧게 만나고 가냐고 묻지 않았다. 현오는 왜 게임 그만하라고 말하지 않냐고 묻지 않았다. 나는 그저 현오가 밥 먹고 게임 하기를 원했고, 현오도 게임 하다 밥 먹기를 원했을 뿐이다.
그런데 어느 날 현오가 그 사랑 같지도 않은 사랑을 내게 돌려주었다. 나는 국밥을 먹고 현오는 돈가스를 먹던 날, 현오가 돈가스 한 조각을 내 공깃밥 위에 얹어주었다. -23쪽
사실 아이들을 만날 때는 내가 어른인 걸 자주 잊는다. 심각한 문제를 앞에 두고 같이 울다가도 웃고 먹고 떠든다. 그러다 보면 문제가 희미해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한다. 그 시간에 어른이 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그저 ‘우리’가 되면 된다. 물론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사실 해결될 문제란 건 별로 없다. 결국 문제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인간의 삶이니까. 계속 ‘문제와 함께’ 살아낼 힘을 주는 ‘우리’면 충분하다. -43쪽
수많은 청소년을 만나며 겪었던 일을 또 다시 겪는 경우가 생긴다. 하지만 겪었다고 적응이 되는 건 아니다. 매번 처음 겪는 일처럼 당황하고 놀라고 분주해진다.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은 아무리 겪어도 적응이 안 되는 것일까? 그리고 그런 일 중 최고를 꼽으라면 ‘죽음’이 아닐까. -71쪽
매일 한 명씩 죽는다. 우리의 시선 바깥까지 포함하면 두 명일지 세 명일지 열 명일지도 모를 죽음이 매일 전해져온다. 붙잡아주지 못했다는 자책보다 내가 아는 녀석이 아니라는 위안을 붙잡아야 또 하루가 가능하다.
손잡아주라고 강의하면서, 남의 일은 없다고 말하면서, 나는 끊임없이 남의 일이고 싶어서 돌아서며 내 손은 두 개뿐이라고 변명한다. 살아낸다는 건 매일 이렇게 내 위선과 싸우는 일이다. 나는 이 싸움에서 이긴 적이 없다. 내일은 어떨까? 지지 않을 수 있을까? -120쪽
지금 생각해보면 제이는 내 관심이 적어질 때마다 문제를 하나씩 꺼냈다. 처음엔 제이를 도우려고 거의 매일 만날 수밖에 없었다. 신고하고 거처를 구하고 치료받게 하는 일은 하루도 미룰 수 없는 일이고, 내야 할 서류도 준비해야 할 일도 많았다. 그런데 상황이 조금 안정되고 나니 제이에게만 집중할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이 만나는 시간은 짧아지고, 간격은 넓어졌다. 하지만 제이는 자신에게만 관심을 가져주기를 원했다. -156쪽
사랑은 참 어렵다. 힘들고 괴롭다. 연대는 더 어렵다. 타인의 고통이 건너와 내 마음을 사정없이 비트는 일이라 때론 살이 찢기는 것처럼 아프고, 때론 불이 떨어진 것처럼 뜨겁다. 하루에도 열두 번씩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고, 진짜 ‘내가 미쳤지, 왜 이렇게 사나’ 싶어 주저앉을 때도 많다. 그야말로 속이 썩는다.
그런데도 아직 이렇게 살고 있는 건 아이들이 주기별로 주는 이런 ‘마약’ 때문이다. -18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