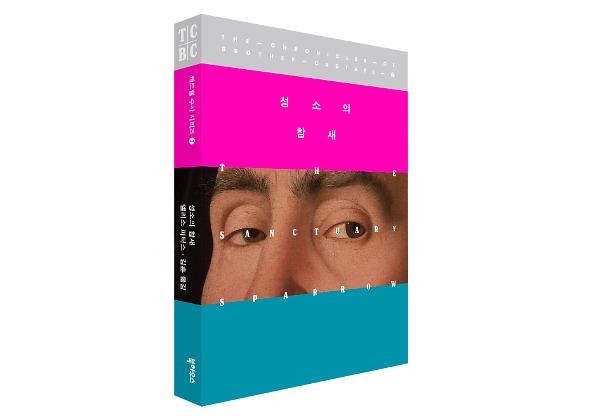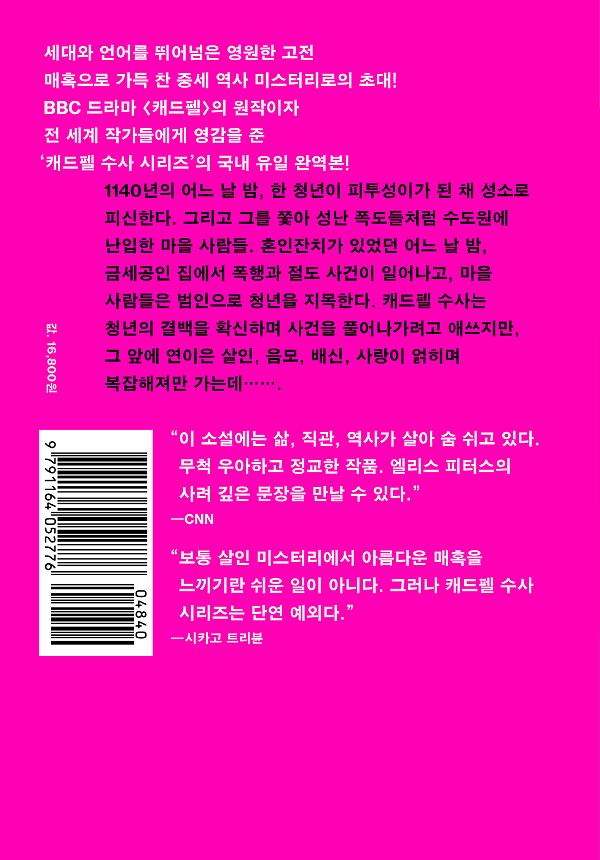청년이 부르르 몸을 떨었다. “하늘에 맹세코 저도 그 영문을 모르겠어요! 막 잠이 들려는데 그 사람들이 고함을 지르며 다리를 건너오더라고요. 무리가 수도원 정문 앞에 이를 때까지만 해도 저랑은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라 생각했죠. 그런데 갑자기 살인이니 복수니 하면서 광대가 범인이라고, 그놈을 잡아 죽여야 한다고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들은 사방으로 쫙 흩어져 숲을 뒤지기 시작했고, 전 그들이 날 찾아내면 그땐 정말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곳에서 달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다들 고함을 지르면서 제 뒤를 쫓아오더라고요. 그렇게 쫓기다가 막 머리채를 잡히기 직전에 이 안으로 뛰어 들어온 겁니다. 하지만 제 죄라는 게 도대체 뭔지 전 정말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거짓말을 한다면 하느님이 저를 맹인으로 만드셔도, 아니 이 자리에서 죽이셔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 36쪽
“저로서는 나리들께 아무것도 숨길 게 없습니다만, 그렇잖아도 몸이 좋지 않은 우리 어머니가 또다시 신경을 쓸까 봐 얘기하지 못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 대한 두려움을 그런 식으로 둘러대며 말을 이었다. “사건이 일어난 곳이 바로 여기예요. 저 문에서 보면 반대편 구석에 있는 금고가 아주 잘 보일 겁니다. 그때 전 저 금고 곁에 서 있었습니다. 자물쇠에 열쇠를 꽂아둔 채 뚜껑을 활짝 열어 벽에 기대어놓고, 곁에 있는 이 선반에다가는 초를 세워뒀죠. 그 불빛 덕에 금고 안이 훤히 들여다보였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때 갑자기 뒤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 돌아보니 릴리윈이라는 그 음유시인 녀석이 문
으로 살그머니 들어오고 있더군요.”
--- 109~110쪽
두 사람에겐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시간이었다. 래닐트가 하루 종일 휴가를 얻었는데 이렇게 일찍 떠나보내야 한다니! 어쩌면 영원히 못 볼지도 모르는데! 릴리윈은 그녀의 팔을 꼭 붙잡고 교구 제단 너머에 있는 어두운 석조 예배실 깊숙한 곳으로 데려갔다. 이렇게 그냥 보낼 수는 없었다! 제롬 수사는 밖에 그대로 서 있었고, 예배당 안에는 두 사람뿐이었다. 이제 릴리윈은 그 예배당을 구석구석 잘 알고 있었다. 현관에 있기가 무서워 예배당 안으로 들어와 처음으로 혼자 자던 날, 혹시 누군가 자기를 잡으러 오지 않나 싶어 두 귀를 쫑긋 세운 채 두려운 마음으로 그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닌 터였다.
--- 147쪽
그러나 이 소식은 이미 주위에 널리 퍼져 있었다. 마독의 배가 다리 밑에 도착했을 때 할 일 없는 구경꾼 열 명가량이 다리 난간 위에 진을 치고 있던 터였다. 시신을 옮기는 사람들이 큰길에 올라 수도원 쪽으로 방향을 틀 무렵에는 구경꾼이 어느새 스무 명으로 불어나 음산한 침묵 속에 그들을 따라 걸음을 옮기는가 싶더니, 시내에 이르렀을 땐 다시 열 명가량이 그 뒤에 따라붙어 있었다. 모두 조용하고 질서 있게 움직였기에 수도원 측에서는 이들을 막을 수 없었고, 결국 쉰여 명으로 불어난 구경꾼들 모두가 들것을 따라 수도원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들것을 넓은 마당에 내려놓으며, 캐드펠은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구경꾼들의 비난과 독선이 목덜미를 무겁게 내리누르는 듯했다. 이들 모두가 적의에 차 있었다. 캐드펠이 그들 쪽으로 돌아선 순간 그의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온 것은, 복수심 가득한 눈초리로 시신을 노려보는 대니얼 아우리파버의 얼굴이었다.
--- 178~179쪽
그의 오른쪽 귀 뒤에 터진 자리가 뚜렷이 드러나 있었다. 특별할 것 없는 상처이나, 그 상처가 생긴 경위를 알지 못하니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는 추측으로 더듬어나갈 수밖에 없었다.
“물에 떠 있는 나뭇가지나 바위 같은 데 스쳐서 생긴 건 아닙니다요.” 마독은 확신을 갖고서 말했다. “암초들이 솟아 있는 이쪽 수역에서라면 또 모를까, 강 건너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제가 보기에, 이건 뒤에서 강타당한 흔적이 분명합니다. 그런 다음 물속으로 끌려 들어간 거예요.”
“그렇다면 살인이라 주장하는 이들의 말이 옳다는 뜻이군.” 라둘푸스 원장이 근심 어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 192쪽
휴는 침묵을 지켰고, 릴리윈은 공포 어린 신음을 발하며 몸을 와들와들 떨었다.
“그 후 강물의 흐름을 차분히 살피며 밤중에 시체를 떠내려 보내기로 마음먹고는, 일단은 오리나무 밑의 물속에 그를 잘 고정해두었을 걸세. 시체가 다른 곳에서 발견되면 다들 그가 익사한 줄 알 거라고 생각했겠지. 그 사람의 양쪽 어깨에 움푹 파인 자국이 나 있던 거 기억하나? 자갈 무더기 곁에 시 성벽에서 떨어진 톱니처럼 들쑥날쑥한 돌덩어리 하나가 뒹굴고 있더군. 그 은화는 회수하지 않아 시체 밑에 그대로 있었고.”
--- 294~295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