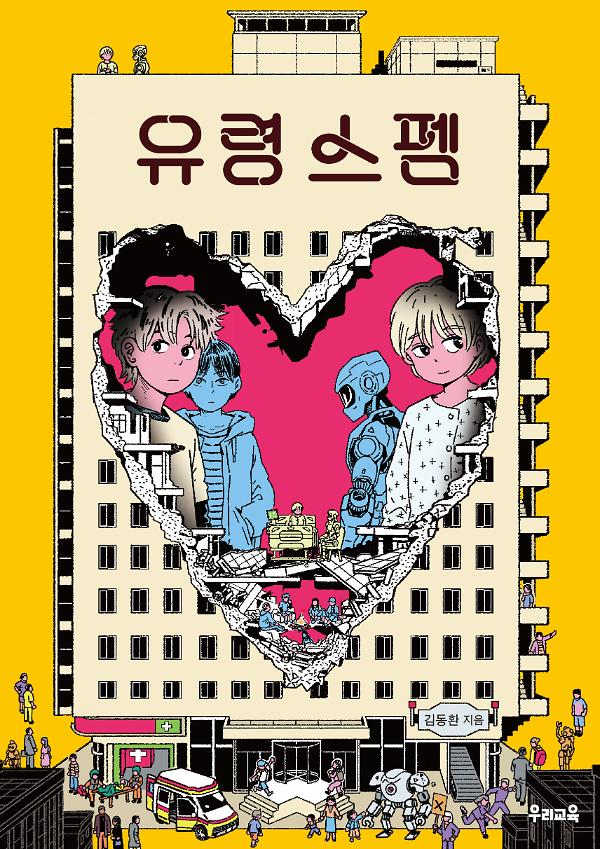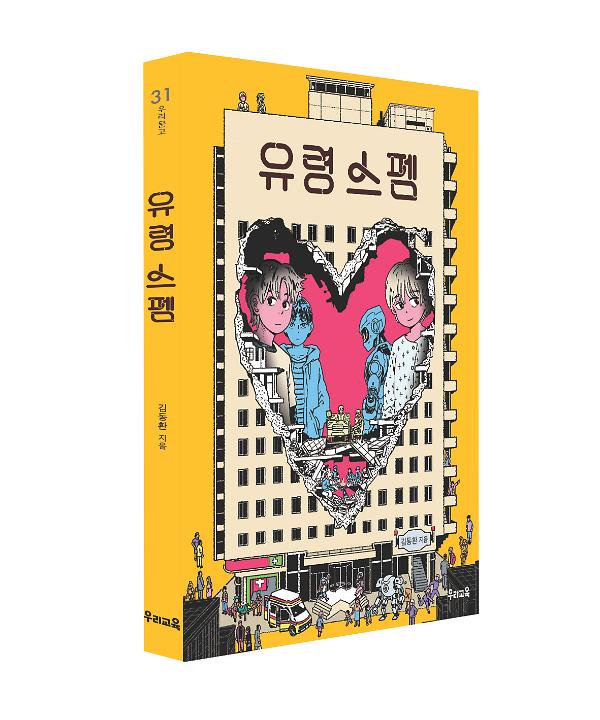p.11~12
성구의 아침 등굣길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었다. 등굣길에 마주치는 스펨 대수가 몇 년 사이 눈에 띄게 늘어났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어쩌면 스펨과 연관됐을지 모르는 테러범의 존재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놈이 이제 학교를 노리기 시작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한 달 전 첫 사고 이후 지금까지 주변부에서만 열 곳이 넘는 건물이 무너졌다. 하나같이 비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지만 전날까지 멀쩡하던 건물이 하룻밤 새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사고가 잇따르자 사람들은 엄청난 불안에 휩싸였다.
p.23~24
빈혈 증세만큼 견디기 힘든 건 거울을 보는 일이었다. 또래들과 달라져 가는 자기 모습이 통증 때문인지, 통증을 덜기 위해 먹는 약 때문인지, 그도 아니면 갈수록 약해지는 마음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이런 마음을 다잡는 데는 옥상 정원이 최고였다. 다만 스스로 위로가 될 때쯤엔 한없이 외로워진다는 게 문제였다. 절망은 이겨 낼 용기를 먹은 바로 다음 순간에 찾아오기도 했다. 유이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용기와 절망 사이를 오갔다.
p.29
“인간이 죽은 사람을 위해 슬퍼하는 건지 자신을 위해 슬퍼하는 건지 모르겠단 뜻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스펨은 땅에 떨어진 꽃잎 하나를 잡으려다 오히려 그걸 땅에다 짓이기고 말았다.
“슬픔은 누굴 위해 일부러 만들어 내는 게 아니야. 그냥 생기는 거지.”
유이가 말했다. 그러고 유이는 잠시 생각에 빠졌다.
“그래, 네 말처럼 그건 남겨진 사람들의 몫일 거야. 자신을 생각하는 슬픔일지도 몰라.”
p.34~35
등하굣길에 스펨만큼이나 자주 볼 수 있는 게 시위대긴 했다. 주변부뿐 아니라 도시 곳곳이 종일 시위대로 들끓었다. 그들은 스펨 때문에 일자리를 잃었거나 아예 일자리 근처에도 가 보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갑자기 국제 뉴스에서나 보던 폭동 같은 게 일어나 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요즘이었다. 적어도 주변부는 그랬다.
동혁은 시위대 사이를 헤치고 간신히 역 입구를 찾아냈다. 그러 는 동안 사람들에게 여러 번 발을 밟혔는지 발가락이 욱신거렸다. 계단을 디딜 때도 좀처럼 힘이 주어지지 않았다. 동혁은 약간씩 다리를 절며 역으로 내려갔다. 시위대 사람들의 함성과 구호 소리가 멀리 다른 세상일처럼 들렸다.
‘나도 졸업 후엔 저 사람들 속에 있게 되겠지.’
동혁은 순간 자기답지 않게 진지하게 생각한 것에 놀라 고개를 저었다.
p.41
‘스펨 인 알리움’을 해석하면 ‘당신 안의 희망’ 또는 ‘다른 세상 에 대한 희망’ 정도가 되는데, 수백 년 전 이탈리아 작곡가 알레산드로 스트리조의 40성부 합창곡에 대적하기 위해 영국 왕실의 기획으로 작곡가 탤리스가 만든 매우 화려한 곡이라는 것 정도였다.
성구가 여기까지 설명하자 동혁이 뭔가 생각난 듯 고개를 들었다.
“인간의 귀로는 구분할 수 없는 정보를 숨기기 좋겠어.”
p.47
“LIS라는 기술이 있어. ‘실리콘 속의 생명체’란 뜻이야. 쉽게 말하면 학습 한계가 없는 진짜 뇌를 스펨에게 달아 주는 거지. 어느 일본 회사에서 시작한 프로젝트였는데, 수십 년 동안 실패를 거듭하다 중단됐어. 만약 이 프로젝트를 누군가 성공시켰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야.”
p.52
유이는 부모님이 섬으로 떠나기 전 어느 날 병원을 나와 집에 간 적이 있었다. 그 집엔 유이가 쓰던 책상도 침대도, 책들도 잡동사니들도 그대로였다. 하지만 그것들은 좁은 방 안에 아무렇게나 놓인 주인 없는 물건들일 뿐이었다. 어느 하나 제자리에 있는 게 없었다. 주인이 없으니 제자리라는 개념도 사라진 거였다.
‘그런 곳을 집이라 할 수 있을까?’ 유이는 그날 도저히 집이라 생각되지 않는 낯선 방에서 끝도 없이 울다 잠이 들었다.
생각하면 집이란 건 그리 단순한 게 아니었다. 엄마 아빠의 잦은 이사로 달라진 건 이사한 집과 물건들이 아니라 유이의 삶이었다.
“집이란 건 원래 없는 거야.”
p.143
“내 생각에 죄책감은 말야. 단순히 미안한 마음이랑은 달라. 죄책감이란 말엔 책임이란 뜻이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남의 불행에 대해 같은 인간으로서, 혹은 여기 함께 사는 사람으로서 책임 같은 게 있다고 믿는 거지. 다신 그런 불행을 만들지 않을 책임. 그런 게 없다면 어떤 사람의 불행은 그걸로 끝나 버리고 마는 거야. 그게 한 명의 일이든 백 명의 일이든 상관없이.”
p.175
“사람이 뭔가를 가지고 싶다고 할 때, 알고 보면 그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많아. 때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걸 찾아내려 애쓰지.”
p.181
“내게 새 친구란 게 어떤 건지 넌 몰라. 난 네가 내 마지막 친구일 수 있다는 걸 알아. 그치만 웬만해선 그런 생각은 안 하려고 해. 그건 새 친구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거든. 내 친구들은 예전에 모두 떠났어. 죽어가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싶은 사람이 어딨겠어. 그들도 날 보면 괴로웠겠지. 아무것도 해 줄 수 없어서. 아무리 내가 괜찮대도 말이야. 그래선지 그들은 날 이미 죽은 사람처럼 대했어. 그들에게 난 더 이상 새로운 걸 만들어 갈 수 없는 사람이 돼 버린 거야. 나에겐 새로 사는 삶이었어. 친구 없이 시작하는 새 삶. 그러고 네가 온 거야. 네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를 거야.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 날 이미 죽은 사람처럼 대하지 말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