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에서 내용을 다 알려주면 독자는 그냥 가버릴지도 모른다. “그 글 봤어?” 누가 묻기라도 하면 “응, 제목만. 내용은 안 봐도 알겠더라”라며 글 쓴  사람 기운을 쏙 빼놓을 수도 있다. 제목 하나만으로 읽을 글과 그렇지 않을 글이 홍해가 갈라지듯 나뉘지는 않겠지만 인터넷 세상에서는 흔한 일이다. 듣자 하니 넷플릭스의 경쟁 상대는 ‘잠’이라고 하더라. 우리 쌀의 경쟁 상대는 ‘닭가슴살’이고. 그렇다면 편집기자의 경쟁 상대는 누굴까 생각해봤다. 이 이야기는 제목에 대한 글이므로, 나의 경쟁 상대는 ‘제목 잘 뽑는 사람’이다. 예를 들어, 이런 제목이 있다고 치자. “반찬이 고민될 때 식당 사장도 활용하는 병원 식단” 내가 독자라면 굳이 이 글을 클릭해서 볼 것 같지 않다. 다 알려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독자와 술래잡기를 한다. 그렇다고 꼭꼭 숨기면 찾는 사람(독자) 입장에서는 재미없다. 보일락 말락 숨겨야 찾는 사람도 의욕과 흥미가 생긴다.
사람 기운을 쏙 빼놓을 수도 있다. 제목 하나만으로 읽을 글과 그렇지 않을 글이 홍해가 갈라지듯 나뉘지는 않겠지만 인터넷 세상에서는 흔한 일이다. 듣자 하니 넷플릭스의 경쟁 상대는 ‘잠’이라고 하더라. 우리 쌀의 경쟁 상대는 ‘닭가슴살’이고. 그렇다면 편집기자의 경쟁 상대는 누굴까 생각해봤다. 이 이야기는 제목에 대한 글이므로, 나의 경쟁 상대는 ‘제목 잘 뽑는 사람’이다. 예를 들어, 이런 제목이 있다고 치자. “반찬이 고민될 때 식당 사장도 활용하는 병원 식단” 내가 독자라면 굳이 이 글을 클릭해서 볼 것 같지 않다. 다 알려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독자와 술래잡기를 한다. 그렇다고 꼭꼭 숨기면 찾는 사람(독자) 입장에서는 재미없다. 보일락 말락 숨겨야 찾는 사람도 의욕과 흥미가 생긴다.
#22-23쪽_외면하는 제목(다 알려주지 않기)
글쓴이가 처음 보내온 글에는 “층간소음 극복, 따뜻한 배려가 있으면 가능합니다”라는 제목에 “이사 가는 이웃에게 손편지를 받았습니다”라는 부제가 달려 있었다. ‘층간소음–이사–손편지’로 이어지는 흐름이라면 구미가 당길 것 같았다. 좋은 이야기일지, 나쁜 이야기일지 한마디로 어떻게든 독자들이 반응할 거라고 봤다. 그 결과, 이 두 문장을 적절하게 섞어서 조합한 제목이 “층간소음 윗집이 이사 후 남기고 간 손편지”였다. 한눈에 봐도 튀는 제목은 아니다. 하지만 제목에 ‘층간소음’이 들어가면 읽힐 거라고 생각했다. 많이 읽히는 키워드라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43쪽_이슈를 담은 키워드(독자에게 신호 보내기)
“개와 고양이… 밤잠 설치게 하는 반려동물은?” “‘촌뜨기 소녀’란 뜻의 이 칵테일을 아십니까?” “아침 공복에 유산소운동, 좋을까 나쁠까?” 기사 제목 가운데 퀴즈형 제목으로 보이는 몇 가지를 추려봤다. 기존에 많이들 알고 있을 법한 사실에 대해 ‘네가 아는 그거 맞아?’ ‘진짜 제대로 아는 거 맞아?’ 하고 의문을 제기해서 독자의 마음을 한 번이라도 흔들어보고 싶을 때 혹은 전혀 뜻밖이거나 몰랐던 사실을 알게 해주려는 의도로 낸 제목임을 알 수 있는 문장이다.
실제 퀴즈를 내는 것은 ‘집중’의 효과를 준다고 한다(수업 시간에 퀴즈를 자주 내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학생들이 집중력 있게 수업을 더 잘 이해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단다). 이전 기사에서 ‘모순’적 표현이 주는 효과도 집중이라고 쓴 바 있는데 여러모로 편집기자는 어떻게든 독자의 관심을 끌어모을 만한 표현을 연구하는 사람들인 듯하다.
#71쪽_유 퀴즈?(독자의 시선 끌기)
학창 시절 한국지리 시간에 배운 대구와는 다른 이미지였다. 대구는 분지 지형으로 여름에 가장 더운 곳이라던데 이렇게 예쁜 숲이 있다니? 경기도에서 나고 자라 대구에 가본 적이라곤 최근 몇 년 두어 번이 전부인지라 전혀 몰랐다. 사진만 보면 영국이나 캐나다, 미국의 어딘가에 있을 법한 그런 공원 같았다. 이런 곳이 대구에 있다니. 그래서 내 진심을 담아 제목을 이렇게 고쳤다. “대구에 이런 곳이?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라고. 그리고 하늘 위에서 찍은 사진을 섬네일로 만들었다. 제목이 아니라 섬네일만 봐도 거기가 어딘지 궁금할 비주얼이었기 때문이다. 나 같은 사람들이 많았나 보다. 37만여 조회에 제목을 뽑은 나도 어리둥절했던 기억이 난다.
#96쪽_끌리는 섬네일(37만여 조회의 비결)
제목 뽑는 일은 고민의 구역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그 구역을 자의적으로 넘어서면 탈이 나기도 하니 어떻게든 그 범위 안에서 지지고 볶아야 했다. 훌륭한 배우는 현장을 탓하지 않는다는 말을 어딘가에서 들었는데, 비슷한 차원에서 글 안에서 어떻게든 좋은 제목을,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나도 애를 쓰는 것이다. 그러니 믿을 것은 글뿐.
뾰족한 한 문장을 짓기 위해 문장과 문장 사이를, 단어와 단어 사이를 찾아 헤매고 글쓴이의 문장에 기대어 제목을 뽑는다. 제목 뽑는 일이 아무리 힘들다 한들 그나마 할 만하다고 여기는 것은 내가 기댈 수 있는 문장이 어딘가에는 있다는 믿음 때문이 아닌가 싶다. 무수히 많은 사람 속에서도 ‘소중한 사람’은 한눈에 알아보는 것처럼, 제목으로 쓸 만한 것이 본문에 반드시 있다는 믿음.
#134쪽_제목이 안 나올 때(믿을 것은 글과 독자)
쇼윈도가 어떤 곳인가. 디자이너가 공들여 만든 최신 디자인 제품을 가장 먼저 소비자에게 선보이는 곳이다. ‘여기는 이런 옷이나 구두를 판매하는 곳이구나’ 하고 각인시키는 것과 동시에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이 ‘한번 입어볼까’ 혹은 ‘신어볼까’ 하는 마음으로 가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쇼윈도의 역할이다.
글의 제목도 그렇잖나. 나의 경우, 기자들이 공들여 쓴 글을 뉴스 가치에 따라 배치한다. 매장으로 치면 쇼윈도에 내놓을 제품을 선별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타깃 소비자에 따라 상품의 진열이 달라지듯, 타깃 독자에 따라 기사 선별을 다양하게 할 수도 있다.
#159쪽_편집기자의 독후감(제목에 별명 지어주기  )
)
K 선배가 있었다. 그때는 회사에서 선배들이 부르기만 하면 그것이 무슨 일이든 긴장지수가 급격히 치솟았다. 특히 K 선배가 부르면 뭔가 실수라도 한 건가 싶어 땀부터 났다.
제목을 정할 때도 그랬다. 내 딴에는 열심히 제목을 고심해서 보냈는데 선배가 ‘보시기에’ 별로였을 때(아마도 내가 이 글을 쓰면서 언급한 그런 이유에서였으리라) 대번에 이런 말이 들려왔다. “이 제목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보겠니…. 이런 거 말고, 제목 다시 뽑아봐.”
그 순간부터 내 안에는 작은 폭풍우가 일기 시작했다. 내가 가진 거라고는 돛 하나가 전부인 뗏목. 이걸 타고 어떻게든 선배가 원하는 문장 앞으로 가야 하는데 쉽지 않았다. ‘내 문장이 제목이 될 수 없는’ 경우의 수를 최대한 줄여야 했다.
#172쪽_제목 10개씩 다시 뽑아봐(문장 감각 키우기)
누군가는 제목을 뚝딱 뽑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목을 짓는 일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경우가 많다. 편집은 기계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편집하는 사람마다 판단이나 스타일이 다를 수 있다(그래도 회사마다 기준에 따른 평균치는 존재한다). 원래 제목보다 더 나은, 읽힐 만한 포인트를 나는 찾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은 발견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편집은, 그중에서 제목을 뽑는 일은 참 생동감 넘치는 일이다. 그 차이를 느꼈을 때 나는 아무도 모르게 호들갑을 떤다. ‘아… (이 사람은) 여기에 방점을 두고 뽑았구나. 나는 왜 이 생각을 못했지?’ 나는 놓쳤지만 다른 사람은 잡아낸 문장을 즐거운 마음으로 음미한다.
#186쪽_탄성이 터져 나오는 제목(제목을 바꿀 때 vs 바꾸지 않을 때)
고민스러운 점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제목을 뽑다 보면 핵심 내용이 아닌 문장을 취할 때가 생기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지, 여러 가지 내용이 나열식으로 등장하는 글에서는 제목은 어떻게 뽑는 게 좋을지, 뉴스가 터질 때마다 언론에서 만들어내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뉴스를 압축적으로 정리해주는 말이라 할지라도 제목에서 계속 쓰는 것이 맞는지, 짧은제목으로 주목을 끌 수는 없는지, 주관적 제목 말고 팩트가 담긴 제목이 더 잘 읽히는 게 아닌지, 눈길을 끄는 제목을 짓긴 했는데 글을 읽은 독자가 허탈해하지는 않을지 등 말하지 않으면 모르지만 일단 말을 꺼내면 편집 일을 하는 누구라도 공감하고 고민되는 그런 내용들이었다.
잘못이나 부족함을 질책하지 않고 ‘나도 그런데’라는 공감을 기본으로 깔고 있는 제목 스터디라 그랬는지 ‘나는 못하겠다’가 아니라 ‘나도 잘할 수 있겠다’는 마음이 조금은 생겼던 것 같다.
#211쪽_이보다 더 좋은 제목은 언제나 있다(제목 스터디)
나는 종종 제목도 문장이라 표현했는데 이 글에 따르면 제목은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마침표를 찍지 않는단다. 문장이냐, 아니냐를 따지려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 나는 제목에 마침표를 찍지 않는 것이 제목의 속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 무슨 말이냐면, 제목에 ‘마침’이라는 게 있을까 싶어서다. 시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제목을 ‘결정’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마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거다. 가장 나중에, 가장 좋은 것을 취하는 것이 제목이지 않을까.
즐거움에 끝이 없는 것처럼 제목에도 끝이 없다. 최종, 최종 선택만이 있을 뿐. 최종 버전으로 지어놓은 제목도 한 시간 혹은 하루가 지나 다른 더 좋은 제목이 떠오르기도 하고, 별로였던 제목이 어느 타이밍에는 딱 맞는 제목이 되기도 하니까.
#229쪽_제목에는 마침표가 없다(최종, 진짜 최종이 있을 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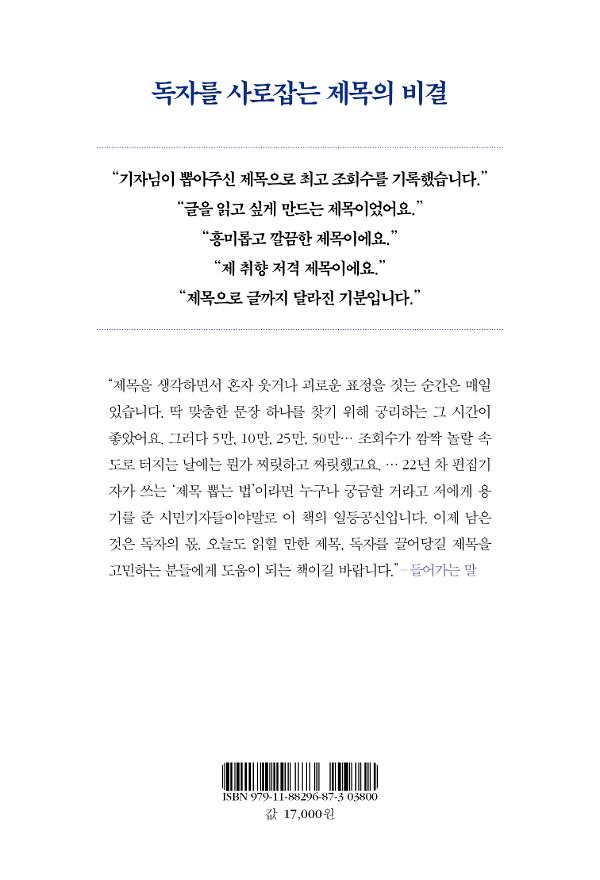

 사람 기운을 쏙 빼놓을 수도 있다. 제목 하나만으로 읽을 글과 그렇지 않을 글이 홍해가 갈라지듯 나뉘지는 않겠지만 인터넷 세상에서는 흔한 일이다. 듣자 하니 넷플릭스의 경쟁 상대는 ‘잠’이라고 하더라. 우리 쌀의 경쟁 상대는 ‘닭가슴살’이고. 그렇다면 편집기자의 경쟁 상대는 누굴까 생각해봤다. 이 이야기는 제목에 대한 글이므로, 나의 경쟁 상대는 ‘제목 잘 뽑는 사람’이다. 예를 들어, 이런 제목이 있다고 치자. “반찬이 고민될 때 식당 사장도 활용하는 병원 식단” 내가 독자라면 굳이 이 글을 클릭해서 볼 것 같지 않다. 다 알려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독자와 술래잡기를 한다. 그렇다고 꼭꼭 숨기면 찾는 사람(독자) 입장에서는 재미없다. 보일락 말락 숨겨야 찾는 사람도 의욕과 흥미가 생긴다.
사람 기운을 쏙 빼놓을 수도 있다. 제목 하나만으로 읽을 글과 그렇지 않을 글이 홍해가 갈라지듯 나뉘지는 않겠지만 인터넷 세상에서는 흔한 일이다. 듣자 하니 넷플릭스의 경쟁 상대는 ‘잠’이라고 하더라. 우리 쌀의 경쟁 상대는 ‘닭가슴살’이고. 그렇다면 편집기자의 경쟁 상대는 누굴까 생각해봤다. 이 이야기는 제목에 대한 글이므로, 나의 경쟁 상대는 ‘제목 잘 뽑는 사람’이다. 예를 들어, 이런 제목이 있다고 치자. “반찬이 고민될 때 식당 사장도 활용하는 병원 식단” 내가 독자라면 굳이 이 글을 클릭해서 볼 것 같지 않다. 다 알려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독자와 술래잡기를 한다. 그렇다고 꼭꼭 숨기면 찾는 사람(독자) 입장에서는 재미없다. 보일락 말락 숨겨야 찾는 사람도 의욕과 흥미가 생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