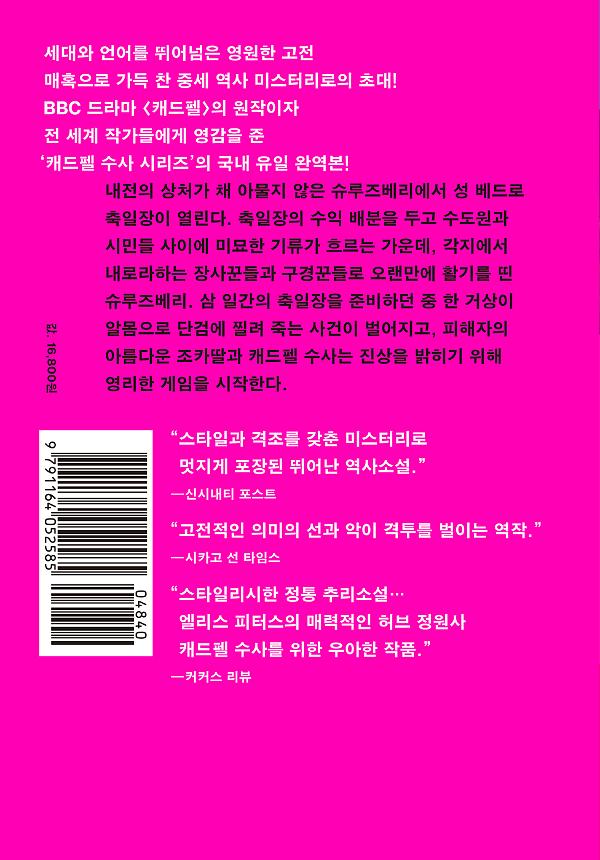“우린 모두 적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살고 있소.” 인생의 절반 이상을 치열한 전쟁터에서 보낸 캐드펠 수사가 대꾸했다. “평화가 좋을 거라고 누가 그러오? 내가 아직 수도원장의 의중을 꿰뚫을 만큼 그 속을 아는 건 아니오. 그분의 약한 면도 본 적이 없지. 하지만 그분은 자신의 소명과 이 수도원에 대해 서약을 했소. 그러니 시간을 좀 드립시다. 당신 경우를 생각해보시오. 내가 당신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했을 때도 시간이 해결해주었지.” 예전 일이 떠올랐는지 캐드펠의 목소리에 웃음기가 배었다. “어쨌든 그리 오래 걸리진 않을 거요! 곧 라둘푸스 수도원장에 대한 판단이 서겠지. 자, 저 포도주 병이나 이리로 좀 건네주시오. 난 이제 들어가서 송아지에게 먹일 약을 저어야겠군. 마지막 기도 시간까지 얼마나 남았지?”
_37~38쪽
사실 토머스로서는 에마의 재산이나 상속에 대해 굳이 자세히 떠들어댈 필요가 없었으나, 외숙부인 동시에 보호자이니 조카에게 좋은 짝을 찾아주는 일에 신경을 쓰는 것이 마땅했다. 어찌 됐든 그런 얘기를 꺼내기도 전에 여기 이 젊은이는 이미 그녀의 얼굴에 반해 있었지만 말이다. 놀라운 일은 아니었다. 그녀는 어떤 기준에 대도 굉장한 미인이었으니까.
65쪽
그랬다. 브리스틀의 토머스는 익사한 게 아니었다. 그가 걸치고 있던 모든 것이 사라졌다는 사실만 보아도 이는 자명했다. 자기 손으로 그 모든 것을 벗어버렸을 리도 없었다. 게다가 무엇보다 죽음의 명백한 증거로, 왼쪽 견갑골 밑에 아주 가느다란 상처가 보였다. 강물에 씻겨 하얗게 된 그 상처는 아주 예리한 단검이 뒤에서 박혀 심장까지 찌른 자국이었다.
_88쪽
캐드펠은 그 시신을 이미 보았고, 에마에게 절대로 그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 되겠다고 마음먹은 터였다. 굳이 그녀만을 위해서는 아니었다. 살아생전 당당한 위엄으로 조카딸의 존경을 받았을 그 사람에겐, 죽어서도 품위 있는 모습으로 기억될 권리가 있었다. 어떻게든 자신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그 어느 것도 피해 가지 않겠다는 그녀의 단호한 결심을 꺾어야 했다.
-104~105쪽
캐드펠이 보기엔 배 안의 모든 것, 특히 좁은 선실 내부는 그야말로 흠잡을 데 없이 정돈되어 있었지만, 그렇다고 에마가 잘못 판단한 것 같지는 않았다. 이런 여행이 벌써 세 번째인 그녀는 비좁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데 익숙했으며, 자신이 개고 챙겨놓은 모든 물건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접어둔 물건의 어느 한쪽이 흐트러져 있거나, 간이침대 밑에 깔끔하게 정리한 수납함의 귀퉁이가 하나만 틀어져 있어도 누군가의 손을 탄 모양이라 생각하고 긴장하기에 충분했다. 그 손의 임자가 누구이건, 선실 안을 깔끔하게 다시 정리해놓다니 실로 가상할 정도였다. 이는 침입자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주 넉넉했으리라는 사실을 뜻했다. 하지만 에마는 도둑맞은 게 전혀 없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 않았는가.
_133~134쪽
캐드펠은 언제나 새벽 기도와 찬미 시간을 지켰다. 잠에 겨워 마지못해 참석한 적은 한 번도 없었으니, 마치 이 시간이 되면 그의 감각들이 대낮에는 불가능한 속도로 빠르게 살아나는 듯했다. 그 어느 때보다 맑은 정신이었다. 침침한 불빛, 사방에 드리운 견고한 그림자, 속삭이는 목소리, 평신도들의 부재, 그 모든 것들이 그를 봉인된 안식처로 이끌었으며, 그곳에 함께 있는 모든 이들이, 활기찬 낮 시간에는 애정을 느끼지 못해 차갑게 대했을 사람들마저 그의 살과 피와 영혼이 되어 그를 보살피는 동시에 그 역시 그들을 보살피는 것만 같았다. 이 순간만큼은 서약의 부담도 짐이 아닌 특권이었고, 한밤의 첫 예배는 그날의 에너지원이 되었다.
_188쪽
에마는 얼라인의 낭만적인 이야기를 들으며 손사래를 치던 기억을 떠올렸다. 서로에게 크나큰 이익이 걸려 있지 않은 이상 토지를 가진 귀족 남자와 상인 출신 여자의 결합은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런 낭만적인 사랑이 정말 불가능한 것일까? 그녀는 더 이상 자신할 수 없었다.
_289쪽
지금까지 이보를 신뢰와 진실로만 대해왔는데, 그가 에마를 가두다니. 도대체 그녀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자신이 아름답다는 건 그녀도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이보가 그녀를 가지겠다는 욕심으로 이런 일을 벌일 리는 없었다. 에마가 아니라면, 결국 그가 원하는 건 한 가지밖에 없었다. 지금껏 누군가 극단적인 사건을 벌이면서까지 줄곧 손에 넣으려 애써왔던 것, 지금 그녀가 지니고 있는 바로 그것 말이다. 그것이 지나가는 곳마다 죽음이 뒤따랐다. 이보의 종복 하나가 살인을 저질렀고, 이보는 그를 그 자리에서 처단했다. 그저 금품을 노린 절도였고, 그 와중에 우발적으로 살인이 일어났다고, 그 종복의 소지품에서 발견된 물건들이 이를 증명한다고, 다른 사람들처럼 그녀도 그렇게 생각했었다. 물론 이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시커먼 구멍을 보지 못한 탓이었다. 그리고 이제야, 그녀는 그 시커먼 구멍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녀를 가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이보였다.
_322쪽
그처럼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힘들게 지켜왔던 것을 포기하고 이보에게 순순히 굴복해버릴까 하는 생각이 잠깐 스쳤다. 지금 느끼는 이 두려움은 현실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굳게 눌러왔던 분노 또한 이제 격하게 에마를 휩싸고 있었다. 이보가 그녀 쪽으로 한 걸음 다가섰다. 그의 미소 띤 눈은 새를 노리는 고양이의 눈처럼 가늘어졌다. 그녀는 둘 사이에 화로가 놓이도록 침착하게 몸을 움직였다. 이보는 이 게임을 즐기는 중이었고, 얼마든지 더 인내할 시간도 있었다.
_327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