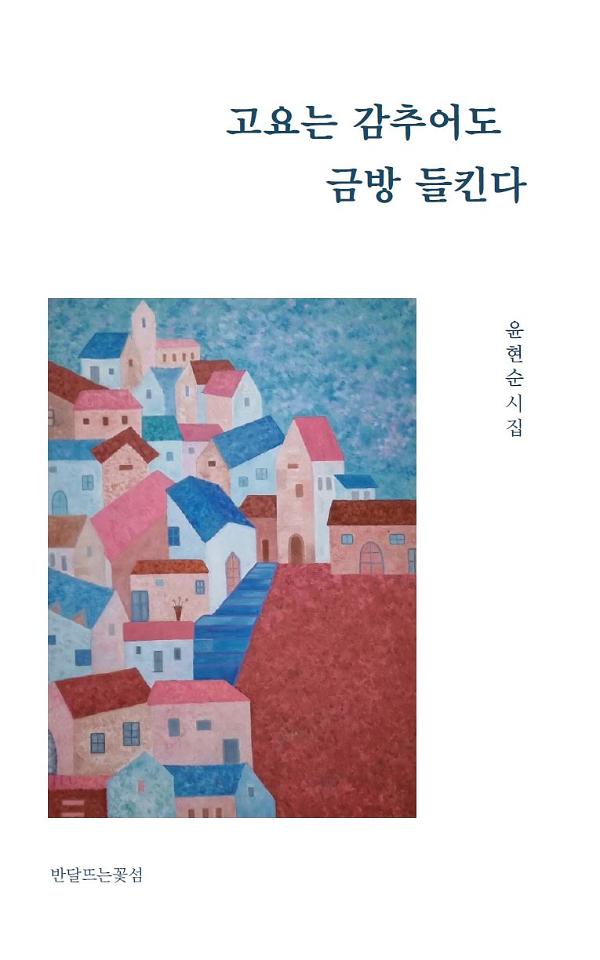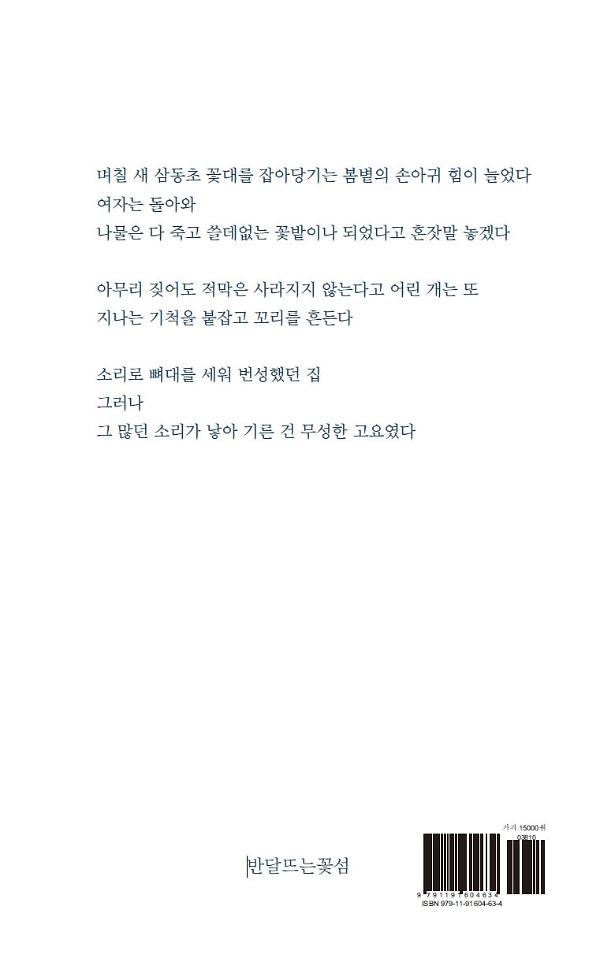윤현순의 시집 『고요는 감추어도 금방 들킨다』를 처음 읽었을 때, 나는 오래된 풍경 한가운데 서 있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 풍경엔 사람의 발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그 위로 시간이 조용히 쌓여 있었다. 그러나 그 침묵은 결코 비어 있지 않았다. 오히려 말보다 더 많은 이야기가 들려왔다. 이 시집은 바로 그런 ‘고요의 언어’를 복원한 책이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 잃어버린 인간의 숨결을, 윤현순은 한 줄 한 줄의 시로 되살려낸다.
그녀의 시는 조용하지만 단단하고, 고요하지만 끝내 흔들린다. 화려한 수사도, 급격한 감정의 기복도 없다. 대신 한 문장마다 삶의 무게가 눌러앉아 있고, 오래된 마음의 체온이 배어 있다. 윤현순의 시는 세상의 중심에서 외치는 목소리가 아니라, 가장자리에 서서 들려주는 낮은 숨이다. 그러나 바로 그 낮음 속에서 인간의 품격이 빛난다.
이 시집을 읽다 보면, 사라지는 것들의 잔향이 오래 남는다. 꽃잎 하나가 흩날리는 장면, 한겨울의 나뭇가지, 낡은 마루 위의 그림자 같은 이미지들이 시인의 언어를 통해 다시 살아난다. 그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견딤의 미학’을 본다. 윤현순은 슬픔을 미화하지 않지만, 그것을 회피하지도 않는다. 그는 상실의 자리에서 다시 살아내는 일을 말한다. 그에게 시는 위로의 도구가 아니라, 존재를 다시 확인하는 호흡이다.
이 시집에는 인간의 상처가 있고, 그 상처를 감싸는 온기가 있다. 고요는 단지 정적의 상태가 아니라, 사랑의 또 다른 형태로 존재한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마음, 사라져도 여전히 남는 감정, 그것들이 이 시집의 전편을 관통한다. 윤현순은 고요를 감춘다고 말하지만, 그 고요는 결국 들킨다. 왜냐하면 그것은 살아 있는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이다. 이 시집을 한 시대의 ‘내면의 풍경화’라 부르고 싶다. 급하고 요란한 세상 속에서 아주 느린 호흡으로 인간의 깊은 자리를 비춘다. 그의 언어는 한 장의 수묵화처럼 절제되어 있으면서도, 그 여백 속에 끝없는 감정의 층위를 담고 있다. 그는 시를 통해 말한다. 진정한 고요는 외면의 침묵이 아니라, 마음이 제자리를 찾는 순간에 비로소 피어나는 빛이라고.
『고요는 감추어도 금방 들킨다』는 화려한 명제나 선언으로 독자를 설득하지 않는다. 대신 시인은 맨 마음으로 다가와 “당신의 고요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묻는다. 그 질문은 오래도록 마음에 남고, 시집을 덮는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된다. 고요란 결국 사랑을 닮은 감정이며, 감추어도 금방 들키는 이유는 그것이 인간의 본래 언어이기 때문이다. 윤현순의 두 번째 시집은 시인의 내면을 넘어 우리 모두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다. 세상의 소음에 지친 이들에게 이 시집은 잠시 멈춰 숨 고르게 하는 쉼표이자, 고요 속에서 자신을 다시 듣게 하는 따뜻한 진심의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