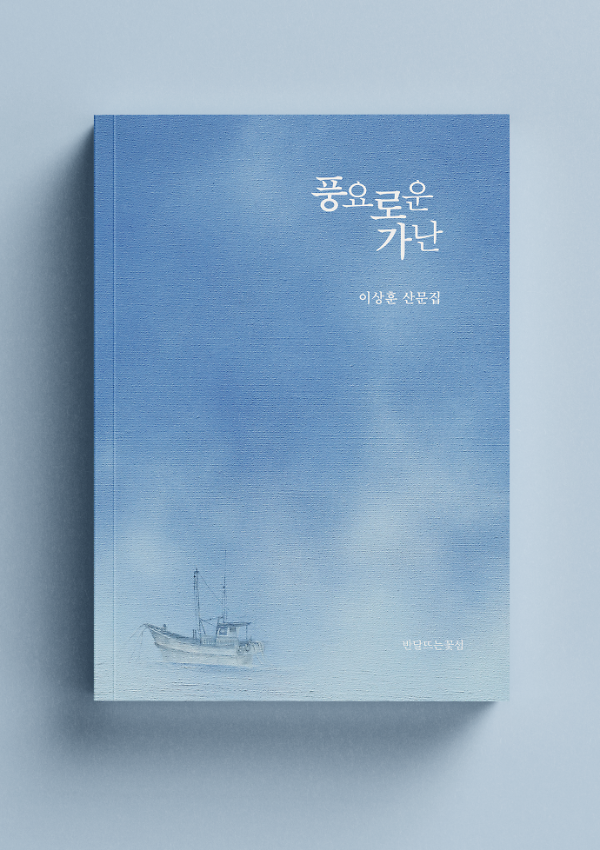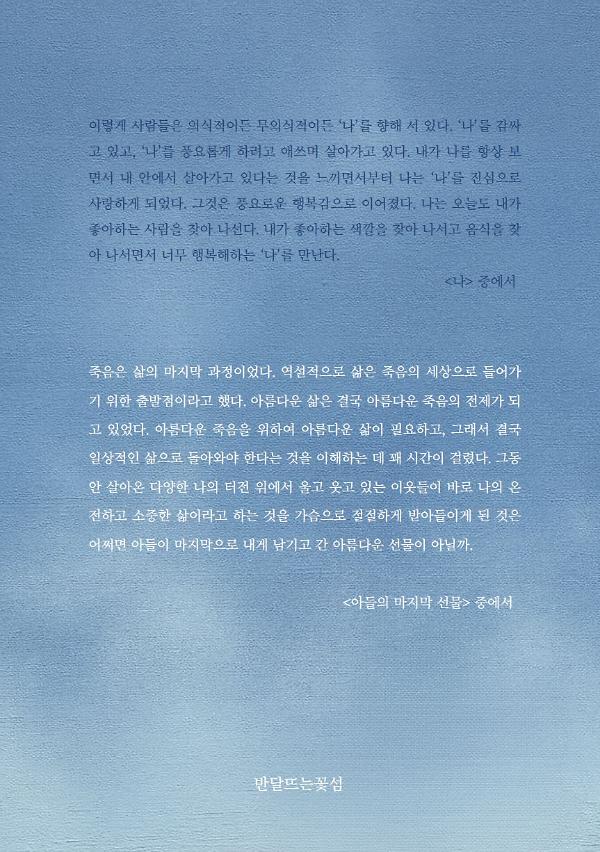삶의 본질은 더 많이 가지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덜어내고, 비워내고, 그 빈자리를 마음으로 채우는 일에 있다. 이상훈의 산문집 『풍요로운 가난』은 바로 그 ‘비움의 풍요’를 증언하는 한 인간의 긴 생애 기록이다. 그의 글은 요란한 철학이나 문학적 기교 대신, 묵묵한 일상의 체온으로 인간 존재의 깊이를 이야기한다. 그는 사람과 사물, 기억과 시간의 결을 손끝으로 더듬듯 더디게 따라가며, “삶이란 결국 사랑과 정성으로 견디는 일”임을 조용히 들려준다. 문장에는 이른 봄의 흙냄새가 배어 있고, 오래된 나무의 나이테처럼 연륜의 결이 서려 있다.
그의 산문은 어느 한 대상을 찬미하거나 미화하지 않는다. 오히려 모든 존재의 내면에 흐르는 ‘인간다움의 무늬’를 찾아내려는 시도에 가깝다. 그는 고통을 피하려 하지 않고, 아픔을 감추지 않으며, 슬픔을 무겁게 끌고 가는 대신 그 안에서 향기를 길어 올린다. 아픈 몸으로도 웃는 사람의 얼굴에서, 늙은 어머니의 손끝에서, 논둑길의 작은 들꽃과 손때 묻은 버선에서 그는 삶의 존엄을 읽는다. 그것은 화려한 문명이나 성취의 언어로는 결코 포착할 수 없는 종류의 아름다움이다. 이상훈이 바라보는 풍요는 눈에 보이는 소유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생산성이다. 그는 건강의 기준을 통증의 유무가 아니라 ‘살아 있음의 품격’으로 재정의하며, 살아 있다는 것의 의미를 물질이 아니라 관계와 정성 속에서 찾는다.
그의 문체는 간결하면서도 깊다. 시처럼 짧은 호흡 안에 긴 여운을 품고, 회상 속에서도 현재의 빛을 놓치지 않는다. 오래된 농부의 손길로 밭을 매듯 문장을 다듬고, 사람의 숨결로 문단을 이어간다. 한 문장이 끝나면 여운이 남고, 여운이 끝나면 생각이 자란다. 그는 말한다. “살아간다는 것은 하루하루의 낡은 반복 속에서 새로움을 발견하는 일이며, 익숙한 것 속에 숨어 있는 성스러움을 알아보는 일이다.” 그의 글을 읽다 보면, 독자는 어느새 자신이 잊고 있던 삶의 표정을 떠올리게 된다. 부모의 뒷모습, 사라진 친구의 이름, 언젠가 다녀온 고향의 골목 냄새 같은 것들이 문장 사이로 서서히 되살아난다.
이상훈의 산문이 특별한 이유는, 그것이 단순한 회상이나 감상의 기록이 아니라 ‘존재의 윤리’를 향한 사유이기 때문이다. 그는 인간이 낮아질수록 더 깊어지고, 비워낼수록 더 충만해진다고 믿는다. 산에서 바다로 흘러내리는 물처럼, 내려감으로써 커지는 존재의 법칙이 그의 삶을 관통한다. 그래서 그의 문장은 언제나 부드럽게 낮은 자리로 흘러간다. 성공보다 성숙을, 높이보다 깊이를, 말보다 침묵을 택하는 태도 속에 진정한 풍요의 의미가 깃든다. 그는 말없이 묻는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는가로 자신을 재고 있는가?”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