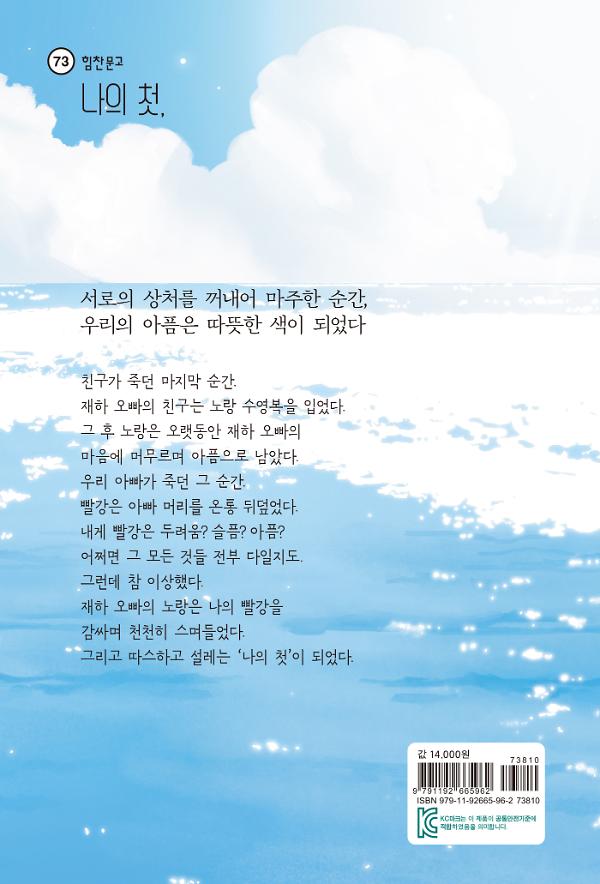책 속에서
P.35~37
“다 봤으면 가.”
이번에도 내 말하고는 상관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내뱉는 명령어였다. 물론 내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괜한 오기 같은 게 발동했다. 나는 가지 않고 그대로 서서 남자애의 손길을 내려다보았다.
“뭘 그리는 거예요?”
거침없이 움직이던 손이 뚝, 소리라도 내듯 멈췄다.
“예쁜 색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왜 파랑이랑 노랑만 써요?”
“무슨 상관이야.”
“그냥, 궁금해서요.”
“물이야.”
“물이요?”
“파랑.”
“아하. 그럼 노랑은요?”
“기억.”
“기억……. 아, 노란 리본처럼?”
“마지막 순간의 노랑.”
“마지막 순간?”
무심코 되뇌다가 아빠의 마지막 순간이 훅 떠올라 버렸다.
뭐였더라? 그날, 그 순간의 색깔은. 세상의 모든 색채를 다 덮으며 오로지 하나만 강렬했다. 빨강. 아빠 머리를 온통 뒤덮었던 색깔.
P.70
영희 이모가 암호처럼 던져 준 그 여덟 글자가 다시금 되살아났다. 오솔길을 저만치 뒤로 두고 뒷산 쪽으로 걸어가며 누구에게랄 것도 없이 말했다.
“힐링이라는 거 말이에요.”
“힐링?”
민주 언니였다.
“네. 그게 필요한 사람에게 해 줄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음……. 잘은 모르지만, 지금처럼 이런 거 아닐까?”
“지금처럼 이런 거요?”
“곁에 있어 주는 거.”
“아…….”
곁에 있는 걸 거부하는 것 같은 사람한테는요? 그런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야 같이 있어 줄 수 있어요?
입안에 맴도는 말들 사이로 인주 언니 목소리가 파고들었다.
“알맞은 거리에서 지켜봐 주는 거.”
P.79~81
“파란색 꽃이 어디 있냐?”
“있거든?”
현미가 총총걸음으로 다가와 탁자 위의 오일 파스텔 상자를 열었다. 그러고는 파란색 오일 파스텔을 집어내 내게 내밀었다.
“영희 이모가 그랬잖아. 사진 속 풍경을 있는 그대로 그리지 않아도 된다고. 빨강이 싫으면 파랑. 파랑이 싫으면 노랑. 노랑도 싫으면 분홍. 네 맘대로 하면 되잖아.”
나는 현미 손에 들린 파랑을 받아 쥐었다.
“싫어서가 아니야.”
“그럼 뭔데?”
빨강에 대한 내 감정이 뭐냐고 묻는 거라면, 나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두려움? 충격? 슬픔? 아픔? 지우고 싶은 기억? 어쩌면 그 모든 것들 전부 다일지도.
여기는 진짜 다른 세계가 틀림없다. 이런 질문 앞에 맞닥뜨릴 줄 알았더라면 엄마가 아르바이트 할 거냐고 물을 때 ‘나!’ 하고 손을 들어 올리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내 마음의 우물에서 빨강을 퍼 올린 사람은 현미가 아니라 재하 오빠다. 재하 오빠의 노랑이 나한테서 빨강을 불러내고 새삼 일깨웠다.
“재하 오빠도 초대하자.”
내 제안에 현미가 기다렸다는 듯 대답했다.
“당연하지!”
민주 언니의 말처럼 힐링은 정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할지도 모른다. 재하 오빠뿐만이 아니라 나와 현미에게도. 현미한테도 잊고 싶은 색깔이 있을까? 만약 있다면 무슨 색일까?
P.135
그러니까 아주머니의 ‘우리 아들’은 재하 오빠의 노랑이다.
재하 오빠가 마지막 순간을 목격해야만 했던 그 친구.
그런데 재하 오빠는 친구의 죽음에 대해 왜 죄책감을 품어야만 했을까.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기에 그렇게 된걸까.
“잘 살아가기를 바라시면, 이렇게 그 애 눈앞에 나타나시면 안 되는 거죠. 아직도 그날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애를 함부로 뒤흔들어 놓으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영희 이모 말에 나도 끄덕였다. 알맞은 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관계. 저 아주머니와 재하 오빠 사이가 바로 그거다.
“재하는 좀 어떤가요?”
아주머니 물음에 영희 이모는 이내 대답하지 못했다. 가슴이 쿵쿵 뛰어 대기 시작했다. 나는 커튼 끝을 꽉 부여잡았다.
“괜찮아요. 괜찮을 거예요. 괜찮아질 거예요.”
주문이라도 외듯 반복되는 영희 이모의 대답만으로는 안심할 수가 없었다. 나는 정원으로 뛰어나갔다. 아주머니가 차에 오르고 있었다. 영희 이모한테 바짝 다가서서 물었다.
“진짜 괜찮아요?”
P.156~157
나는 재하 오빠를 슬쩍 넘겨다보았다. 하얀 스케치북을 앞에 둔 채 이내 시작하지 못하는 듯했다.
나는 오래 생각하지 않고 곧바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재하 오빠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아서 우리 둘만의 일이 되어 버린 순간. 아빠의 빨강을 온전히 이해하게 된 그 순간. 함께였던 해리도 그림에 담았다.
내 마음의 풍경이 아니라 가로수가 늘어선 도로 풍경으로 보일 수 있는 그림.
거기 담긴 내 마음을 누구에게 읽어 주게 될지 모르겠다. 그림과 더불어 내 마음을 읽어 주며 울음이 터져 버리면 어쩌나. 내가 막 울어도 부끄럽지 않을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진지함 속에서 모두가 내 마음의 풍경화를 완성했다. 이제 너와 나의 도슨트를 뽑을 때가 왔다.
영희 이모가 마련해 둔 상자 속에 이름 적힌 종이가 들어 있었다. 한 사람씩 상자에 손을 넣어 종이를 꺼냈다. 내 차례가 되자 조금 두근거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