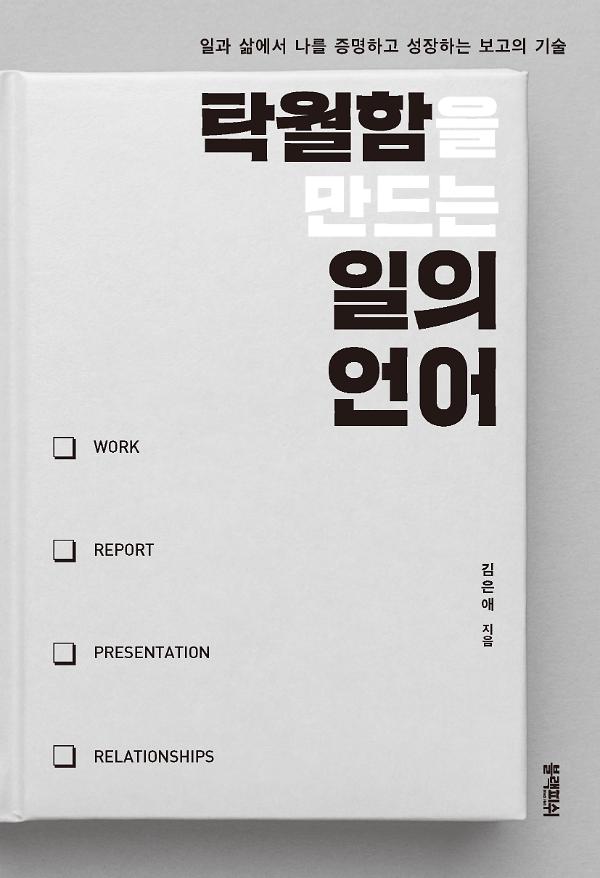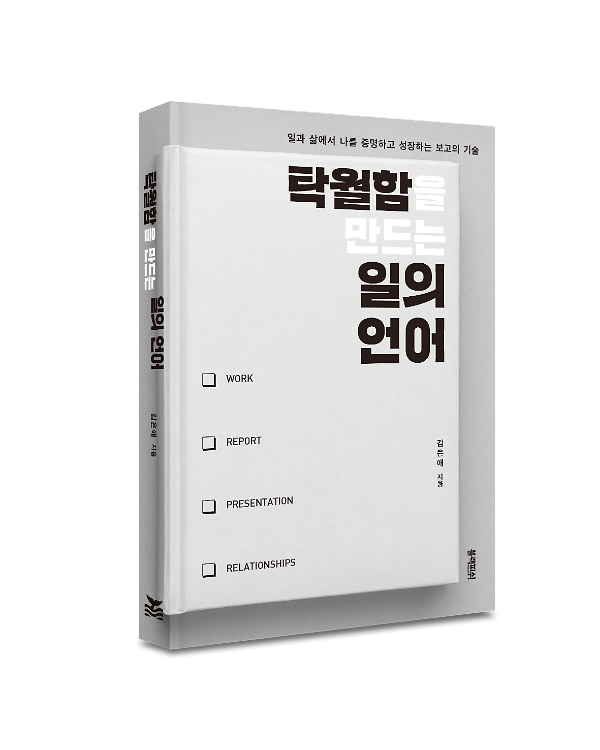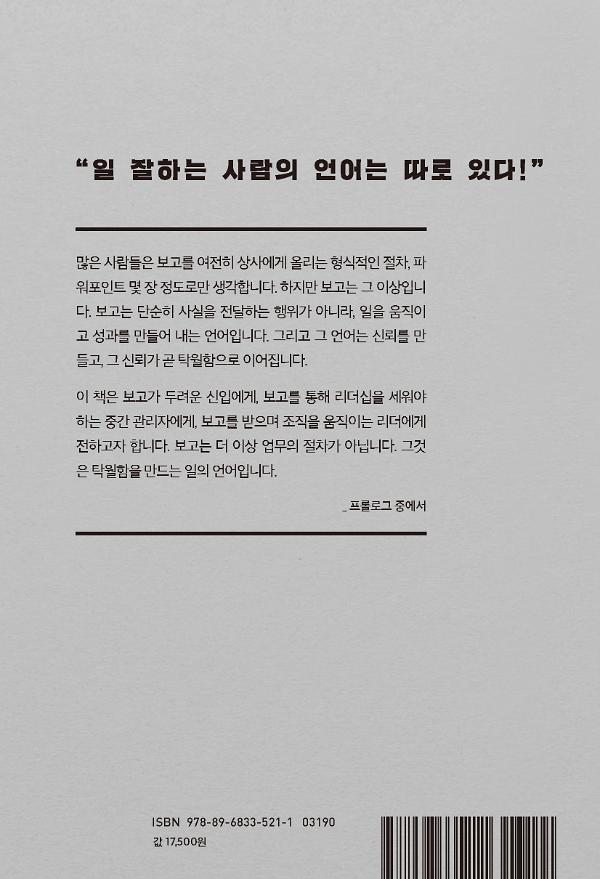AI 시대의 보고자는 달라져야 합니다. 더 이상 단순한 수치 나열이나 복붙(내용이나 형태 따위를 복사하여 붙임)이라고 일컫는 요약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기계가 하지 못하는 ‘판단’과 ‘통찰’을 제공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자동화된 보고가 보여 주는 결과를 토대로, 무엇이 이 결과를 이끌었는지 해석하고, 이 데이터의 맥락과 한계를 짚어 내며, 조직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제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이는 데이터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은 보고가 아니라 사실상 업무 방임입니다. 해석 없이 전달하는 행위는 책임 있는 보고로 볼 수 없습니다.
_〈자동화된 데이터와 인간의 판단력(PART 1. 보고의 정의)〉 중에서
제가 예전에 조직 개편을 보고해야 했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 보고 대상은 아시아 총괄 대표였고, 주제는 ‘왜 지금 조직 구조를 바꿔야 하는가’였습니다. 당시 제 동료들은 각자 보고서를 만들기 시작하며 슬라이드부터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PPT를 열지 않고 먼저 종이를 꺼내 이렇게 써 봤습니다.
· 지금 조직의 문제는 정확히 무엇인가?
· 이 문제는 어떤 데이터와 현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
· 이 문제를 푸는 해법은 무엇인가?
· 그 해법이 왜 이 시점에서 가장 낫다고 판단하는가?
_〈보고서도 설계가 필요하다: 생각을 디자인하는 힘(PART 2. 보고의 글)〉 중에서
생각 없는 보고는 ‘메신저 전달’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상사가 “이번 달 매출 상황 보고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단순히 숫자만 나열하는 보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번 달 매출은 10억 원입니다. 끝.”
이건 정보 전달이지 보고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고자의 생각이 들어가면 보고는 전혀 다른 힘을 갖습니다.
“이번 달 매출은 10억 원입니다. 지난달 대비 15% 감소했는데, 그 이유는 온라인 채널 광고 집행이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다음 달에는 집행 시점을 앞당기면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짧은 차이가 상사에게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한 정보는 ‘그럼 어쩌란 말이지?’라는 질문을 남기지만, 생각이 담긴 보고는 이미 문제와 원인, 그리고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합니다.
_〈모든 보고에 인사이트를 담아라!(PART 3. 보고의 말)〉 중에서
보고는 감정보다는 판단을 위한 대화이지만, 역설적으로 그 판단을 유도하는 데 있어 감정적 설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신뢰, 자신감, 긴박감. 이 세 가지 감정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리더의 반응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CEO 보고의 경우 비서를 통해 CEO의 컨디션, 사무실 분위기 등까지도 살피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보고의 핵심은 데이터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데이터를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해 리더의 ‘결정’을 이끌어 내는 것, 그리고 데이터를 넘어서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야 조직이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_〈데이터를 넘어 리더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술(PART 4. 보고의 사람)〉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