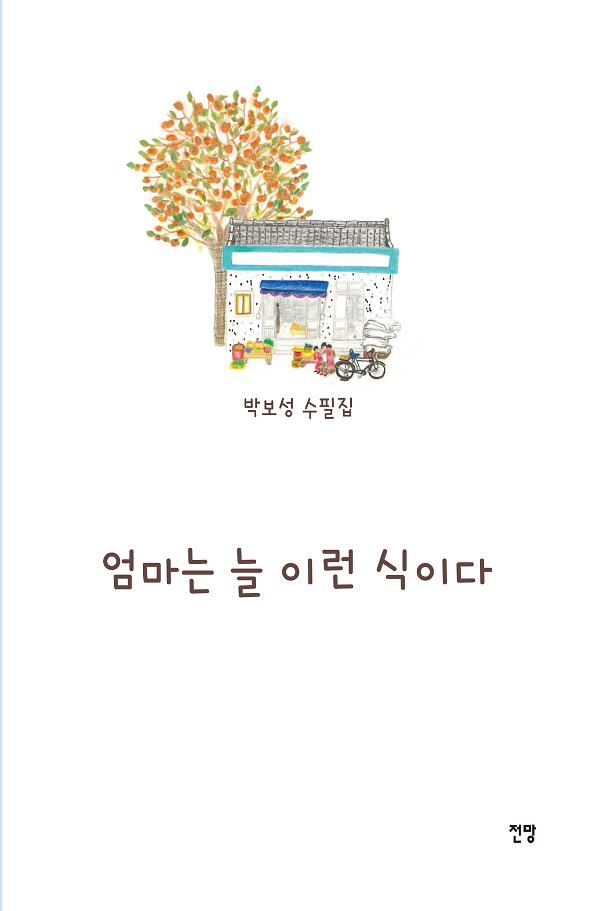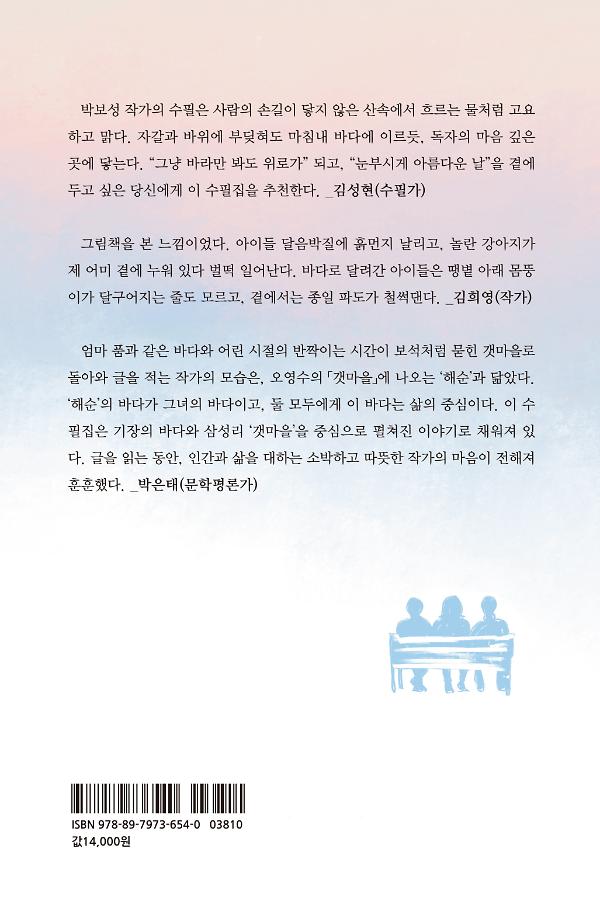난 울고 싶을 때 여기로 온다
― ‘해순’의 바다 그리고 나의 바다
반짝이는 물결 위로 오리배들이 떠다니고 있다. 해변에는 노부부가 맨발로 걷고 있고, 젊은 연인은 손을 맞잡고 젖은 모래 위로 발자국을 남긴다. 모래밭 그늘막 아래 젊은 부부는 여유롭게 앉아, 노는 아이들을 바라본다. 아이들은 모래성을 쌓고, 파도와 장난을 치느라 신났다. 바다의 모습은 비슷한 듯하지만, 늘 새롭다. 이 풍경과 하나 되어 미세하게 달라지는 바다를 늘 바라보는 이가 있다. 청동상의 그녀는 이 바다에서 태어나 바다와 함께 성장했다. 물옷을 입고 첨벙 뛰어들던 바다의 품이 그리워 이곳을 떠났다가도 다시 돌아왔다. 이곳에 대한 마음이 나와 많이 닮은 그녀가 난 좋다. 그녀의 고향은 일광 이천 포구의 갯마을이다.
나의 그녀는 오영수 소설 「갯마을」 주인공 ‘해순’이다. ‘덧게덧게 굴딱지가 붙은 모 없는 돌로 담을 쌓고, 낡은 삿갓 모양 옹기종기 엎드린 초가가 스무 집 될까 말까?’로 소설 속에 그려진 이천 포구는 조그만 어항이다. 동해선 일광역이 생기기 전에는 주말에도 한적한 곳이었다. 늦은 오후 당집 뒤 언덕배기에 올라 선착장과 일광 바다의 풍경을 내려다본다. 멀리 해수욕장에서 물싸움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강송교 아래 밀물의 행렬 위로 눈부신 윤슬, 선착장 배 위에서 낚싯대를 던지는 사람, 바람에 이리저리 쓸려가는 고목의 연초록 나뭇잎들. 어느새 그림 같은 풍경 위로 황금빛 물감이 한 방울 스며들면, 눈앞에 드리워진 고목 사이로 검붉은 석양이 번진다. 둥근 달이 떠올라 검은 바다 위로 물비늘이 번들거리면, 꽹과리 소리에 해순과 아낙네들이 멸치 후리* 막으로 달려가는 달밤이 떠오르곤 한다. 언덕배기에 남은 당산나무와 당집은 소설 속 갯마을 풍경을 아직도 고스란히 담고 있다.
모래밭에서 바닷바람에 새까맣게 그을리며 지내던 어린 시절. 노 젓는 나무 보트는 탈 엄두도 내지 못했고, 알록달록 예쁜 비닐 튜브와 비치볼도 없었다. 아버지가 구멍을 때워 준 커다란 검정 고무 튜브 하나뿐이었지만, 눈뜨면 바다로 달려갔다. 튜브를 베고 누워 모래찜질하고, 모래 공을 만들어 놀기도 했다. 멋진 모래성을 만들고 싶어서 해초와 조개껍질을 줍고 마른 모래를 퍼 나르며 분주하게 바닷가를 돌아다녔다. 바다에서는 튜브를 타고 누워있기도 하고, 매달려 물장구를 치기도 했다. 바다 위로 솟은 갯바위에 의지해 파도를 느끼는 것이 좋았다. 갯바위에 붙은 해초와 조개처럼. 출렁대는 바닷속에서 바다가 되는 편안함을 느꼈다.
‘해순’처럼 나도 이 바다를 떠났다. 이곳을 떠나 더 넓은 세상에 가면 더 큰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믿었다. 떠날 때는 몰랐다. 꾸덕꾸덕해진 미역에서 풍기는 짠내와 강과 바다가 만나던 곳에서 풍기는 물비린내가 눈물겹게 그리워질 거라고는. 갯벌 위로 조개가 쏘아 올리던 물총, 작은 구멍으로 달아나던 작은 게, 파도에도 쓸려가지 않고 남아있던 모래성, 밀물이 모랫바닥에 새긴 물결무늬, 수평선 위로 스며들던 분홍빛 노을이 얼마나 날 행복하게 했는지 여기를 떠나보기 전까지는 몰랐다.
나도 다시 이곳으로 돌아왔다. 바다가 보고 싶은 마음이 문득 들면 집을 나선다. 갈매기들이 몸 단장하며 하루를 여는 이른 아침에도, 달도 없는 깜깜한 하늘 위로 별들만 희미하게 반짝이는 밤에도, 따사로운 햇살에 부드러운 바람이 일렁일 때도, 우산도 소용없는 폭우가 몰아치는 날에도 나는 바다와 만난다. 가까이 곁에 두고 있지만, 늘 그리운 바다. 이곳을 떠난다는 생각을 이제는 할 수가 없다.
내 든든한 뒷배. 언제나 내 편이 되어줄 존재. 그래서일까, 난 울고 싶을 때면 이 바다로 온다.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슬픔이 차오를 때 여기로 달려온다. 삶이 뒤엉켜 어디로 가야 할지 답답할 때도 이 수평선을 바라본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텅 빈 마음을 안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도, 오랫동안 묻어뒀던 아픔이 날 뒤흔들 때도, 해결되지 않는 상황으로 숨이 막힐 것 같은 순간에도 이 바다로 향했다. 넘실거리는 바다와 끝도 없이 밀려오는 파도에 내 온 마음을 맡긴 채, 그저 바다 앞에 하염없이 앉아 있었다.
어스름이 주위에 깔리고 등대 불빛이 깜박이면, 나갔던 배도 돌아오고, 꽉 차서 답답하던 내 마음에도 조금은 틈이 생긴다. 사위가 짙은 어둠 속에 잠기고, 높아진 파도가 배를 삼키려 달려들어도 포구의 등대 불빛을 만나면 안심이 되는 것처럼, 난 이 바다 앞에 앉으면 언제나 조용한 위안을 얻는다.
*후리: 후릿그물, 강이나 바다에 넓게 둘러친 후에 그물 양쪽에서 여러 사람이 끌줄을 잡아당겨 물고기를 잡는 큰 그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