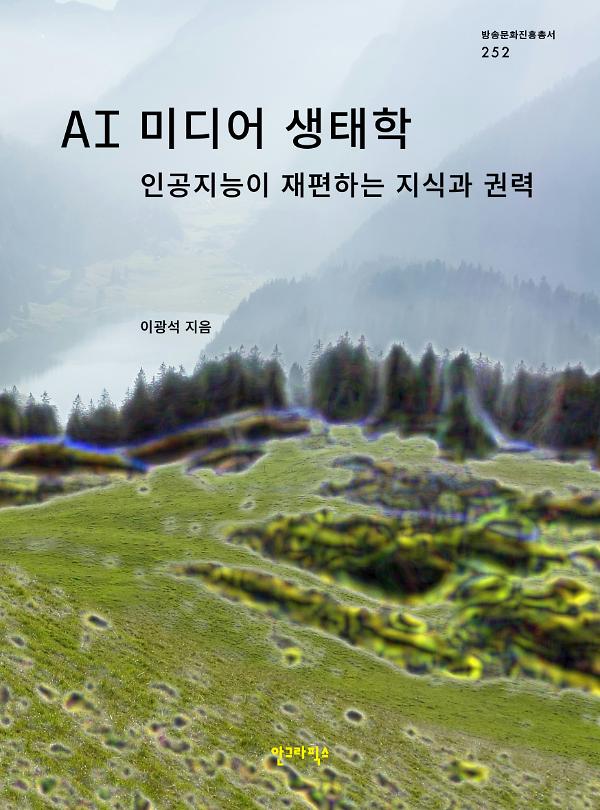기술 숭배의 시대, AI의 인권·생명적 지위를 다시 묻다
인공지능과 미디어 기술은 지금 우리 사회와 삶, 문화 전반을 빠른 속도로 바꾸고 있다. 하지만 기술 발전을 맹목적으로 낙관하거나 혁신만이 최선이라고 믿는 ‘테크노 낙관주의’와 기술 숭배의 분위기가 사회 전반을 지배할수록, 우리는 쉽게 “기술만이 해결책”이라는 착각에 빠진다. 이 책은 기술 그 자체만을 사회 혁신의 중심으로 여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그리고 도구로서의 기술이 사회적·생태적 책임 앞에서 어떻게 재구성되어야 하는가를 근본적으로 질문한다.
‘AI 미디어 생태학’은 기술이 마치 신앙이나 새로운 사회 질서의 대명사처럼 추앙받는 풍토를 바로잡으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기술의 진보는 분명 인류의 중요한 업적이지만, 이로 인해 지구 전체가 ‘인류세’라는 위기 국면에 놓였다는 점을 외면할 수 없다.
책은 “기술이 곧 답”이라는 무비판적 접근을 뛰어넘어, 과연 인공지능이 왜, 어떻게, 누구를 위해 쓰이고 있는지 묻는다. 그리고 AI 시대의 혁신이 진정 공동 번영으로 이어지려면, 기후위기와 생태적 불평등 같은 현실 앞에서 기술과 인간 모두가 겸손해야 하며, 기술 역시 생태주의적 시각에서 다시 설계·사용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특히 생태주의적 접근은 AI와 미디어 기술 인프라의 이면을 낱낱이 보여준다. AI의 연산은 막대한 에너지 소비와 탄소 배출을 수반하며, 희귀 광물의 무분별한 채굴과 노동 착취, 독성 폐기물 등 우리가 평소 직면하지 않는 문제까지 주목하게 한다. 책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이 비물질적이며 청정한 미래산업’이라는 현수막 뒤에 감춰진 현실적 물성과 사회적 비용을 직시하는 것이 진정한 생태 전환의 출발임을 지적한다.
『AI 미디어 생태학』은 “기술을 맹신하는 순진한 미래 낙관주의”와 “기술은 결국 파국을 부르는 숙명”이라는 이분법 그 자체가 더는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한다. 이제 인공/자연, 생명/기계, 물질/비물질, 실제/가상 등의 이분법적 경계를 재배열하고, 다양한 요소들이 어떻게 복잡하게 얽히고 있는지 새롭게 바라보기를 요청한다.
미디어와 기술이 변화의 최전선에서 끼치는 혼종적이고, 복잡화된 영향, 그리고 그 결과 사회가 직면하는 환경 파괴, 데이터 불평등, 사회적 양극화, 노동의 위계화 등의 문제를 풀 실마리는 “기술 자체의 속도와 무차별 적용을 조절하고, 생태와 사회의 조화로운 공생을 도모하는 것”에 있다. 오늘의 AI 혁신이 기술 그 자체가 아닌 “시민과 지구 모두의 지속가능한 미래 만들기”와 연결될 수 있도록, 모두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