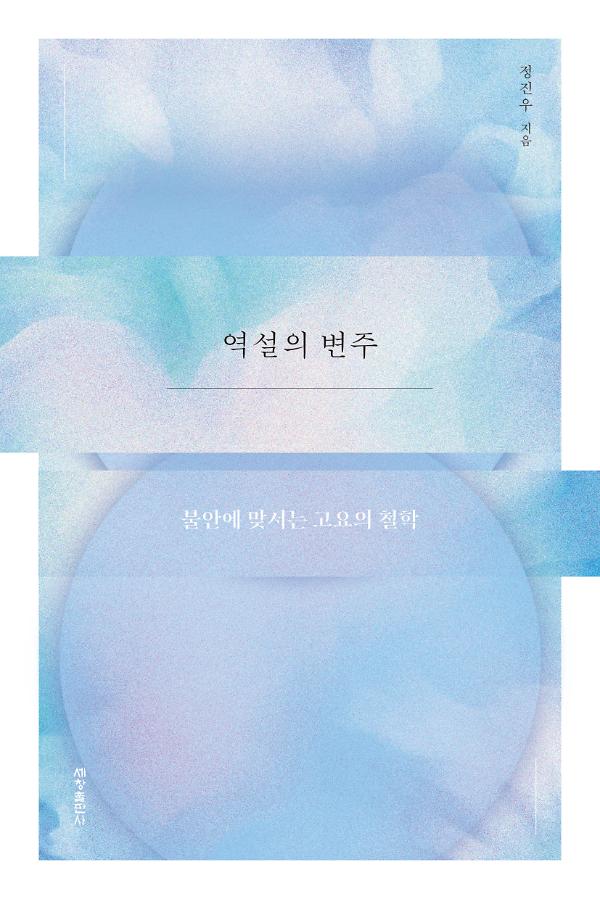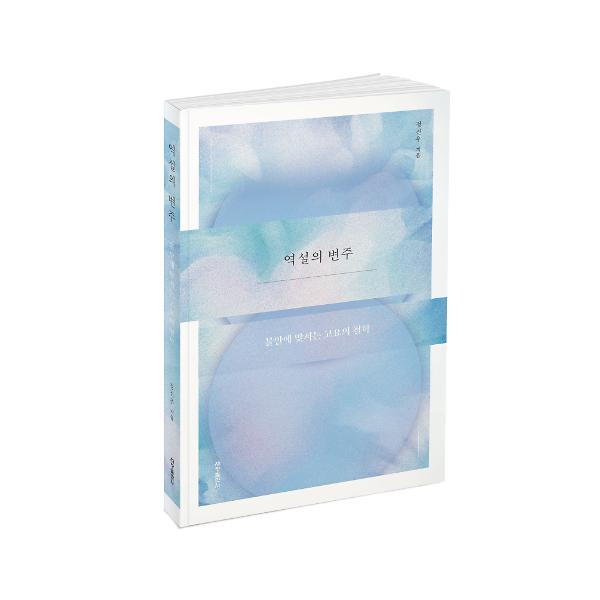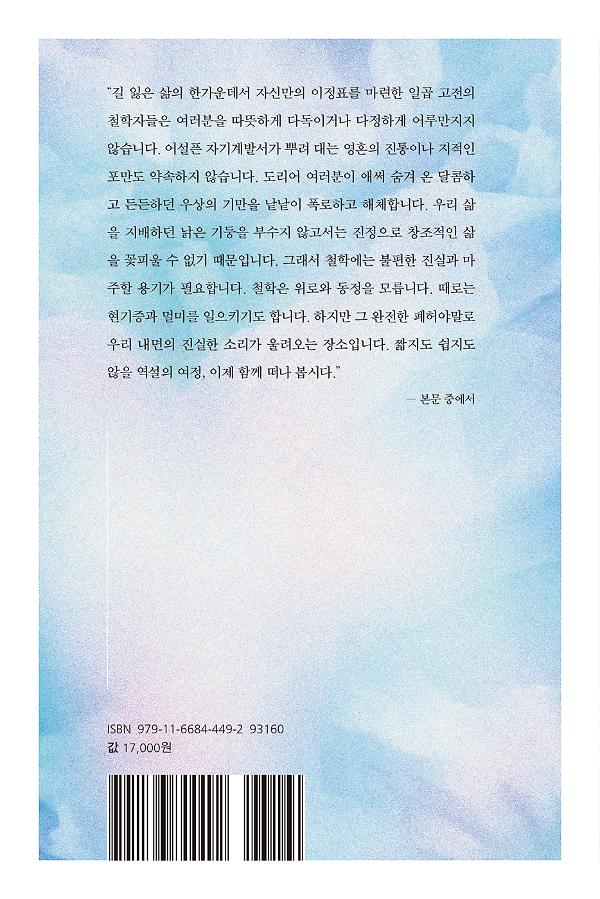p.6
이 강의의 제목이 『역설의 변주: 불안에 맞서는 고요의 철학』인 이유도 그것입니다. 죽음의 불안과 삶의 고통은 우리를 위험한 방황으로 데려갑니다. 하지만 그곳은 진정한 자신과 고요하게 독대하는 초월의 공간, 시끌벅적한 일상에서 벗어나 내면의 소리를 경청하는 침묵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깊은 불안이야말로 참된 자유의 터입니다. 우리는 그 한가운데서 인간 삶의 깊이와 넓이를 입체 적으로 푼 일곱 권의 현대 철학 고전의 지혜를 경청할 것입니다.
불안이라는 실존의 감정을 깊은 철학적 사유와 연결하여 각자가 자기 삶의 뜻과 길을 창조하도록 말입니다. 이 강의는 그 일곱 길을 '역설'이라는 주제로 묶어 갑니다. 인간의 삶은 관계일 수밖에 없고, 관계의 진실은 뒤얽힘에 있으니, 아슬아슬한 그 외줄타기가 불안을 초월하는 자유의 길이라는 뜻에서 말입니다.
p.30-31
성직자는 병든 자들의 고통을 위로하는 '연고와 향유'를 들고 다닙니다. 질병을 치료하려면 고통의 원인을 진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직자들은 질병을 치료하는 대신 상처 난표피에 마취 연고만 발라 줍니다. 따지고 보면 고통을 일으킨 자도 그들이고, 고통을 위로하는 자도 그들입니다. 무력함을 미화하여 고통을 유발하고, 그 고통을 치유하려 다시 무력함을 긍정합니다. 병 주고 약 주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꼴입니다. 그러한 자기기만적인 거짓 치료가 그리스도교계의 본질입니다. 성직자는 그러한 거짓말로 인기를 얻고, 그러한 인기로 사람들을 지배하며, 그들의 지배로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고, 그러한 왕국에서 타락한 권력을 향유합니다. 고통의 책임을 외부로 전가하는 그들의 적대적인 위로의 방식은 당장의 고통을 다스리려 목숨을 저당 잡히는 돌팔이 의사의 거짓 치료에 불과하다고 니체는 고발합니다.
p.58
반역자나 혁명가처럼 군중과는 다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조차 실은 자신의 가치관이 반영된 새로운 대안사회(보편적인 삶의 방식)를 창조할 따름입니다. 자기를 상실한 사람들은 군중들의 가치를 내면화하고, 그들의 평균점과 비교하며 자기 삶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키르케고르는 '군중' 속으로 수평화된 그러한 개인을 자기만의 무한한 존엄과 가치를 내팽개친 '타락한 개인'으로 규정합니다.
너도나도 아닌 익명의 추상적 유령들 속으로 희석돼 버린 '개인의 종말'이라고 말입니다.
p.102
그렇다면 『존재와 시간』은 어떤 점에서 현대를 대표하는 정신이 되었을까요? 『존재와 시간』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존재'와 '시간'이라는 용어부터 설명해야겠습니다. 철학에서 '존재'나 '시간'이라는 용어는 일상적인 의미와는 전혀 다른 뜻으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철학에서 '존재'는 그저 눈앞에 있는 사물들의 '있음'(연필이 있다)이나 그것들의 속성인 '이다'(연필은 빨간색이다)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그저 시계가 알려 주는 표준화된 '시각'(지금은 12시다)이나 과학이 말하는 사물들 사이의 물리적 '거리'(지하철은 도보로 15분 거리에 있다)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존재와 시간』을 그런 일상적인 의미로 읽으면, 그 깊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제목의 혁명적인 선언도 제대로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p.217-218
프롬은 분리불안을 극복하는 완전한 합일은 자기망각, 자기부정, 자기외화의 방식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이 결합하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일시적인 합일이 아니라 지속적인 안정을 갖기 위해 서는 각자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함께 결합할 수 있는 '사랑'의 계가 필요합니다. 그는 그것을 '독립(따로)과 통합(함께)의 역설'이라 부릅니다. 이는 매우 신비로운 통일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사랑은 각자의 개성을 지양하고, 두 인격이 한 인격으로 통일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갈등의 뿌리가 되는 차이를 줄여 언젠가는 영원한 평화에 이르러라는 상투적인 주례사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같음의 강박이야말로 진정한 갈등의 뿌리입니다. 같을 수도 없고, 같아질 수도 없는 두 인격을 어떻게든 얼버무리려는 그런 순진한 생각이 '사랑의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