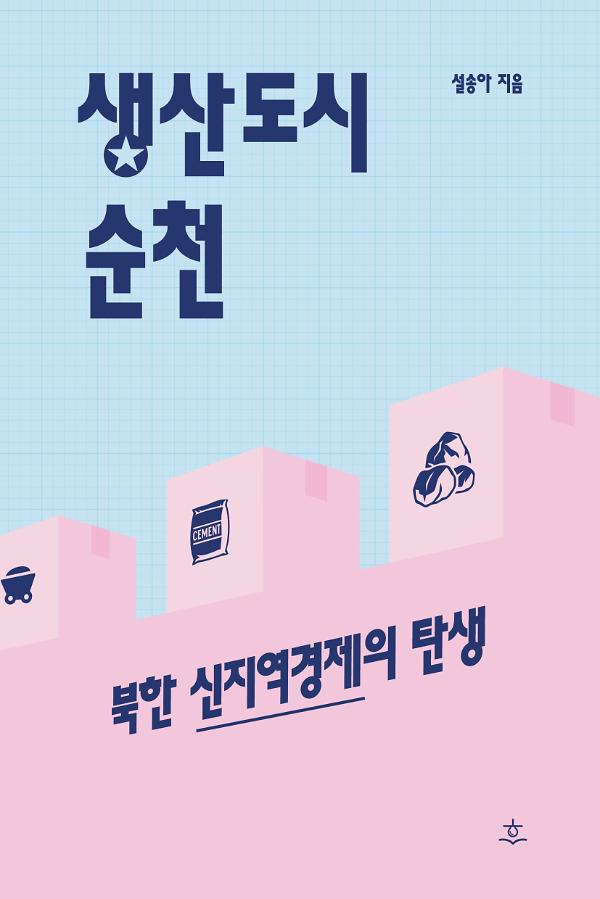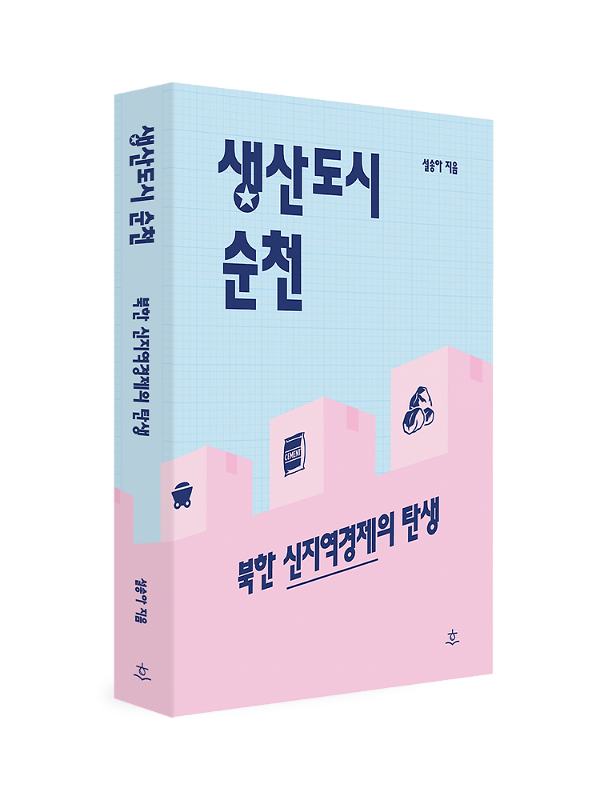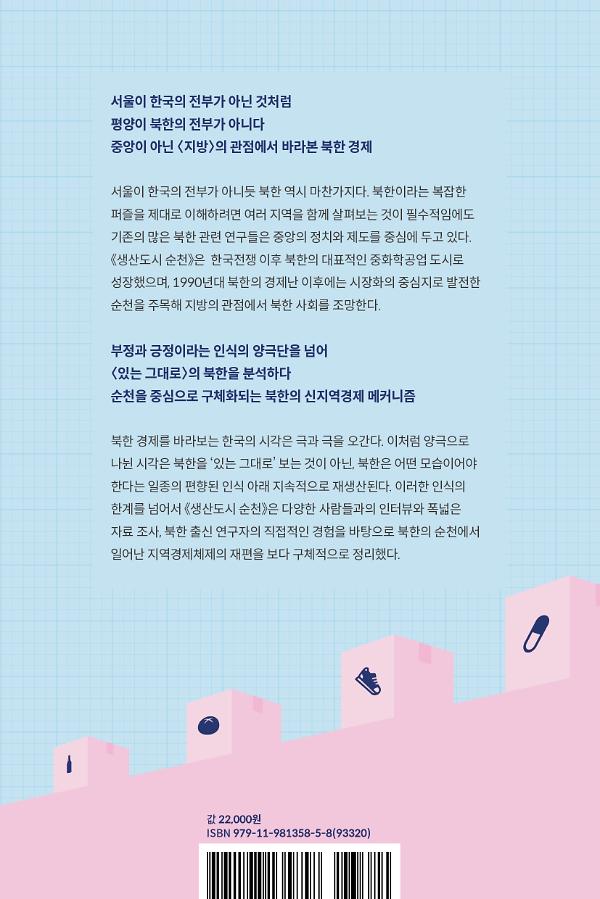이 책에서 말하는 순천지역경제란 석탄과 석회석 등 지역자원에 기반을 둔 중앙공업이 시장화되고 경제 주체별 무역활동을 계기로 정부, 기업, 가계가 유기적으로 연계돼 작동하는, 지역경제의 실질적 운영 메커니즘을 의미한다. 특히 순천의 입지는 지역경제가 해외(중국)로 확산하는데 결정적 기능을 수행하며, 이에 경제 주체별로 대응함으로써 나타나는 시너지 효과, 즉 ‘신(新)지역경제’를 전제하고 있다. (18)
북한에서의 ‘지역경제’ 개념은 남한의 지역경제와 유사한 측면도 있으나 본질적인 개념에서 차이가 두드러진다. 북한은 공식적으로 시, 군(郡)을 단위로 하는 지방경제 개념을 명시한다. “국가전체 공간의 하위 공간 단위가 지역”이듯이 북한에서도 국가 전체 공간의 200분의 1을 차지하는 군 단위를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지역적 거점으로 분류하고 있다. (23)
실제로 1990년대 경제난으로 촉발된 북한의 시장화는 권력체제, 공장체제, 지역체제 모두에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지역경제체제에 큰 변화가 있었다. 지역경제체제는 중앙경제와 지방경제, 시장이 연결되면서 새로운 방식으로 재편된다. 이는 북한 당국이 중앙공급체계가 마비되자 지방 스스로 인민생활소비품을 생산 공급하도록 자력갱생을 촉구하면서 부각됐다. 자력갱생 정책은 지방에 소재하는 중앙공업에도 강구됐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중앙공업의 자력갱생은 지역경제 시장화를 촉발했다. (26)
순천은 한국전쟁 이전까지는 농촌에 불과했지만 전쟁 이후 국가적 측면에서 중공업 우선발전 경제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적합한 도시로 주목받아, 국가경제 차원에서 중요한 도시로 개발됐다. 순천은 지하자원이 풍부하면서도 평양과 인접한 내륙에 자리해 중화학공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평양경제를 뒷받침하는 데 유리했기 때문이다. (31)
순천은 평양의 배후 도시로서 ‘평양 차별화’ 국가정책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김일성은 “평양시민들의 생활을 높이는 것은 수도의 면모를 갖추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며 평양에 대한 우선 공급 및 특별 관리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 (33)
개인 탄광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탄광 간판’이다. 간판은 탄광 운영자의 소속과 직책을 상징해 시장 개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석탄을 생산하거나 수출할 때 군부 소속 간판이라면 인허가 과정이 수월해진다. (97)
당시 북한 주민들의 필수품을 꼽으라면 식량, 연료 다음으로 신발이었다. 신발은 단순 소비재가 아니라 이동수단이었다. 식량배급제가 무너지자 주민들은 장사로 생계를 해결했는데 장사 활동은 이동을 전제한다. (240)
4층으로 구성된 해당 상업시설 1층에 피자 전문점을 비롯한 다양한 음식을 판매하는 식당이 밀집돼 있고, 찻집과 커피 점도 입점해 있다. 2층부터 4층까지는 식품, 의류, 가전제품 등을 판매하는 종합상점이 운영된다. 주민들은 이곳을 ‘평양 백화점’이 라고 지칭할 정도다. (323)